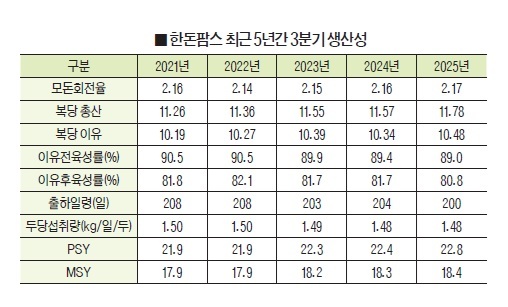모처럼 쌀값이 상승해 농업인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달 초 산지 80㎏기준 22만7천816원으로, 전년보다 4만5천여원 높게 형성됐다. 벼 재배면적을 대폭 줄인데 따른 영향이다. 특히 전남지역이 전국 최대 규모로 감축했다. 농도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마냥 반길 수만은 없다.
국가데이터처 조사에 따르면 올해 벼 재배면적 감축에서 전남이 5천295㏊를 차지, 단연코 두드러졌다. 이어 충남 4천515㏊, 전북 3천629㏊, 경북 2천723㏊, 경남 2천254㏊ 순이다. 감소폭 역시 전남이 3.6%로 가장 높다. 시·도 가운데 독보적 1위다. 정부는 올해 8만㏊를 대체하는 조정제를 대대적으로 시행했다. 전남도는 벼 농가와 논 타 작물 재배농가 모두 윈-윈하도록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급격하게 오르는 것도, 내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가격 급등락을 예방하기 위해 관리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지속적인 쌀 소비 감소 추세에 이상기후로 인한 생산량 변동 등 중장기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달 생산량이 감소할 가능성을 감안, 10만t을 시장격리하기로 했다. 또 내년 1월 말 예정된 국가데이터처의 쌀 소비량 발표 결과를 토대로 수급을 정밀하게 재전망할 계획이어서 주목받는다.
2025년산 쌀 생산량은 353만9천t으로 예상치보다 3만5천t 감소했다. 다만, 생산단수는 522㎏/10a로 전년(514㎏) 및 평년(518㎏)과 비교해 여전히 높다. 벼 재배를 줄여서 쌀값 상승을 유발하는 것은 근원적인 대책으로 부족하다. 일상화된 기후변화, 병충해 발생 등 돌발 변수에 기인한 혼란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 올해도 가을철 잦은 비로 지연됐던 수확이 지난해 수준으로 회복됨에 따라 산지 쌀값은 안정되고 있으며, 소비자 쌀값 또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밥쌀 수요가 계속 내리막길이라 해도 지금도 국민의 대표 주식이다. 식량 보호주의 흐름의 국제 정세와 맞물려 정책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한다. 농정 기관·단체, 연구소 간 인공지능(AI) 기반의 통합 모델링에 속도를 붙여야 한다. 당국은 격리 여부를 보다 과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예측의 정확도를 더 제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