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민간과 정부가 모두 합해 1년에 약 110조 원이 넘는 연구개발비를 투자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물인 기술의 활용과 사업화 비율은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아주 낮습니다. 우리 연구회는 그 이유를 기술사업화 관련 정책, 제도 및 법규의 미비 또는 불충분에서 찾아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허재관 연구개발사업화정책연구회 회장은 연구회 설립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허 회장은 “미국 등 선진국의 글로벌기업들은 지식재산(IP)을 핵심 경영자산으로 획득, 축적하고 활용해 기업가치를 크게 높인다”면서 “기업경영에 있어서 무형자산은 바로 무기”라고 했다.
그는 이러한 무기를 개발, 획득, 강화, 유지와 관리, 사업화 및 활용하는데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DX)이 크게 진전을 보이고 있고 특히 AI 활용은 기업 특허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그러면서 기반 IP 현금화, 라이선스 제휴, 인수합병(M&A), 신규사업 진출, 현물 출자 스타트업 창출 등에서 DX 관점에서 이를 활용하는 IP 랜드스케이프가 중요한데 이 부문에서 우리가 뒤져 있다고 지적했다.
허 회장은 국내에서는 대학기술지주회사 등이 특허현물출자를 많이 사용하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고도 했다. 그는 “일본의 경우 500만엔 미만 현물출자는 자기가 평가해 물목과 금액만 기입해 회사 등록 시에 신고만 하면 된다”면서 “조직을 떠난 연구자나 발명가가 자신의 특허현물출자로 창업, 스타트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술창업이 활성화되어야 기술의 사업화 비율이 올라가고 이를 통해 일자리와 소득 창출이 가능하여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다. 또 일본은 특허신탁제도에 대해 관대하다며 우리나라도 특허기술신탁제도를 대폭 완화하거나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 기업 사례를 소개하면서 한미 조세조약의 개정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어느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특허료 800억 원을 받게 됐는데, 16.5%인 132억 원을 미국에서 원천징수하고 668억원만 받았을 때. 억울한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일본은 2005년 미일(일미) 조세조약을 개정해 양국 모두 영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에서다. 한미조세조약을 일본처럼 개정하면, 그 한국 회사는 800억 원을 그대로 받게 되고, 그에 따른 세금은 한국에서 낸다.
허 회장은 “최근 미국에 기술료 등 특허료 지급은 현저히 줄고, 미국에서 받는 특허료는 증가 추세”라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식재산 거래에 수반되는 소득은 사용료 소득으로서 한미 조약 상 제한세율 16.5%가 적용되는데 이는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경민 기자 kmlee@etnew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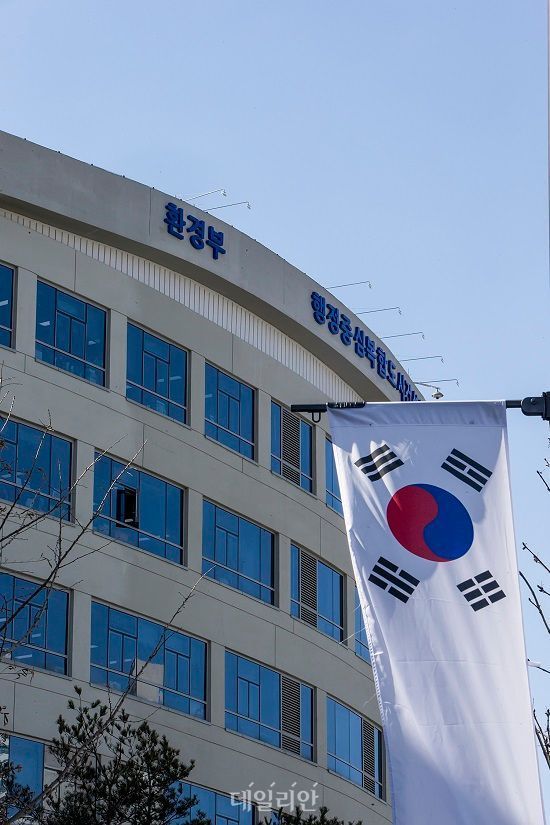


![[상보] 배터리·바이오 등에 34조 투입…반도체 지원의 2배](https://newsimg.sedaily.com/2025/02/05/2GOUOBQ9HH_3.jpg)

![유럽의 혁신 위기가 시사하는 것들 [이민형의 과학기술혁신 짚어보기]](https://newsimg.sedaily.com/2025/02/05/2GOUP0NW6U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