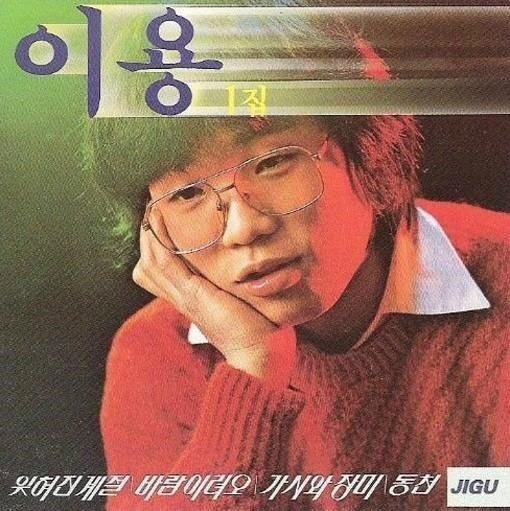공연장에 들어갈 때 누군가 소매를 잡아 끈다. 고개를 돌려보니 폴란드 사람으로 보이는 중년의 여인이다.
“혹시 표 있어요?”
일본어다. 그는 티켓을 구하기 위해 일본어를 익혀 공연장에 나왔을 것이다. 그 수고에 미안한 마음을 먹고 계단을 올라간다. 전 세계 피아니스트들이 선망하는 무대가 펼쳐진다.
5년마다 열리는 쇼팽 국제 콩쿠르의 입장표는 구하기 쉽지 않다. 온라인으로 판매를 시작했는데 10초 안에 매진됐고, 당일 현장에서는 약간의 좌석을 판매하는데 수량은 예측할 수 없다. 오후 6시 경연을 보기 위해 오전부터 줄이 늘어선다. 이 중에서 몇 명이 티켓을 구할 수 있을지는 모른다. 어디에선가 티켓 한 장에 1000유로 정도를 부르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한다.

티켓을 구해 들어가면 온종일 한 작곡가의 음악만 듣는 일이 시작된다. 오로지 프레데리크 쇼팽이다. 10월 3일에 84명의 피아니스트가 30분씩 독주로 대회를 시작했고, 그중 40명이 2차 본선에서 45분, 20명이 한 시간씩 쇼팽을 연주했다. 마지막 경연인 10월 18~20일에는 총 11명이 쇼팽을 모두 11시간 동안 연주했다.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두 곡 중 선택해 연주하는 이 무대를 보고 나면, 콩쿠르가 끝나도 귀에 쇼팽 음악의 한 구절이 맴돈다.
마지막 날인 20일 저녁, 바르샤바 국립 필하모닉 홀의 발코니석에 한 노신사가 앉아 있었다. 무대의 오른쪽에서 피아니스트를 바라보는 은발의 노신사는 음악을 들으며 노트에 무언가를 적다가, 다시 피아니스트를 골똘히 봤다. 그렇게 마지막 11시간을 같은 자리에서 줄곧 쇼팽을 들었다.
사실 그는 11번이 아니라 총 155번의 쇼팽을 들었다. 10월 2일, 이 대회가 시작할 때 바르샤바로 넘어와 마지막 결선까지 모든 참가자의 모든 연주를 들었다. 84명, 40명, 20명, 11명. 즉 155번의 쇼팽 경연을 한 음도 빼놓지 않고 들은 매우 드문 청중 중 하나다.
그는 에드워드 아우어(83). 피아니스트다. 1965년 쇼팽 콩쿠르에서 미국인 최초로 입상(5위)하고 1985년과 2000년에 이 대회의 심사위원이었다. 미국의 명문 음대인 인디애나주립대에서 40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친 유명한 교수다. 이 대학에는 그의 이름을 딴 음악당이 있다. 피아니스트이자, 쇼팽 스페셜리스트이며 오래된 교육자다.
온라인으로 모든 경연을 지켜본 사람들은 종종 불평한다.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이다. 이번 대회는 특히 모든 무대를 온라인으로 생중계했고 이를 최대 7만 명까지 함께 지켜보면서 전 세계의 수많은 자체 심사위원이 생겨났다. 한국에서도 많은 이가 밤을 새웠다.
쇼팽 콩쿠르에 청중으로 ‘개근’한 아우어 교수의 생각이 궁금했다. “콩쿠르 결과는 원래 예상과 다르게 나온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어야 한다.”
그는 “1차 본선 때는 거의 예상한 대로 결과가 나왔다. 2차에도 거의 그랬지만 3차에서 파이널에 올라갈 때는 몇 명이 없어서 아쉬웠다”고 했다.
“파이널에 올라간 사람들이 아쉬웠던 게 아니라, 꼭 올라갈 것 같았던 몇 명이 있었다.” 그게 누굴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