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은 뇌 건강 뿐만 아니라 신체 기능의 손상 또한 가져올 수 있다. 근시 발병 진행 속도가 빨라지며 황반변성 망막박리, 녹내장 등 관련 질환을 증가시키는 등 눈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식습관에도 나쁜 영향을 미쳐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화면 작을수록 눈 건강 위협
스마트폰을 비롯해 태블릿·컴퓨터·TV 등 디지털 화면 기기를 사용하는 시간이 하루 1시간 늘어날 때마다 근시 발병 위험은 21%씩 치솟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서울대 의대 안과학교실 김영국 교수팀은 33만 여 명이 참여한 45개 연구에 대한 체계적 검토와 메타분석을 통해 디지털 스크린 사용 시간과 근시 발병률 증가 간 연관성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근시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고 오는 2050년엔 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이 근시를 앓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밝혔다. 이는 근시 발병 시기가 당겨지고 진행 속도가 빨라지며 안정화 시 근시 중증도가 심해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또 이는 황반변성, 망막박리, 녹내장 등 시력을 위협하는 근시 관련 질환의 세계적 부담이 급증할 것임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연구결과 디지털 화면 기기 사용 시간이 하루 1시간에서 4시간 사이일 때 근시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시 발병 확률은 스크린 타임이 1시간 증가할 때마다 21% 높아졌다. 근시 위험은 스크린 타임이 1시간 미만일 때는 완만하게 증가했다. 그러다가 1~4시간 구간에서 급격히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또 4시간 이상일 경우 증가율이 다시 낮아져 S-자 형태 그래프를 그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연구 결과는 근시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디지털 화면 사용 시간의 잠재적인 안전 임곗값이 하루 1시간 미만임을 시사한다.
또한, 스마트 기기의 화면이 작을수록 눈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 중앙대학교병원 안과 문남주 교수팀은 안과질환이 없는 건강한 성인 46명을 대상으로 화면 크기가 다른 스마트폰과 태블릿으로 각기 다른 날 다른 내용의 다큐멘터리 영상을 각각 1시간 동안 시청하도록 했다.
기기 사용 전후로 원거리, 근거리 최대 교정 시력, 안압, 자동굴절 검사계를 이용한 굴절력을 측정하고, 얼마나 가깝게 초점이 흐려지지 않고 볼 수 있는지 검사하는 ‘조절근점(NPA)’, 가까이 볼 때 두 눈이 모아지지 못하는 상태인 ‘눈모음근점(NPC)’을 측정했다.
그 결과 스마트폰과 태블릿 두 기기 모두에서 ‘조절근점’이 증가했다. 특히, 태블릿을 사용했을 때에 비해 스마트폰을 사용한 후 조절력 변화가 1.8배 컸다. 또 두 기기를 사용한 후 모두에서 ‘눈모음근점’이 증가했다.
스마트폰 사용 후 눈모음근점이 태블릿에 비해 2.5배 멀어졌다. 이 밖에도 실험대상자들은 스마트폰 사용 시 일시적인 안압 상승과 눈물막 파괴시간의 감소가 나타났다. 태블릿에 비해 눈 피로도가 더 심하게 증가에 피로를 느낀다고 답했다.
음식의 맛과 향 감지 능력 저하
또한,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는 아이에게 안구건조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안구건조증이란 눈물이 부족하거나 눈물이 지나치게 증발하거나 눈물 구성성분의 균형이 맞지 않아 안구 표면이 손상되는 눈의 질환을 말한다. 이 병에 걸리면 눈이 시리고 자극감, 이물감, 건조감 같은 자극증상을 느끼게 된다.
문남주 중앙대학교병원 교수팀은 초등학생 5~6학년 288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안구건조증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안구건조증 진단을 받은 아이의 스마트폰 사용율은 71.4%로 안구건조증이 없는 아이들의 스마트폰 사용율(50%)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스마트폰을 비롯해 텔레비젼, 컴퓨터 등 영상매체의 총 사용시간이 길수록 안구건조증이 잘 생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영상매체를 볼 때 시선이 한 곳에 오랫동안 집중돼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적어지기 때문이다. 하루 동안 명상매체 사용시간이 1시간 이하인 아이들의 안구건조증 발생빈도는 5% 이하였지만 1~2시간 6%, 2~3시간 15%, 3시간 이상 30% 등으로 시간이 길어질수록 발생빈도가 높아졌다.
비만의 원인으로도 작용한다. 네덜란드 라이덴대학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스마트폰을 보면서 밥을 먹는 등 식사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산만한 식사’가 체중 증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산만한 식사는 과식을 유발하고, 단시간에 허기를 느끼게 하며 제대로 음식의 맛을 감지하는 것도 방해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보통 식사를 하면 뇌에서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인 GLP-1(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1)와 렙틴 등이 분비되는데, 이 과정에서 주의가 산만해질 경우 포만감이라는 호르몬의 신호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또 식사를 하는 동안 다른 일에 집중하면 뇌에 인지 부하가 발생해 음식의 제대로 된 맛과 향을 감지하는 능력도 저하된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이 42명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인지 과제의 난이도에 따른 맛 감지 능력을 실험한 결과, 어려운 과제를 수행하며 레모네이드를 마신 그룹은 쉬운 과제를 수행한 그룹보다 50% 더 많은 당을 섭취하고도 단맛을 덜 느꼈다. 같은 연구팀이 46명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후속 연구에서도 두 그룹은 같은 당도의 설탕물을 마셨지만, 쉬운 과제를 수행할 때보다 어려운 과제를 수행할 때 단맛을 덜 느낀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 어려운 과제를 수행할 때 인간의 뇌 영역 중 미각 처리를 담당하는 섬엽과 고차원적 인지에 활성화되는 전전두엽 피질의 활동이 감소한 것 역시 확인됐다. 이 외에도 연구팀은 주의 산만한 식사가 단맛 뿐만 아니라 쓴맛, 신맛, 짠맛 등 모든 맛의 감지 능력을 저하시킨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지난해 연구에서는 주의 산만한 식사가 식사의 만족도를 저하시켜 과식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도 제시했다.
충북대 식품영양학과 현태선 교수팀의 조사에서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으로 동영상을 하루 2시간 이상 동영상에 노출된 아이는 2시간 미만 노출된 아이보다 과자, 설탕 함유 음료 등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동영상 시청 시간이 긴 아이는 잠자는 시간도 상대적으로 짧았다.
휴대전화에서 나오는 전자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비염, 기관지염 등 호흡기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아주대병원 이비인후과 김현준 교수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연구진이 건강한 성인의 코 점막일부를 채취해 지속적으로 전자파에 노출시켰더니 코점막의 섬모진동횟수가 감소하기 시작해 72시간이 지나자 정상 횟수에 비해 11% 줄어들었다.
사람의 코 등 기도에 있는 섬모는 항상 일정한 속도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코를 통해 들어온 공기 속 이물질을 걸러 폐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섬모의 운동횟수가 적으면 코 등 공기가 지나가는 통로(호흡기)에 염증반응이 생겨 비염, 부비동염, 인두염, 후두염, 기관지염 등 다양한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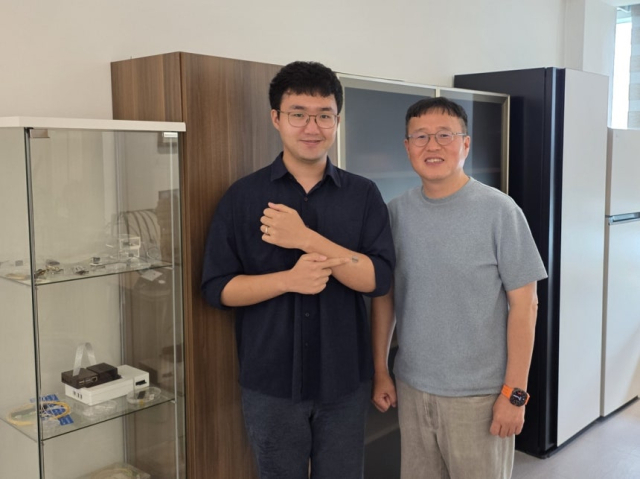



![우울할 때마다 찾아 먹던 ‘이 음식’…오히려 스트레스 주범이라고? [FOOD+]](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9/07/2025090750824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