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자들은 하루 13~16시간의 고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적은 보수에 직업병까지 얻으며 근로기준법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첫째주와 셋째주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휴일에도 나와 일을 하고, 여성들이 받을 수 있는 생리휴가 등 특별휴가는 생각조차 못할 형편이다. 이미 4~5년 전부터 받는 월급을 현재까지 그대로 받고 있다.”
지금 봐도 낯설지 않은 내용의 이 기사는 1970년 10월7일 경향신문에 보도된 평화시장 노동자들의 노동실태에 관한 이야기다. 평화시장에서 일했던 전태일 열사는 1970년 9월 동료들과 함께 ‘삼동회’를 결성하고, 평화시장 일대 노동자들을 상대로 노동실태를 파악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해 126매를 수합했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진정서를 작성해 10월6일 노동청에 제출했고, 다음날 경향신문에 ‘골방서 하루 16시간 노동. 근로조건 영점…평화시장 피복공장’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리게 된다.

전 열사가 세상을 떠나고 55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수많은 ‘오늘의 전태일’들이 실질적으로 법과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일하다 다치고, 병에 걸리고, 목숨을 잃고 있다.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은 갈수록 늘고 있다.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을 태웠지만, 우리는 태워버릴 노동법이 없다”고 호소하는 특고·프리랜서 노동자들은 ‘2025년의 전태일’이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노동법 밖으로 밀려난 노동자들의 권리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며 “이들의 임금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하고, 사회보험 보장,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승흡 전태일재단 이사장은 “오늘날 전체 노동자의 3분의1 이상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며 “청년·여성·이주·플랫폼 노동자 등 불안정한 노동을 하는 ‘오늘의 전태일’들의 산재가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태일이 추구했던 인간의 존엄과 노동의 긍지가 보편적 사회적 가치로 자리잡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노동이 생존이 아닌 삶의 가치로 존중되는 사회를 위해 노동자와 시민이 연대하고, 정부의 대책과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13일 “청년이 과로로 스러진 런던베이글뮤지엄, 기계처럼 내몰리는 SPC 제빵노동자, 죽음의 알고리즘에 갇힌 쿠팡 노동자, 추락과 붕괴가 반복되는 건설현장은 오늘의 평화시장”이라며 “2025년 오늘, 열사의 외침은 여전히 ‘법 밖의 노동자들’에게 현실로 되살아 나고 있다”고 했다.
전 열사의 동생인 전순옥 전태일기념관장은 “55년 전 노동환경이 지금 현실에서 많이 재현되고 있는 것 같다”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속에서 어느 한쪽은 전태일 이후 상당히 개선이 많이 돼 노동환경이 좋아졌지만, 다른 한쪽은 55년 전과 똑같이 근로기준법의 바깥에서 장시간 노동, 위험한 현장에 노출돼있다”고 말했다. 정은정 전태일의친구들 상임이사도 “55년이 지났는데 노동 문제가 해결됐다기보다 이름과 모습만 바꿔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성장 위주의 경제 패러다임 속에서 기업은 계속해서 규제를 피해 편법과 불법을 저질러 왔다”고 했다.
전 열사는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자들이 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사회를 꿈꿨다. 이를 위해서 전 관장은 “정부와 국회가 사람 중심의 노동정책을 펼쳐야 한다. 국민 인식도 이에 따라가야 하고, 노동자와 노조도 의식화돼야 한다”고 했다. 정 이사는 “우리가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이 사회의 가장 근본이 되고, 지나치게 이윤만 추구하는 행위는 경계하고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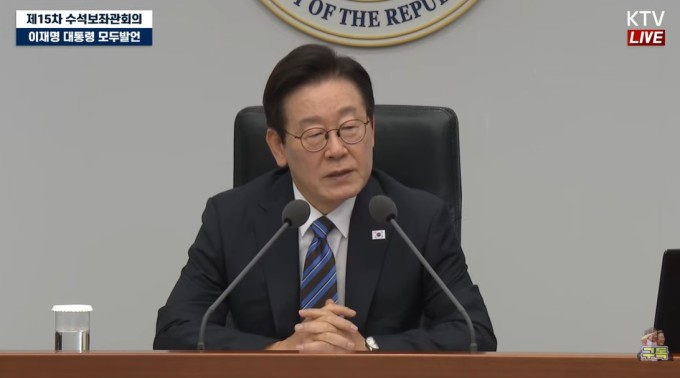


![[문수철 기자가 본 세상 데스크 칼럼] “가족도 노동자로 간주하는 한국 비자제도, 이제는 현실을 따라와야 한다”](https://www.gheadline.co.kr/data/photos/20251146/art_17630998581402_a39f05.jpg?iqs=0.81322024836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