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참여한 중소 IT서비스 기업들이 늘어난 과업에도 적정 대가를 지불받지 못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추가 과업 대가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국가계약 구조 탓으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중소 IT서비스 기업 A사가 경영난을 겪고 있다.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퇴사자도 다수 나오고 있다.
A사는 발주처인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계약 범위 외 추가 과업을 요구하자 인력과 자원을 확대 투입했지만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 A사를 포함한 이 사업 컨소시엄(LG CNS 컨소시엄)은 늘어난 업무량으로 수백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떠안았다고 주장한다. 애초 이 사업 규모가 약 1000억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손실 비중이 적지 않다.
법원행정처와 추가 대금 정산 협의는 답보 상태다. 기획재정부 산하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유사 사례는 더 있다. 1200억원이 투입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한 중소 IT서비스 기업 B사도 유동성에 적신호가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사업 비용을 넘어선 과업을 수행했는데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받지 못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문제는 추가 과업이 발생해도 예산을 증액하기 어려운 국가계약 구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국가계약법은 총액입찰 방식을 따르고 있어 계약 체결 후에는 예산 증액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발주처가 추가 과업을 요구해도 사업자는 원가 이하로 손해를 감수하면서 과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
한 SW 업계 고위 관계자는 “예산을 추가하기 어려운 총액입찰도 문제지만, 우리나라 제안요청서(RFP)에는 과업 물량 기준이 없어 업무 범위가 증가해도 이에 대한 주장이나 법적 입증이 어렵다”며 “법원 소송을 거쳐 1심에서 사업자가 이기더라도 2심에서는 '계약 범위 내 과업'으로 판단돼 패소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과업 단위별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변경 시 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내역입찰' 방식을 법제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실적으로는 국회에 계류된 국가계약법 개정안부터 통과시켜 시행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앞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5월 공공 SW 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결정 사항이 계약금액 조정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국가계약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계약법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SW진흥법 제50조(과업심의위원회)에 따른 과업 내용 변경'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이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다른 SW 업계 고위 관계자는 “중소IT서비스 기업은 부정당 업체로 제재받을까 우려해서 추가 과업을 수행하고도 정부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며 “계약 구조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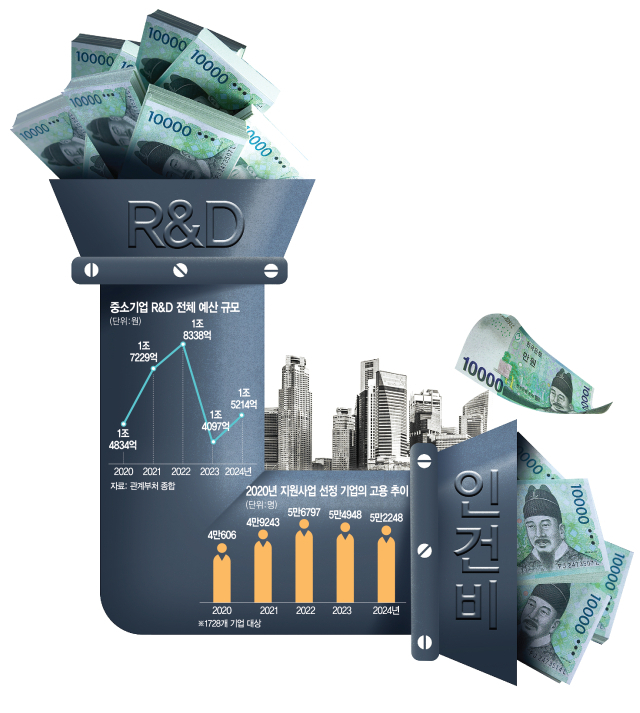




![[단독]하도급·가맹·유통…공정위 ‘갑을 문제’ 전담 3개국 신설 검토](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7/08/news-p.v1.20250707.28c4c0c511704e48bb001db9468d7d41_P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