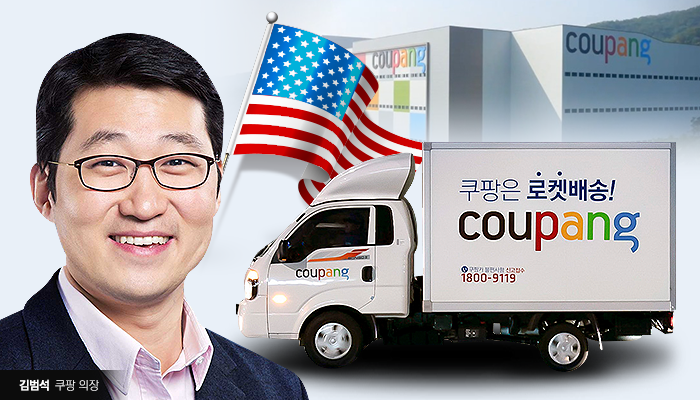포스코 중국 투자, 잃어버린 10년
제대로 된 경영자는 모름지기 10년 후를 내다봐야 한다. 공장 짓는 데 시간이 필요한 제조업은 더 멀리 내다봐야 한다. 1990년 8월, 나는 ‘POSCO 2000’ 계획을 세웠다. 광양제철소까지 마무리되면 또 다른 비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 계획에 따라 포스코는 사업 다각화를 시도했다. 당시 기아자동차·쌍용자동차와 합작을 타진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상대 회사가 포스코의 덩치에다 막대한 신규 투자에 부담을 느낀 듯했다.
그래서 눈을 돌린 곳이 ‘중국과 동남아’, 그리고 ‘정보통신’이었다.

나는 특히 초고속 인터넷에 관심이 컸다. 철강에 이어 또 하나의 국가 기반산업이 될 것이라고 느꼈다. 나는 포스데이타를 세우고 삼보의 이용태 회장과 일본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과 손잡았다. 이를 위해 서울 대치동에 첨단 인텔리전스 빌딩을 지었다.
그러나 내가 포스코에서 쫓겨나자 모든 게 뒤틀렸다. 정보통신 메카로 구상한 서울 대치동 빌딩에 느닷없이 포스코 본사가 입주해 버렸다. 초고속 인터넷 시장 역시 업체 난립으로 출혈경쟁이 심했다. 너나없이 한전 전봇대에 통신선을 매달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는 요즘 통신선 무게를 이기지 못해 금이 간 전신주를 보면 마음이 편치 않다.
중국에 대한 투자 기회 상실은 훨씬 뼈아픈 대목이다. 중국의 덩샤오핑(鄧小平)은 78년 “박태준을 수입하고 싶다”고 말했다. 85년 9월에는 첫 현대적 제철소인 바오산(寶山) 제철소의 제1고로 화입식(火入式)을 했다. 중국은 이때부터 포스코에 손을 뻗쳐 왔다. 공식적인 한·중 수교는 92년 8월에야 이뤄졌다.
한국전쟁 때 나는 중공군과 맞붙어 죽을 고비를 숱하게 넘겼다. 그런 내가 중국의 협조 요청을 받았으니 느낌이 묘했다. 그러나 나는 중국의 잠재력과 미래를 내다보고 가슴을 열었다.
포항제철이 내게 고향(故鄕)이라면 광양제철은 자부심의 원천이다. 순수하게 우리 기술, 우리 손으로 지었기 때문이다. 광양제철은 원료 투입에서 완제품 배출까지의 생산라인이 일직선이고, 세계 어느 제철소보다 짧다. 그만큼 생산 효율이 높다.
나는 광양제철을 신일본제철을 제치고 중국 측에 먼저 보여주었다. 당시 광양 건설현장을 열심히 오간 인물이 베이징과학기술대의 주(朱)모 교수였다. 이 대학은 답례인지 92년 나에게 ‘명예교수’라는 감투까지 씌워주었다.
나는 또 싱가포르·홍콩 등에 이사급 지사장을 내보냈다. 공식 수교 전이라도 중국을 미리 공부해 앞날에 대비하자는 조치였다. 그러나 이들 지사장은 ‘좌천당했다’고 느낀 모양이었다. 내가 물러나자마자 후임 경영진은 이사급 지사장들을 불러들이고 보다 낮은 직급을 지사장으로 내보냈다.
90년대 초반 중국 바오산제철소 규모는 연산 200만t에 불과했다. 나는 포항·광양에 이어 중국에 1000만t짜리 포스코 제3제철소를 짓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중국은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다. 내가 “문제가 생겨도 중국에 세운 제철소를 한국으로 짊어지고 갈 수는 없잖소”라고 설득하자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였다.
![[단독] 포스코인터, 우즈벡 면방사업 판다…구조조정 박차](https://newsimg.sedaily.com/2025/02/27/2GP4SHSQ7N_1.jpg)

![[대만에서 읽는 한반도] "삼성은 TSMC 못 이겨" 대만 경제학자가 보는 한국 반도체 미래](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502/thumb/29158-71356-sampleM.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