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세안(ASEAN)은 동남아 10개국을 가리키는 말이다. 구성원은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대륙의 5개국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브루나이 등 해양국 5개국이다.
최근 한국과 관련에서 가장 큰 나라가 베트남이다. 삼성전자 등 한국 글로벌이 진출하고, 교민도 급속히 늘어나고, 한국 유학생 중 중국에 이어 가장 큰 나라가 베트남이다. 한국관광객이 가장 찾는 동남아 국가도 베트남이다.
이렇게 급속히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아세안익스프레스가 생활 속에서 찾아보는 베트남의 언어, 습속, 그리고 문화 등을 조명하는 연재를 시작한다. 부산외대 교수로서, 그리고 베트남 1호 한국유학생이자 1호 박사인 배양수 교수의 베트남 시공간 여행을 동반할 수 있다. [편집자]
--------------------------------------------
어떤 책에서 사이공은 한자로 서공(西貢)이며, ‘서쪽에서 조공을 바치는 곳’이라는 의미라고 쓴 글을 보았다. ‘이것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이공이라는 지명은 한자에서 온 말이 아닌데…. 그리고 서공은 중국 사람들이 사이공을 자기들의 문자로 소리를 적은 것에 불과한 것인데, 이것을 한자라고 생각하고 의미까지 번역했으니, 큰 오류라고 생각했다. 왜 한국인이 한자에 뿌리를 두지 않은 순수 베트남어에 한자를 사용할까?
베트남어에는 한자에 뿌리를 둔 단어가 많다. 전체 베트남 어휘 중 60~70%가 한자에 뿌리를 둔 어휘라고 한다. 이렇게 한자에 뿌리를 둔 베트남어를 한월어(漢越語)라고 한다. 이것과 비교하여, 한자에 근원을 둔 한국어를 한한어(漢韓語)라고 정의해보겠다. 어떤 한자든 우리말로 발음할 수 있듯이, 베트남어도 모든 한자를 베트남어로 발음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두 나라 모두 한자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는 극소수의 연구자를 제외하고는 한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즉, 읽거나 쓰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통 사람들은 음이 같을 경우, 한월어인지 순수 베트남어인지도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와 같은 예로, 베트남 사람들은 서울의 한강(漢江 Hán Giang)을 한강(韓江 Hàn Giang)이라고 부른다. 한자를 잘 모르기 때문에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가 한국(韓國 Hàn Quốc)이니, 당연히 서울에 있는 강을 나라 이름 한(韓) 자(字)를 써서 한강(韓江)이라고 쓰기 시작했고, 지금은 많은 베트남 사람이 한강(韓江)이라고 알고 있다. 또 어떤 사람은 한국의 한자가 추울 한(寒) 자와 발음이 같아서, 우리나라가 추운 나라, 한국(寒國 Hàn Quốc)이냐고 묻는 일도 있었다.
한자를 아는 외국인이 베트남어를 접할 때, 발음을 통해서 한월어임을 알게 된다. 그리고 이미 한자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은 베트남어 어휘를 보고 한자를 유추하게 될 때가 많다. 그리고 그 유추가 얼추 맞기도 한다. 그래서 한월어를 아는 한국 사람은 베트남어에 흥미를 느끼기도 한다. 가끔 거리의 간판을 보고 그 의미를 추측하기도 하며, 현지인에게 확인했을 때 맞다는 답을 들으면, 아주 기분이 좋다.
우리말에도 한자어가 있고 순수 한글이 있듯이, 베트남어도 그렇다. 예를 들면, 베트남어에서 비는 순수 베트남어로 므어(mưa)이며 한월어로는 부(vũ 雨)이다. 구름은 머이(mây)와 번(vân 雲)이고, 하늘은 쩌이(trời)와 티엔(thiên 天)이다.
1989년 초로 기억한다. 베트남 사람과 대화 중에 ‘그것이 인생이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다. 그런데 인생이란 단어를 배운 적이 없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사람 인(人)자인 년(nhân)에 날 생(生)자인 싱(sinh)을 붙여, 인생(nhân sinh)을 만들어서 ‘Đó là nhân sinh.(돌 라 년싱)’이라고 말했더니 바로 알아들었다. 그때 기분이 아주 좋았다. 이렇게 한자를 가지고 베트남어 어휘를 만들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된 것은, 같은 한자라도 우리와 의미가 다른 것도 있고, 우리가 사용하는 어휘를 베트남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도 있으며, 음과 성조가 같더라도 한월어도 있고, 순수 베트남어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월어를 조심스럽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월어와 한한어에 모두 사용하는 단어지만 의미가 다른 것은 다정(多情 đa tình)이라는 단어가 있다. 우리말에서는 ‘정이 많음’이지만 베트남어에서는 ‘정이 많아서 정을 나누어주는, 바람피우는’이라는 의미이다. 또 수단(手段 thủ đoạn)이라는 단어가 있다. ‘어떤 목적을 이루는 방법 또는 그 도구’이지만, 베트남어에서는 ‘술수, 잔꾀’라는 의미로만 사용된다. 또 기소(起訴 khởi tố)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입건(立件)’을 의미한다. 우리말 기소에 해당하는 베트남어는 쭈이또(truy tố 追訴)이다. 곤란(困難, khốn nạn)이라는 단어는 베트남어에서는 ‘인간도 아닌….’이라는 의미로 심하게 경멸함을 표현하는 단어이다. 이 단어는 너무 심한 말이라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 외에도 동양(東洋 Đông Dương)은 인도차이나를, 종족(種族 chủng tộc)은 인종을, 분별(分別 phân biệt)은 ‘구별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차별하다’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된다. 생원(生員 sinh viên)은 대학생이고, 진사(進士 tiến sĩ)는 박사이며, 거인(擧人 cử nhân)은 학사를 의미한다. 또 시종(始終 thủy chung/ 終始 chung thủy)은 ‘정절, 지조, 절개’라는 의미로 쓰인다. 베트남어로 화장(化粧 hóa trang)은 우리말로 분장(扮裝)이다. 우리말 화장은 베트남어로 장점(粧點 trang điểm)이다. 이처럼 같은 한자를 사용하지만, 의미가 다른 경우도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동음이의어를 보면, 베트남어 다(đa)는 나무 이름, 음식 이름 그리고 많을 다(多) 자(字)가 있다. 또 투(thủ)라는 글자는 머릿수(首), 손 수(手), 지킬 수(守), 취할 취(取) 자가 모두 같은 발음이다. 또 룩(lục)이라는 글자는 여섯 육(六), 초록빛 록(綠), 기록할 록(錄), 뭍 육(陸)이 동음이의어이다.
베트남 인명을 한자로 표기하면서 맞지 않게 사용된 예도 있다. 전 베트남공산당 도므어이(Đỗ Mười) 서기장의 이름을 두매(杜梅)로 표기한 것이 있는데, 틀린 표기이다. 도(Đỗ)는 성으로, 한자로 두(杜 Đỗ)가 맞지만 므어이(Mười)는 열(10)을 의미하는 순수 베트남어를 한자로 표기할 수 없다. 그런데 두매(杜梅)로 쓰면 베트남어로 도마이(Đỗ Mai)가 된다. 도므어이 서기장이 도마이 서기장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베트남 사람들의 이름 중에 숫자로 표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가족 내 서열에 따라 이름을 짓거나 별명을 만드는 일이 흔했기 때문이다. 다른 예를 보면, 응오반남(Ngô Văn Năm)을 한자로 오반오(吳文五)로 표기한 경우를 보았다. 여기서 남(Năm)은 다섯(5)이라는 순수 베트남어로, 한자의 오(五)와 음이 다르다. 한자 (五)는 응우(ngũ)이다. 그래서 한자로 오반오(吳文五)로 표기하면 베트남어로는 응오반응우(Ngỗ Văn Ngũ)가 된다. 응오반남(Ngô Văn Năm)이 응오반응우(Ngỗ Văn Ngũ)로 이름이 바뀌는 것이다.
또 보티싸우(Võ Thị Sáu)도 그런 경우인데, 싸우(sáu)가 순수 베트남어로 여섯(6)인데, 한자의 육(lục, 六)으로 바꿔서 무씨육(武氏六)으로 표기했다. 무씨육을 베트남어로 표기하면 보티룩(Võ Thị Lục)이 된다. 보티싸우라는 이름이 보티룩으로 바뀌는 것이다. 앞의 도므어이(Đỗ Mười)의 열(10)을 한자 열 십(十)으로 바꾸면 두십(杜十)이 된다. 베트남어 발음으로는 도텁(Đỗ Thập)이다. 도므어이가 도텁으로 바뀌는 것이다. 한자를 오용하여 고유명사인 이름이 바뀌는 것이다.
지명의 경우 한자로 잘못 표기하는 경우가 더 많다. 베트남은 다종족 국가로, 산악지역과 메콩델타 지역에는 소수 종족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그들의 언어로 된 지명이 종종 있는데, 그것은 순수 베트남어로 한월어가 아니기 때문에 한자로 표기할 수 없다.
송홍(sông Hồng)은 홍강인데, 송(sông)은 순수 베트남어로 한자가 없다. 이것을 농홍(瀧紅, Long Hồng)으로 쓰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앞에 말했듯이 한월어에는 동음이의어가 많다. 그런데 지금 베트남에서는 한자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글자를 보고 한자를 유추할 때, 특히 인명이나 지명과 같은 고유명사를 한자로 함께 적을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음이 같으니 이런 글자일 거라는 추측으로 사용하면 틀릴 수 있다.
한 예로, 하노이에 있는 롱비엔 철교를 소개하면서 롱비엔(Long Biên)을 용변(龍邊) 또는 융변(隆邊)으로 표기한 경우를 봤는데, 롱비엔은 용편(龍編)이라고 써야 한다. 고유명사를 한자로 함께 적을 때는 자료를 꼼꼼히 찾아서 확인하지 않으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한자가 없는 베트남 지명을 중국어 발음으로 표기한 것이 있다. 이 한자는 중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베트남어를 발음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므로 한자로 함께 적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다음은 한자로 잘못 함께 적은 베트남 지명의 일부이다.

배양수 전 부산외대 베트남어과 교수(베트남 1호 한국유학생)
배양수 교수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베트남어과를 졸업하고, 하노이사범대학교 어문학과에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베트남 1호 한국유학생이자 1호 박사다.
베트남 문학작품인 『끼에우전』과 한국의 『춘향전』을 비교한 석사학위논문은 베트남 현지에서 많은 주목을 받기도 했다. 하노이사범대학교 어문학과에서 100번째로 박사학위를 받은 자본주의권 출신의 외국인이라는 이례적인 기록도 가지고 있다.

1995년부터 부산외국어대학교 베트남어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베트남 문화의 즐거움 』, 『중고등학교 베트남어 교과서』, 등의 저서와 『시인 강을 건너다』, 『하얀 아오자이』, 『베트남 베트남 사람들』, 『정부음곡』, 『춘향전』 등의 번역서가 있다.
2024년 12월 24일 ‘부산외국어대학교 베트남어과 30주년 기념식 및 정년퇴임식’을 가졌다.
 AI 시대를 넘어 100년을 준비하는 교육개혁](https://img.newspim.com/news/2025/11/14/251114152525778_w.jpg)

![[속보] 이재명 정부, 동북아 공식 표기 ‘한중일’로 원상 복구…혼재 논란 정리한다](https://newsimg.sedaily.com/2025/11/16/2H0H5KVM29_1.jpg)
 AI 시대를 넘어 100년을 준비하는 교육개혁](https://img.newspim.com/news/2025/10/30/251030211438104_w.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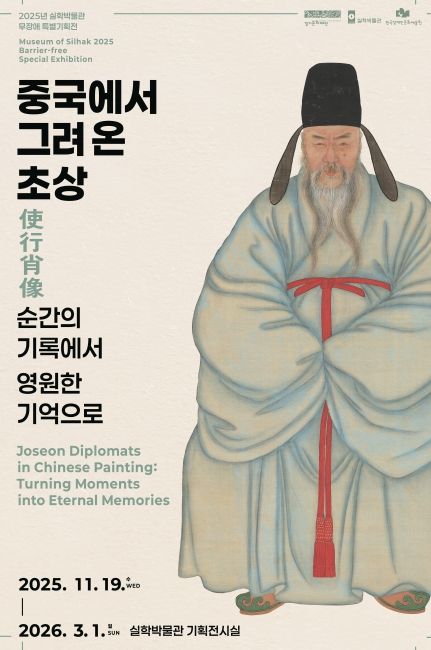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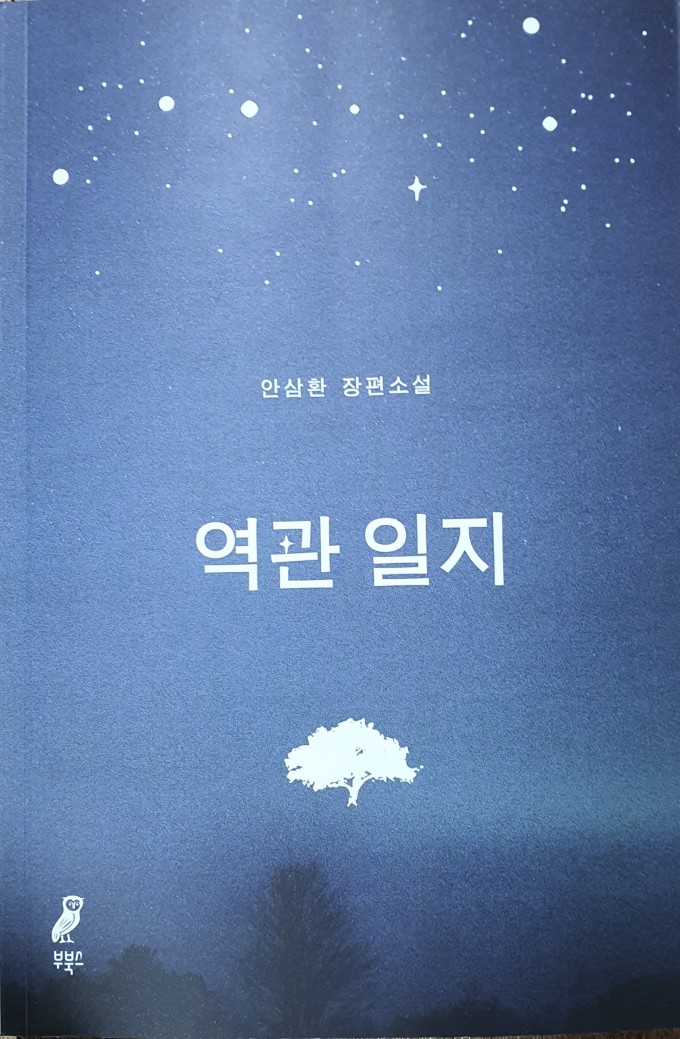

![영국인이 돌아왔다…일본 점령기 그후, 이포의 풍경 [왕겅우 회고록 (20)]](https://img.joongang.co.kr/pubimg/share/ja-opengraph-img.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