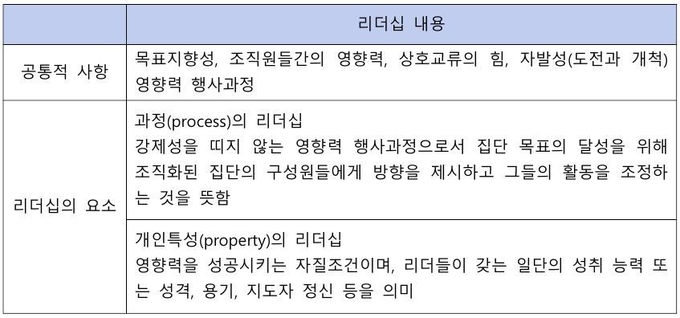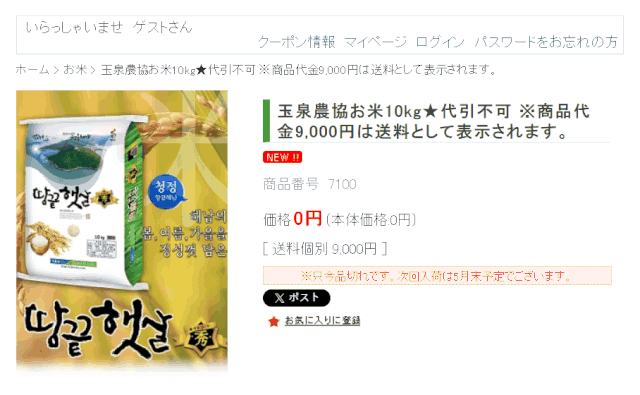최근 수입 꽃·조화(가짜꽃)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국내 화훼산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국화 수입량은 2020년 6342t에서 2024년 7301t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카네이션은 878t에서 2259t으로, 장미는 389t에서 1365t으로 각각 증가했다. 수입액 역시 국화는 2.3배, 카네이션은 3.0배, 장미는 3.3배 확대됐다.
절화의 주요 수입 대상국도 변화하고 있다. 2020년에는 케냐·인도·네덜란드가 중심이었지만, 2024년엔 콜롬비아·중국·베트남이 주 수입 대상국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베트남산 국화(‘폼폰’) 수입이 급증했고, 2023년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타결 이후엔 에콰도르산 절화 수입도 눈에 띄게 성장했다.
문제는 이들 수입 꽃이 국내 유통구조와 충돌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미국·네덜란드·프랑스·독일 등 주요 국가는 수입 절화를 공영시장에서 상장해 관리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수입 꽃이 공영시장에 상장되지 않아 유통의 투명성과 품질관리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국내 농가들은 유통 가격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수입 꽃과의 가격 경쟁에서도 더욱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 더욱이 소비 형태는 소량 다품종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나, 아직 국내 산업은 이러한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조화 수입은 더욱 심각하다. 2024년 기준 전체 수입량의 98.3%가 중국산으로, 가격 경쟁력 외에도 품질, 안전성, 환경 문제 등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다. 단지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수입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 행태는 장기적으로 국내 화훼산업의 설 자리를 더욱 좁힐 수 있다.
이제 국내 화훼산업도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구조를 구축해 생산자와 소비자 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둘째,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 사용 등 친환경 유통기반을 마련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점에서 산업을 재설계해야 한다. 셋째, 국내 화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품종 개발과 재배기술 혁신이 시급하다.
화훼는 단순한 장식물이 아니다.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적 자산이자 도시 생태계의 구성 요소다. 수입 꽃·조화 급증이라는 현실 앞에서, 국내 화훼산업이 지속가능하도록 정책적 지원과 사회적 공감이 함께 이뤄져야 할 시점이다.
김윤진 서울여대 원예생명조경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