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 한 달여 지나가면서 여러 분야의 정책 방향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정부 혁신 분야도 예외가 아닌데, 정부효율부라는 기관을 신설해서까지 연방정부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정부효율부 수장에 혁신 기업가인 일론 머스크를 임명한 것은 매우 고강도의 정부 혁신이 추진될 것임을 예상하게 한다. 아니나 다를까 아직 전체적인 모습이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지난 2월 11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대부분의 정부 기관에서 획기적인 군살 빼기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은 효율화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도구로 인공지능(AI) 도입이 맨 처음 제시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부 혁신에 AI 접목은 정부 운영에 특화된 AI 챗봇 개발을 통해 우선 이루어질 전망이다.
정부효율부는 사람이 하는 일을 AI가 대체하기 위해 GSAi라는 챗봇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 연방총무성(GSA)의 업무인 건물, 계약, 정보기술(IT) 인프라 등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GSAi는 계약 관리 등 집행 업무의 자동화에 일차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전 부처에 걸쳐 지출 구조 자동 분석, 효율화 대상 발굴 등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는 데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게 언론의 분석이다.
아직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머스크의 구상이라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머스크는 페이팔을 개발해 전자결제 시장을 개척했으며, 테슬라를 통해 전기자동차의 대중화를 이끌었고, 화성에 가겠다는 비전으로 스페이스X를 설립해 민간 우주산업 시장을 만들어 낸 혁신가다.
특히, 챗GPT를 개발한 오픈AI가 2015년 설립될 때 투자자로 참여했고, 2018년 오픈AI와 결별한 뒤 2023년 AI 스타트업인 xAI를 설립해 '그록' 이라는 자체 생성형 AI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을 정도로 AI에 대한 혜안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성공 여부를 예단할 수는 없으나, 이 같은 이력을 지닌 머스크가 AI 챗봇을 통해 정부 업무를 효율화하겠다고 나선 만큼 앞으로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우리 사정은 어떨까? 우리의 경우 디지털 전환의 목표가 업무 생산성 제고보다는 대민 서비스의 혁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다. 이를 통해 2023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디지털 정부 평가 1위, 2024년 국제연합(UN) 전자정부 평가 4위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디지털 행정 서비스 주요 혁신 사례도 구비서류 제로화, 국민 비서와 민간플랫폼을 통한 민관 융합 서비스, 모바일 신분증, 공공 마이데이터, 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 혜택 알리미 등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한 번에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중심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의 AI챗봇 전략과 같이 업무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AI를 적용하는 사업은 무엇이 있을까? 행정안전부는 작년에 범정부 초거대 AI 공통기반 구현 및 디지털 행정혁신 체계 수립을 위한 BPR/ISP 수립을 완료했고, 올해 1분기 중에 구축 사업을 발주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여러 정부 기관이 함께 사용하는 공용 AI 인프라 구축과 지능형 업무관리 시스템 개발의 2개 분야로 나뉘어 있다.
우선 공용 AI 인프라를 통해 공문서나 각종 분야별 정책 문서, 데이터들을 학습한 공공 정책 범용 AI 서비스를 개발할 예정이다. 여기에 기관별로 특화된 재정, 조세, 치안, 특허, 조달 등의 추가 학습이 이루어지면 서비스의 정확도와 활용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를 통해 중복개발에 따른 예산 낭비를 막고 개발 기간도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 같은 AI 인프라 위에 협업과 소통이 가능한 지능형 업무 관리 시스템이 얹어지면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이 혁신될 수 있다. 앞으로 공무원들은 AI챗봇을 통해 몇 가지 질문만으로 과거 정책이나 법 제도를 입체적으로 검색하고, 서로 조합하며 요약 및 제안 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사업의 내용도 그렇지만 추진 방식을 혁신하는 것도 중요한데,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민간과의 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 AI 서비스는,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설계하고 발주해 사업자를 통해 개발하는 전통적인 시스템통합(SI) 개발 방식이 아니라, 민간에서 개발된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식을 많이 도입할 예정이다. 물론 정부 정책을 잘 이해할 수 있는 AI가 되기 위해서는 민간의 서비스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 데이터의 학습이라는 개발 과정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를 위한 초거대 언어모델은 민간에서 검증된 모델이 사용될 예정이며, 메일, 메신저, 결재, 화상회의 등 업무를 처리하는 협업 도구도 민간의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도 정부가 직접 구축해 운영하지 않고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할 계획이다. 다만, 국가 주요 시스템의 경우 그 설치 및 운영에 있어 국정원의 보안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는 제약이 따른다. 이 같은 부담을 줄여주고자 정부 데이터센터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민간 사업자가 별도의 투자없이 이 보안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대구센터의 일부 전산실을 민간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민관협력사업(PPP)을 운영 중이다. 현재까지는 보안 요건을 충족하는 순수 민간 데이터센터가 없기 때문에 범정부 초거대 AI 공통인프라와 지능형 업무관리시스템은 PPP에 참여한 클라우드 사업자 인프라를 통해 서비스될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에 시작된 PPP 사업에는 현재 국내 클라우드 사업자 3개사가 참여하고 있고 6개 공공기관의 8개 서비스가 구축 중이다.
이와 같은 AI 분야 민관 협력 방식의 장점은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민간에서 검증된 서비스를 바로 활용하는 것이 신기술을 도입해 자체 개발하는 것보다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둘째,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고 투자 규모 산정이 어려운 AI 사업에 섣불리 고정 투자를 하기보다는 민간의 자원을 빌려 쓰고 사용한 만큼 이용료를 내는 구독형 서비스가 투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정된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 산업 정책의 측면에서도 일회성의 시스템 구축이 아니라 민간 산업 기반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정부가 수요를 창출해 국제 경쟁력이 있는 AI 생태계를 육성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빅데이터, AI 등을 도입해 행정을 과학화하기 위한 노력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러나 생성형 AI로 대표되는 초거대 AI 기반의 정부 혁신은 미국이나 우리나 이제 첫걸음을 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업의 내용뿐 아니라, 민관협력 확대 같은 사업 추진 방식까지도 혁신함으로써 모든 공무원이 AI 비서 한 명씩 두고 행정 서비스의 효율과 품질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앞당겨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jy41lee@gmail.com
〈필자〉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와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영국 런던정경대학(LSE)에서 IT 거버넌스를 주제로 경영정보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5년 행정고시(38회)를 거쳐 공직에 입문한 후 조달청 나라장터 개발·운영에 참여하며 IT 경력을 쌓았다. 조달청 과장을 끝으로 2011년 민간으로 이직했고, 삼성전자에서 빅데이터 담당 임원과 인공지능(AI) 기업 바이브컴퍼니에서 대표를 역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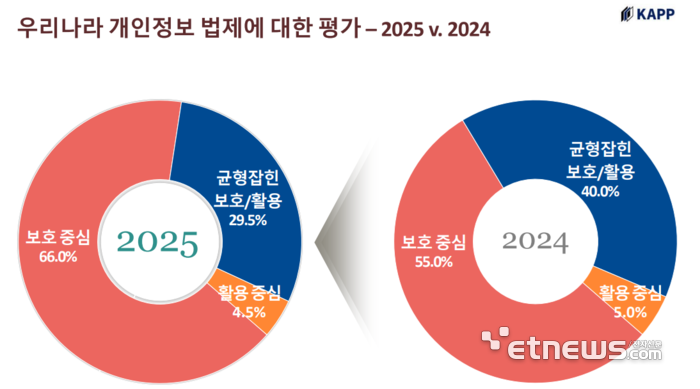
![[ISDP 2025] 이로운앤컴퍼니 윤두식 대표 “표준화된 AI 보안 프레임워크 구축해야"(영상)](https://www.dailysecu.com/news/photo/202502/163915_192144_46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