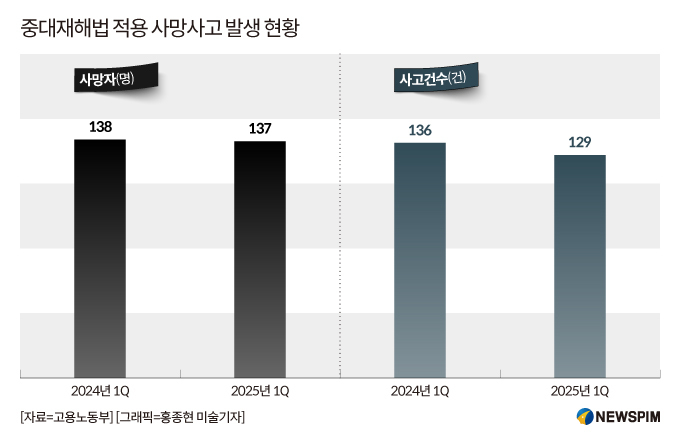새벽녘, 불과 두세 시간 만에 일 강수량 100mm를 넘는 폭우가 마을을 휩쓸었다. 마을 어른은 “60년 동안 이런 물난리는 처음 본다”며 조심스레 마을을 돌아보셨다. 비가 잦아들고 해가 한창인 오후, 필자도 마을을 한 바퀴 돌아보았다. 오래전부터 자연스럽게 형성된 길과 논밭은 별문제가 없었지만 산을 깎아 개발한 곳, 배수시설을 했지만 자연의 물길과 맞지 않는 곳에 물이 넘쳤고, 새로 길을 낸 곳들은 처참하게 토사가 쓸려 내려가 있었다. 햇살이 토사 위에 비치자 작은 입자들이 금빛으로 반짝였다. 순간, ‘혹시 금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쭈그리고 앉아 자세히 들여다보니, 1~2mm 정도의 작은 입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사실 자연 속에서 ‘금색’으로 반짝이는 광물은 꽤 많다. 대표적으로 황철석, 황동석, 운모처럼 금과 비슷하게 보이지만 성분이 다른 광물이 많다. 먼저 금의 특성을 알고 나서 비교해 보자. 자연 상태에서 모래나 자갈 속에 섞여 있는 금을 모래 속의 금, 또는 모래처럼 가는 금, 사금(沙金)이라 한다. 색상은 덩어리져 있을 때 보통 노란색, 황금색이다. 사금은 모래 속에서 납작하거나 둥글게 마모되어 불규칙한 형태로 발견된다. 금은 단일 원소 물질이기 때문에 화학식이 아닌 원소번호 79인 ‘Au’만으로 표현된다. 읽을 때는 에이유라고 읽고 영어로는 ‘gold’이다. Au는 라틴어 Aurum에서 기원하고 빛나는 것, 빛나는 새벽이라는 뜻이다. 비중은 약 19.3으로 같은 부피의 물보다 19.3배 무겁다. 이러한 특성으로 가벼운 토사는 제거되고 무거운 금이 그릇 안에 남게 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금의 조흔색은 노란색이다. 조흔색은 광물을 희거나 검은 도자기판에 긁어 남는 가루의 색을 관찰하여 광물을 식별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금의 특징을 가지고 토사 속에서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광물이 금인지 아닌지를 탐험해 보고자 한다.
첫째, 모래 속에서 금속광택의 노란빛이 반짝인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 형태가 각이 져 있고 결정형이다(사진 A). 이것은 반짝이는 광물 중 가장 흔한 황철석이다. 황철석(黃鐵石, Pyrite, FeS2)의 별명은 “바보(들)의 금”이다. 금과 비슷해 바보같이 속거나, 바보들이 금인 줄 안다는 뜻이다. 황철석은 황, 철 광물로, 자연 상태의 결정이 종종 정육면체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겉보기에는 금과 아주 흡사하게 생겼지만 성분이 금과 분명히 다르다. 철이 있지만 자성이 없다. 비중은 약 5.0으로 금보다 작다. 황철석의 조흔색은 녹회색에서 흑색을 띤다. 금과 가장 헷갈리나 결정의 형태와 조흔색으로 육안 구별이 가능하다.
운모(Mica)는 또 다른 혼동 광물이다. 물속의 작은 생물을 관찰하기 위해 모래가 포함된 시료를 현미경으로 관찰하다 보면, 비늘처럼 반짝거리지만 자세히 보고자 다른 각도에서 보면 빛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 운모다. 운모의 큰 특징은 얇은 판상으로 잘 벗겨진다는 점이다. 은회색과 황갈색으로 색이 다양해서 금으로 오해되는 두 번째 광물이다. 그러나 운모는 규산염광물이다. 규산은 실리카를 포함한다. 이로 인해 금속광택이라기보다는 진주광택 또는 유리광택이다. 백운모는 투명하고 흑운모는 검갈색이지만 조흔색은 흰색이나 또는 색이 없다. 너무 부드러워서 선명한 조흔색이 남지 않는 경우이다. 비중은 상대적으로 매우 가벼운 편인 약 2.8로, 물속에서도 물살에 의해 이리저리 흔들리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황동석(Chalcopyrite, CuFeS₂)이다. 황동석도 겉보기에는 황금색, 녹색이 있는 황금색이나 때로는 무지갯빛 산화막이 있다. 광택은 금속광택이다. 조흔색은 어두운 녹색에서 검은색이다. 황동석의 화학식은 CuFeS₂으로 황철석 구조에 구리가 들어간 구조이다. 그래서 색이 황금색을 띠기도 하지만 구리의 녹청색 산화막이 형성된 색이 비치기도 한다. 그러나 황철석은 정육면체 결정이 잘 발달하는 반면에 황동석의 결정은 덩어리나 둔한 피라미드 형태를 띤다. 황동석의 비중은 약 4.2이고 자성은 황철석과 같이 없다. 구리 때문에 공기 중에 산화되면 녹청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전혀 녹슬지 않는 금과 다르다.
현장에서 내가 발견한 반짝이는 입자는 크기가 1~2mm로 매우 작아 긁거나 깨보는 실험은 어렵지만, 판상으로 각이 진 결정 형태와 금속광택을 볼 때, 황철석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단정 짓고 포기하기엔 다소 아쉽다. 왜냐하면 황철석은 금이 존재할 가능성을 알려주는 지질학적 지표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금과 황철석은 모두 뜨거운 물질과 암석 내에서 용해·재결정화 과정을 거쳐 형성되므로, 황철석이 있는 곳에는 금이 있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Chen et al., 2024).
참고문헌
Chen, Y., Li, H., Halassane, N., Ghaderi, M., Gu, S., Wang, Y., & Li, D., 2024.
Pyrite geochemistry reveals the key controlling factors of large gold deposit formation in Jiaodong Peninsula: A comparative study. Ore Geology Reviews, 165, 105934. DOI: 10.1016/j.oregeorev.2024.105934
권춘봉 이학박사
[저작권자ⓒ 울산저널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전북일보 신춘문예 작가들이 추천하는 이 책] 장창영 작가, 멜리사 마인츠 '깃털 달린 여행자'](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8/20/.cache/512/20250820580101.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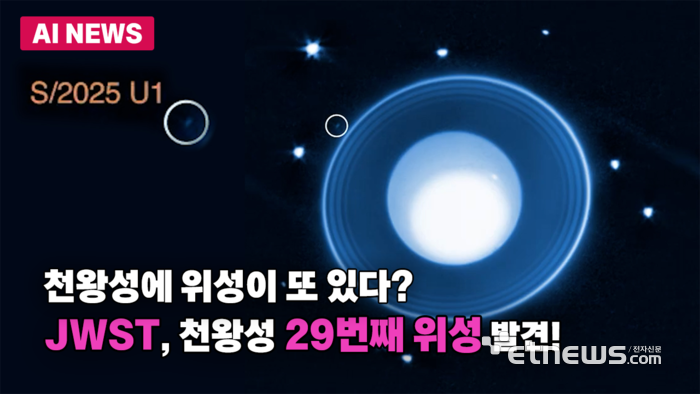

![[문화마당] 문화의 세기, 시민문화권 보장을 위한 용어 바로 읽기 (38) 미래문화유산](https://www.usjournal.kr/news/data/20250821/p1065624179602902_759_thum.jp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