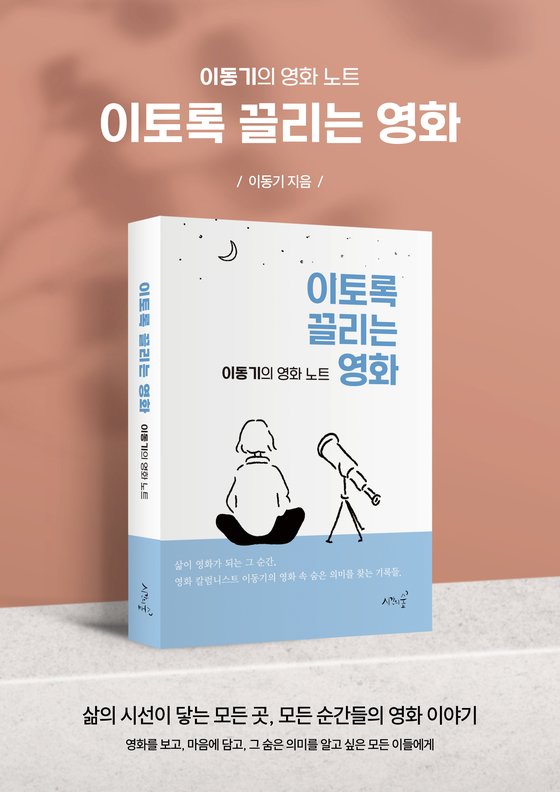인간 두개골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 ‘신의 사랑을 위해’(2007)는 죽음과 사치, 불멸의 욕구를 담았다. 투명한 아크릴 상자에 실제 상어를 넣은 그의 또 다른 작품 ‘살아 있는 자의 마음속에 있는 죽음의 육체적 불가능성’(1991)은 인간의 죽음이란 ‘직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프랑스의 예술가 소피 칼은 어머니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을 기록한 작품 ‘포착할 수 없는 죽음’(2007)으로 죽음이 갖는 개인적, 보편적 의미에 대해 물었다. 멕시코의 테레사 마르골레스는 시신을 씻기는 데 사용된 20ℓ의 혼합물을 공기 중에 뿌리는 설치작업 ‘Aire(Air)’(2003)를 통해 죽음을 물리적, 감각적 수준에서 체험하게 했다.
이밖에도 헌 옷 더미와 크레인, 138개의 스피커 등을 이용해 죽음 이후의 흔적과 사라짐, 부재의 기억을 새긴 크리스티앙 볼탕스키의 ‘사람들’전(2010)을 비롯해 빌 비올라, 마크 퀸 등 삶과 죽음의 경계를 직시한 예술가들은 많다.
19세기 마지막 인상주의자인 폴 고갱 역시 사회적, 정서적 맥락에서 삶과 죽음을 다뤘다. 대표작은 폭 4m에 이르는 대작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1896)이다. ‘황색 그리스도’(1889), ‘설교 후의 환상’(1888)과 더불어 그의 3대 작품 중 하나로 꼽힌다.
작가 스스로 “모든 것을 담았다”고 했을 만큼 강한 애착을 보인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는 54세로 생을 마감한 고갱의 내면적 갈등과 인생에 대한 질문이 녹아 있는 마지막 주요 작품이다. 그의 인생관 및 세계관을 함축한 철학적 서사화로 평가된다.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건강 악화까지 겹쳐 삶의 위기를 겪던 시기, 생명의 시작과 죽음을 기록한 이 작품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전개되며 인간 생애를 세 단계로 묘사한다. 먼저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는 우측의 세 여성과 어린아이로부터 나온다. 새로운 탄생이다.
그림 가운데 사과(열매)를 쥔 모습의 성인은 ‘우리는 무엇인가’를 암시한다. 에덴동산의 선악과처럼 인생은 원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유혹의 사과를 따먹은 이후의 고통 받는 현재를 담고 있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는 왼쪽 그림자 속에 웅크리고 있는 노인에게서 밝혀진다. 생의 끝이다.
고갱이 하고자 한 이야기는 양팔을 벌리고 있는 그림 뒤편의 파란색 우상(偶像)으로 이어진다. 영혼과 자연, 생명을 관장하는 타히티 원주민 문화의 일부로도 해석되지만 고갱은 지인과의 대화에서 이것의 의미를 ‘저 너머’라 했다. 여기서 ‘저 너머’는 초월적 공간, 인간 존재의 근원과 이상향을 포함하는 다층적 개념이다.
하지만 평소 고갱은 인간 삶을 원초적이면서 영적인 것과 연결해왔고, 노인이 그 자신이기도 하단 점에서 ‘저 너머’는 죽음 이후 세계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고갱은 그림 완성 후 자살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일종의 유언처럼 여겨진다.
서양 문명의 물질주의의 욕망에 염증을 느끼고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해 고민했던 고갱에게 세상은 헛했다. 삶을 억누르는 번민과 육신의 고통에도 지쳤다. 그래서 그는 자문했다. 과연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무엇이며, 어디로 가는가를 말이다.
128년이나 지난 그림이지만 동시대인들이 보편적으로 겪는 실존과 상실, 인간 삶의 목적과 가치는 무엇인가에 대한 사유는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은 듯싶다. ‘저 너머’에 대한 의문도 그렇다.

![[신간] 작은 자비들 등 5권](https://www.domin.co.kr/news/photo/202411/1493416_673877_485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