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림 시인이 그렇게 썼습니다. ‘흙먼지에 쌓여 지나온 마을이 돌아보니 복사꽃밭이었다’고요. 그것이 신경림의 정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해 5월 22일 타계한 신경림 시인(1936~2024)의 1주기를 앞두고 유고 시집 『살아 있는 것은 아름답다』(창비)가 출간됐다. 시인의 마지막 말이자, 한 생애를 관통한 시심(詩心)의 결산이다. 14일 서울 마포구 창비 사옥에서 열린 출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시집을 엮은 시인 도종환은 시집의 첫 시 ‘고추잠자리’에 담긴 고인의 정신을 이렇게 설명했다.

그가 언급한 ‘고추잠자리’는 2연 4행의 짧은 시다. ‘고추잠자리’, ‘복사꽃’, ‘달’ 같은 흔한 것을 소재 삼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깊은 울림을 전하는 고인의 시풍이 오롯이 담겼다.
“흙먼지에 쌓여 지나온 마을/멀리 와 돌아보니 그곳이 복사꽃밭이었다//어둑어둑 서쪽하늘로 달도 기울고/꽃잎 하나 내 어깨에 고추잠자리처럼 붙어 있다”
‘꽃구경’에는 폐지 손수레를 밀고 가는 노부부가 등장한다. 낮은 곳을 향하는 시인의 시선이 따뜻하다.
“손수레에는 아들딸 걱정까지 실린다/그애들이 이 봄을 어이 나려나,/가난한 거리에 드리운 역병의 그늘은 아직 짙어/이때 핸드폰이 울리고, 손녀의 통통 튀는 목소리.//할머니, 올핸 우리 꽃구경 가자. 문득/손수레가 가벼워진다./세상의 작은 꿈들이 실리면서, 작은 손들이 밀면서.”

이번 시집은 생전 마지막으로 펴낸 『사진관집 이층』(창비) 이후 11년 만의 신작이다. 삶과 죽음 등 묵직한 주제를 다루면서도 손에 잡히는 언어를 써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다.
제목 ‘살아있는 것은 아름답다’는 도종환 시인이 붙였다. 신경림 시인의 삶과 시에서 일관되게 흐르던 시선과 세계관을 함축했다.
“하늘을 나는 솔개도, 땅을 기는 굼벵이도, 초원을 달리는 사슴도, 힘겹게 손수레를 끄는 늙은이도, 동굴에 매달린 박쥐도 모두 살아 있어서 아름답다고 선생님은 생각하셨을 겁니다. ‘사라질 것이기에 더 아름답다’고도요. 생의 유한함을 받아들이고, 긍정하는 태도. 그것이 선생님이 우리에게 남기고 싶었던 마지막 당부라고 생각합니다.”
도종환 시인은 고인을 “내 시의 아버지”라고 칭하며 생전 신 시인과의 인연도 풀어놨다.
“30대 무명 시인인 제게 전화해 원고지를 보내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제 첫 시집을 선생님의 도움으로 창비에서 내게 됐습니다. 선생님은 저를 시인으로 키워주신 분입니다.”
시집은 총 60편의 시를 4부로 나눴다. 1부에는 “가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는 시인의 시선”을 담았다. “하찮은 것, 작아서 보이지 않는 것, 큰 것에 가리는 것을 사랑했던 시인이 신경림”이라는 게 도종환 시인의 해석이다.
2부는 ‘길 위의 시’를 묶었다. 낯선 곳을 향해 떠나는 시인의 여정과, 길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이야기가 담겼다. 3부는 ‘비움’과 ‘벗어남’을 주제로 한다. 집착을 내려놓고 가벼워진 영혼의 자유를 노래한 시편들이다. 4부는 ‘아픔’이다. 세월호 참사 등 시대의 고통에 함께 울었던 시인의 마음을 담았다.
60편의 시 대부분이 어디에도 발표되지 않은 신작이다. 문예지에 발표된 시는 일부 포함됐지만, 시집이나 공동 작품집에 실린 시는 모두 솎아냈다.
시인의 차남 신병규 씨는 병상에서도 시 작업을 멈추지 않았던 부친의 모습을 떠올리며 “작업 중 머리가 아프다고 하셔서 가족들은 만류했지만, 끝까지 시를 쓰셨다”고 회상했다. 그는 “서재에만 책이 만 권이 넘었고, 유품이 담긴 박스도 아직 정리가 덜 됐다”며, 앞으로 산문집과 전집 출간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웅의역사산책] 지조 높은 국학자 조지훈](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5/12/2025051251828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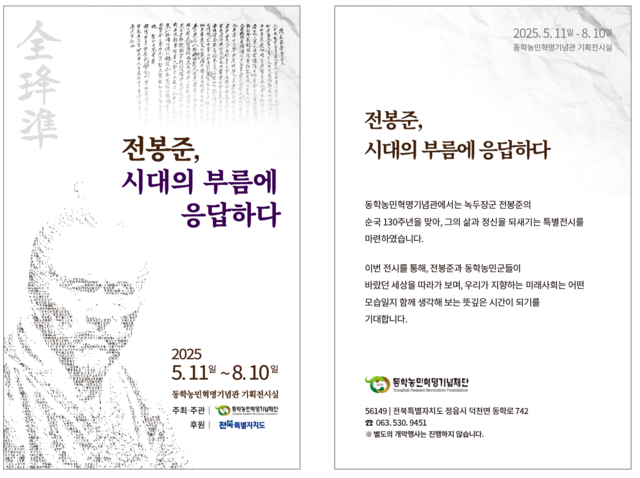
![[신간] 진보 정치의 미래 제시한 '나의 노무현 너의 노회찬'](https://img.newspim.com/news/2025/05/13/250513124232777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