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사들이 출시한 앱이 몇 개나 되는지 세어보세요.”
얼마 전 정보기술(IT) 업계에 종사하는 지인이 건넨 말이다. 주요 증권사들의 앱 종류를 살펴보니 한 곳에서도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기본으로 계좌 개설, 파생 거래 등 각각의 기능을 분리한 앱이 줄줄이 나왔다. 5점 만점의 평가에 4점을 넘긴 앱은 손에 꼽았고, 1점대 앱도 적잖았다. 일부 앱은 ‘버려진 앱’ ‘오류투성이’라는 악평 일색이었다.
반면 2021년 출범해 빠르게 입지를 넓히고 있는 토스증권은 은행과 증권업을 모두 아우르는 단 하나의 통합 앱을 운영 중이다. 직관적인 인터페이스(UI)와 편리한 사용자경험(UX)은 디지털에 익숙한 MZ세대들을 블랙홀처럼 흡수하고 있다. 실제 토스증권의 해외 주식 거래 대금은 지난해 11월 업계 최초로 30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3분기 기준 토스증권 임직원 수는 357명으로 대형 증권사의 10분의 1 수준이다. 그야말로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 격이다.
이를 두고 기존 증권사들은 태생이 IT 기업이 만든 앱의 품질이 좋은 건 당연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본질은 IT가 아닌 각 업무 간 수평적인 소통과 개선의 선순환에 있다. 편리한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 대다수는 아이디어 제안자와 이를 구현하는 개발자 사이 끊임없는 대화와 반복 테스트를 통해 오류를 수정하고 최적의 서비스를 현실화한다.
반면 많은 금융사들은 IT 부문이 오프라인 서비스를 보조하기 위한 유지·보수를 담당하던 과거 경험에 머물러 있다. 앱 개발은 여전히 외부에 하청을 주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경영진에서 결정 후 일방적으로 납기일을 정해 놓은 채 개발을 아웃 소싱하는 이들의 관계는 명령자와 수행자다.
비단 IT 서비스에만 해당하는 얘기는 아니다. 지난해 거래소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를 해소하기 위해 출시한 ‘코리아밸류업지수’, 금융투자협회가 주도한 자산 배분 펀드인 ‘디딤펀드’는 좋은 의도와는 달리 출시 직후부터 시장 외면에 직면해 있다. 역대 관제 펀드들은 출시 직후 대통령이 ‘1호 가입자’를 자처하며 헤드라인을 화려하게 장식했지만 이내 역사 속으로 사라져갔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다양한 분야의 시장 참가자 및 이해관계자와의 끊임없는 소통 없이는 결코 성공한 상품이 나올 수 없다. 시장의 수요, 업계와의 소통에 앞선 기획자(정권)의 욕심이 낳은 정책 상품은 사장된 증권 앱과 다를 바가 없다.

![[디지털포스트 모닝픽] "넷플릭스·유튜브, 방송통신발전기금 내야"](https://www.ilovepc.co.kr/news/photo/202501/52770_143773_5521.jpe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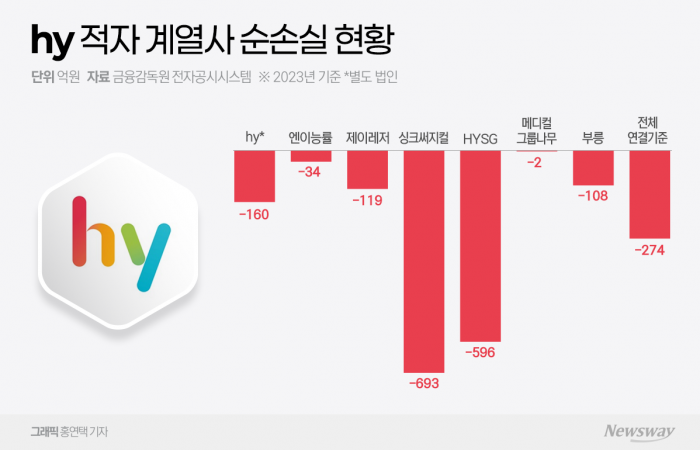


![벤처투자 위축에 돌파구 찾는다… 세컨더리펀드 6881억·해외진출 新바람 [AI PRISM*스타트업 창업자 뉴스]](https://newsimg.sedaily.com/2025/01/23/2GNSZTM5LM_3.jpg)

![[웨비나 중계] AI 신도시에 모델만 ‘외로이’ 놓이면 벌어지는 일](https://byline.network/wp-content/uploads/2025/01/chodongkyusnowflake.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