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이완 작가 정잉(鄭潁)이 있다. 그가 타이베이 고궁박물원을 수십 년간 들락거리면서 쓴 『연물(戀物)』을 편집하던 중 나는 그에게 흠뻑 빠졌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그의 따사로운 경어체 때문이었다. 유물을 정밀하게 감상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운데, 기법과 의미를 짚고 창작가의 삶을 상상해야 할 뿐 아니라 수장가들의 흔적까지 읽어내도록 요구받기 때문이다. 이 박물관의 수많은 국보는 건륭황제의 손을 탄 애장품들이었고, 이 황제는 작품을 감상할 때마다 자신의 인장을 종이 위에 찍었다. (가령 ‘부춘산거도’에는 쉰다섯 곳에 평과 도장의 흔적을 남겼다.) 정치가라기보다 예술가의 자질이 더 강했던 건륭 덕분에 보물들은 잘 보존됐으나, 작품보다 더 큰 면적을 차지하는 황제의 도장들을 볼 때마다 정잉은 심란했다. 하지만 경어체를 택한 작가는 건륭을 륭 오라버니 혹은 륭 어르신이라 부르며 그 마음을 헤아리려 애쓴다. 물론 독자들에게 가장 탁월한 붙임성을 발휘하며 존댓말을 쓰는 정잉은 박물관 안에서 도슨트가 되어 당신의 손을 꼭 붙잡은 채 동선을 그리며 나아간다. 그의 그런 글을 읽고 있으면 눈이 뜨이고 콧구멍이 열리며 머릿속이 맑아지는 느낌이다.
알기 쉬운 ‘해설’ 각광받는 시대
정신의 심오함 다 못 전하지만
붙임성 있게 독자 손 잡아끌어

경어체를 탐스럽게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은 독자로서 내게 획기적인 변화다. 나는 전복의 연쇄로서 문장을 구사하는 조르주 디디-위베르만이나 벽돌을 쌓아 올리듯 빈틈없이 구축하는 제발트, 색채를 들이마시듯 글을 쓰면서 심연까지 뚫고 들어가는 어둠의 문장가 미르체아 커르터레스쿠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반면 친절함과 배려심이 배어든 경어체에서는 문체를 거론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정신이 질주할 때 작가와 글 사이에는 독자가 아닌 오로지 하얀 여백만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편집자로서 경어체로 쓰인 책을 여러 권 만들었지만, 이는 마케팅 효과를 고려해서였다. 출판계에는 ‘경어체를 쓰면 더 잘 팔린다’는 속설이 전해 내려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읽은 김슬기의 『탐나는 현대미술』, 강창래의 『AI 시대, 인간의 경쟁력』, 김대식의 『AGI, 천사인가 악마인가』는 우연히도 모두 경어체로 쓰였다. 의외인 점은 읽으면서 존댓말이 한 번도 거슬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설명력과 스토리를 짜나가는 기술에 끌렸고, 무의식중에 인간미도 느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경어체는 오늘날 알게 모르게 쓰기와 읽기의 한 흐름을 주도하는 듯하다.
저자는 늘 자신이 다루는 주제에 관해 독자보다 몇 발 앞서나간다. 수년 동안 몰두해온 주제에 대해 쓰는 저자와 뒤늦게 이를 따라잡는 독자 사이에는 간극이 생길 수밖에 없고, 나는 둘 사이의 차이를 좁히는 몫은 대부분 독자에게 달려 있다고 보았다. 만약 저자가 끊임없이 읽는 이를 이해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글은 밋밋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어려운 글이 ‘보편성’을 획득하지 못하는가 하면 그건 아니다. 예컨대 커르터레스쿠의 소설은 알레고리와 상징 때문에 여러 번 문턱에 걸리는 느낌을 주지만, 그의 이야기는 보편성을 획득한다. 다른 한편 많은 교양서의 저자들은 독자에게 폭넓게 다가가고자 ‘가독성’이란 명분 아래 복합문을 배제한 단문 쓰기, 주석 생략하기, 번역 문장 끊어 쓰기 등 문해력의 하향화에 타협하는 방식으로 글을 쓰고 있다는 점 역시 부정하기 힘들다.
어쨌든 시대가 바뀐 것은 분명하다. 1990년대와 같이 각 분야에서 비평이 힘을 발휘하는 시대는 아니며, 독자는 매개자 없이 저자와 직접 만나고 대화한다. 쉽게 메일과 메시지도 보낸다. 상호작용은 실시간으로 이뤄지고, 북토크에서 독자 질문을 통해 작품의 의도, 배경, 해석까지 묻고 대답하는 시대에 우리 모두는 더 직접적이고 즉흥적으로 변했다. 필사 노트의 유행 역시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여러 번의 재독을 통해 작품을 다층적으로 해석하는 데 집중하기보다 저자에 대한 애정의 느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독자는 문장을 끊임없이 베껴 쓴다. 이처럼 물질적이고 감각적으로 텍스트가 읽히며 눈동자를 마주하는 시대이기에 작가는 어쩌면 글에서조차 최대한 부드러운 안내자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글은 그림처럼 시간의 예술이다. 시간이 많이 흐른 후 어떤 글은 퇴색되고 유효기간이 다한 느낌을 준다. 반면 또 다른 글은 세기를 지배하면서 다른 작가들의 문체까지 바꿔놓는데, 이런 글은 작가가 골방에서 홀로 정면승부를 벌이면서 쓴 것일 가능성이 높다. 즉 눈앞의 독자를 더 많이 확보하느냐, 혹은 살냄새와 꿀의 달콤한 직접성은 덜해지지만 긴 시간 속에서 독자를 확보하느냐의 차이로 볼 수 있을 듯하다. 비평보다는 낭독을, 해석의 두려움보다는 해설의 밝음을 원한다면 경어체를, 홀로 정신과 끝까지 맞대면서 투명한 사고를 원한다면 평서체를 접하면서 어쨌든 다들 다독의 세계로 들어섰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은혜 글항아리 대표
![[홍장호의 사자성어와 만인보] 주마간산(走馬看山)과 맹교(孟郊)](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4/80a88182-2911-4e27-acac-7b25f6b87f1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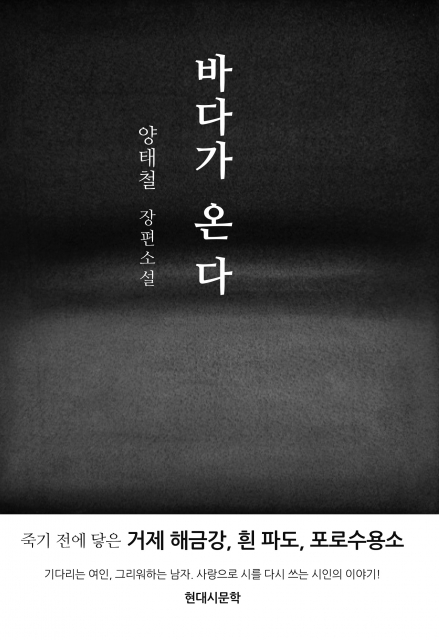
![[오늘의 전시] 인간의 눈으로 보는 세계가 진실일까?](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1042/art_17605005359423_15981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