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은 반(半)봉건사회다. 대한제국에서 일제 식민지를 거쳐 곧바로 최고지도자 중심의 수령제 사회주의로 넘어간 탓이다. 국가를 사회주의 대(大)가정이라거나 남아(男兒)를 선호하는 유교 문화가 아직까지 지배한다. 1946년 남녀평등권법을 제정한 지 79년이 지나도 법과 무관하게 여성의 유리 천장을 당연시하는 문화가 있다. 10여년 전 평양의 식당에서 겪은 일이 이런 문화를 보여준다. 주문한 음식이 나와 빈 그릇을 정리하려 했더니 여성 봉사원(직원)은 “남자가 이런 일을 하면 밖에 나가 큰일을 못합니다”라고 핀잔 아닌 핀잔을 줬다. 봉건적인 사회 분위기는 스위스 유학파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해서도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다만, 그는 자신의 현지지도에 아들이 아닌 딸을 데리고 다니는 모습을 공개적으로 보이는 게 눈에 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5일 남포 조선소에서 진행한 북한판 이지스함인 최현함 진수식에도 딸과 함께했다.
김일성 재혼한 김성애 한때 위세
“1974~94년 북은 부자 공동정권”
김정일·정은, 여동생 파워 막강
혈통계승론으로 후계자 정할 듯
여성이 자리하는 북한의 2인자

세상을 지배하는 건 남자이고, 그 남자를 지배하는 건 여자라고 했던가. 남아를 선호하는 북한의 문화 속에서도 최고지도자의 곁에는 항상 여성이 자리했다는 점은 아이러니다. 김일성 주석(1994년 사망)은 1971년 공식 회의 석상에서 “김성애 동무의 얘기는 내 얘기와 같다”고 했다. 본처인 김정숙이 사망하고 재혼한 부인 김성애 당시 여성동맹위원장의 위세는 커졌고, 후계자 경쟁이 한창이던 그때 김성애는 본인이 낳은 아들(평일, 영일)을 후원하며 ‘평양 치맛바람’을 일으켰다. 그러나 최현·오진우 등 김일성·김정숙과 항일무장투쟁을 했던 빨치산이 김성애 세력을 견제하고,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을 ‘과시’했던 김정일이 후계자에 오르며 김일성의 부부 정치는 중단됐다. “후계자는 수령의 지위와 역할이 같다”는 북한의 후계자론에 따라 후계자인 김정일이 김일성의 권력 파트너로 자리한 셈이다. 1997년 한국으로 망명한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는 생전에 “북한은 (김정일이 후계자가 된) 74년부터 94년 김일성 사망 이전까지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의 공동 정권이었다”고 회고했다.

김정일 시대에 들어선 여동생의 역할이 도드라졌다. 여자 형제가 없었던 아버지와 달리 김정일이 자신의 유일한 친혈육인 김경희와 남매 정치를 시작한 것이다. 권력에서 밀린 김성애의 자식들이 ‘곁가지’로 분류돼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 대사를 맡아 해외에서 생활했지만, 김정일·경희 남매는 언제나 권력의 중심부에 자리했다. 후계자였던 김정일은 노동당의 정치위원과 조직·선전 비서,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등 당과 군을 장악하며 권력 승계에 나섰고, 김경희는 당 국제부 부부장을 거쳐 경공업부장에 올라 경제를 챙기며 역할을 분담했다. 김정일은 직선적인 성격과 바쁜 일정 탓에 사전에 약속되지 않은 인물을 만나는 걸 꺼렸다고 한다. 하지만 김경희는 예외였고, 문고리 권력을 행사하는 막후실세였다. 특히 김정일이 2008년 여름 뇌졸중을 앓은 뒤 여동생에 대한 의지는 공개적으로 변했다. 김일성 주석 장례식 이후 15년 만에 김경희는 공개활동을 재개했고, 김정일의 그림자 수행원이 됐다. 오빠의 건강과 정책을 직접 챙기는 1등 보좌진이었다. 김경희는 당의 최고 정책결정기구인 정치국의 위원에 오르더니 별 넷을 단 대장 계급장을 단 군복을 입고 나타나기도 했다. 또 정치국에서 결정한 내용을 실행하는 부처의 책임자격인 비서국의 비서로도 임명됐다. 남편 장성택이 반당 혐의로 처형됐지만 김경희는 후계자인 조카(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후견인 역할까지 이어갔다.
김정은 부녀 공개 동행의 숨은 포석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대를 이은 남매 정치의 파워를 그대로 보여준다. 김여정은 수시로 한국이나 미국을 향해 담화나 성명을 내며 김 위원장의 ‘입’ 역할을 한다. 과거 북한의 공식 문건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내(김여정) 생각에는”이라는 표현도 서슴없이 쓴다. 자신의 생각이 북한의 공식 입장이란 뜻이다.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렸던 남북정상회담 때 남측 당국자가 정상회담을 총괄하던 김영철 당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에게 행사 내용 일부를 수정하자고 제안했을 때 “(자신은 결정권이 없으니) 김여정 부부장에게 얘기해 보라”고 답한 건 북한 고위간부들 사이에서 김여정의 위상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남북정상회담뿐만 아니라 그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북·미 공동선언 서명식에 오빠(김정은) 옆에서 펜까지 챙기는 등 최고지도자의 분신이다.

이런 김정일과 김정은의 남매 정치는 이복형제들의 견제 속에 다져진 동병상련이자 ‘믿을 건 친혈육뿐’이라는 공감대가 크게 작용한 탓이다. 무엇보다 최고지도자인 아버지를 유년 시절부터 따라다니며 보고 배운 제왕학(帝王學)의 동문수학 관계이기도 하다.
북한은 ‘백두혈통’이라는 표현으로 혈통계승론을 후계자 이론을 내세우고 있다. 이대로라면 김 위원장의 자식 중 한 명이 최고지도자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김 위원장의 현지 지도에 수시로 등장하는 김주애로 알려진 10대 초반의 여아를 후계자로 꼽기도 한다. 동행 장소는 미사일 발사 현장이나 대규모 아파트단지 준공식, 온실 농장 등 지도자 수업을 하듯 분야를 가리지 않는다. 공교롭게도 그가 북한 매체에 등장한 이후 2023년과 지난해, 올해 1~4월 김 위원장은 각각 6차례 현지 지도에 딸과 동행했다. 우연의 일치이거나 북한이 의도적으로 노출 수위를 조절하는 것일 수 있다.
그의 활발한 행보가 후계자 수업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김 위원장이 딸을 후계자로 내정한다면 봉건 사회인 북한에선 파격이자 주민들 역시 충격으로 여길 부분이다. 눈길을 끄는 건 김주애 후계자설이 부각된 이후 “존경하는 자제분” 등 북한 매체가 초창기에 주애에게 붙였던 수식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또 분야를 가리지 않는 부녀의 동행에도 불구하고 최고인민회의나 군사대학 방문, 공식 정치 행사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점은 아직은 후계자를 논할 단계가 아니라는 방증일 수 있다. 그렇다면 김주애의 현지지도 동행은 고모할머니나 고모처럼 다음 세대의 남매 정치를 염두에 둔 현장 학습, 즉 남동생을 서포트하기 위한 수업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게 합리적인 추론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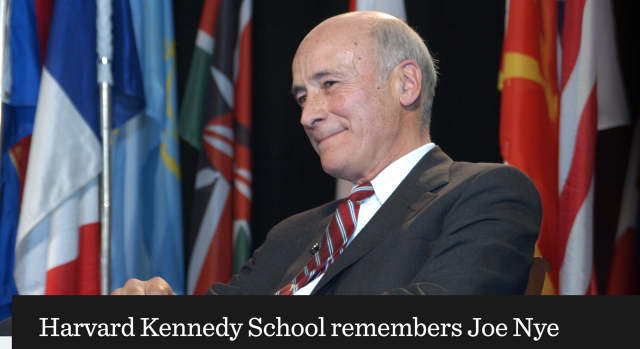
![[오목대] 한덕수와 고건](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5/08/.cache/512/20250508580300.jpg)



![[한국에살며] ‘탕핑과 이민’ 새로운 삶의 선택](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5/07/2025050752063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