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사회적 대화' 언급 지속
각종 대화·소통 기구 양적·질적↑
시민 사고체계 재정립 쉽지 않아
대화 주제·결과 이행 모두 중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연일 사회적 대화에 대한 정부 의지가 보인다. 출입처이기 때문일까? 특히 김민석 국무총리의 사회적 대화 언급이 반복적으로 눈에 띈다. 김 총리는 후보자 시절부터 국회 청문회에서 "사회적 대화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 국민주권 시대에 걸맞게 국민 참여와 소통의 장을 확대하고 이를 제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취임 이후 그는 'K-토론나라'라는 이름의 공개 토론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과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게 되면 어떻게 나라가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다. 사회적 대화, 토론을 제도화한 사회 협약으로 돌아가는 국가였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무조정실은 내년 숙의공론화 기구를 가동하기 위한 예산까지 신규 편성했다. 대화 의제를 찾고 공론화에 부칠 기구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총리실 소속 소통플랫폼 '사회대개혁위원회' 구성을 위한 '사회대개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은 이달 초 입법예고를 마쳤다. 정부만이 아니다. 국회 사회적 대화가 지난달 공식 출범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달리 국회 사회적 대화에는 민주노총까지 활약한다.
사회적 대화를 위해 만들어진 대통령 소속 기구 경사노위의 숙제가 커졌다. 이달 초 임명된 김지형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한국형 사회적 대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표까지 제시했다. 그는 "특정 국가의 모델을 따르기보다는 우리에게 잘 맞는 고유의 'K 모델'을 개발해 나가야 하고, 경사노위가 그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 들어 사회적 대화를 언급하는 빈도는 늘었고, 체계화 시도도 분명해 보인다. 다만 우리가 지향할 최종 비전이 있는지 그 청사진은 아직 모호하다. '대화해야 한다'는 좋은 말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모두가 동의한다. 매개의 형식도 구상하기 나름이다. 애초 정부 역시 다층적 사회적 대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사회적 대화 출범으로 애매해진 경사노위의 포지션을 어떻게 설정할지는 기술적 문제다.
더 궁금한 것은 무엇에 대해 대화할지다. 대표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다. 침묵하려는 소수와 목소리 큰 다수 사이를 한정된 예산과 항상 부족한 인력을 가진 정부가 어떻게 파고들지, 조율과 경청은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다. 대화 이후도 관건이다. 합의 결과가 미진하게 이행되거나 후속조치가 일관성을 잃으면 사회적 대화는 신뢰를 잃고 동력을 상실한다.
사회적 대화는 장기적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이다. 국가가 제도화된 토론에 입각해 운영된다는 것은 시민들의 사고 체계, 사회 참여 방식을 재정립한다는 의미다. 쉽지 않은 일이다.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의 협력과 인내가 필요하다. 사회적 대화가 진정 성공한다면 국민 각자가 책임있게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민주주의의 실현이 될 것이다.
sheep@newspim.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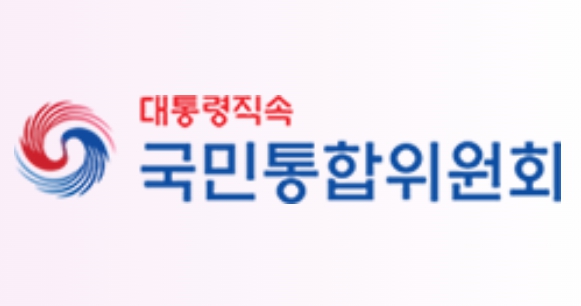
![[기자가만난세상]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20/20251120517173.jpg)




![“AI가 재편하는 세계 질서, 한국 나아갈 길 찾는다” [2025 중앙포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9/93ed73aa-a510-4bf8-b2b6-e24aa98c9d7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