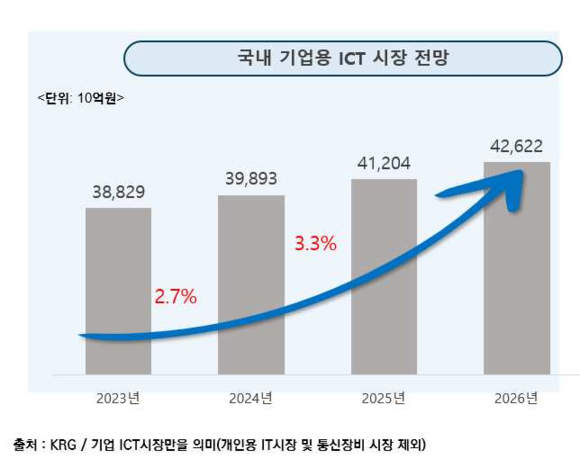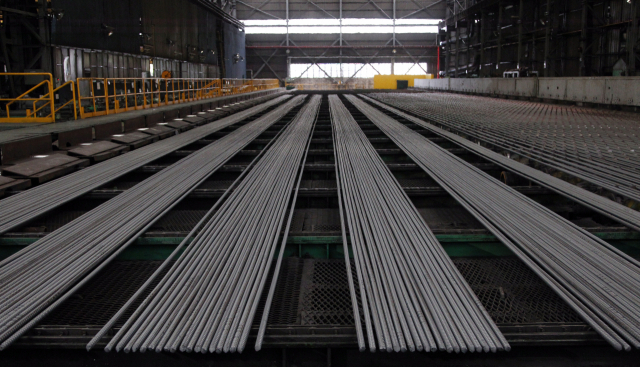면세 산업은 한 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렸다. 특허만 따내면 수백억원의 영업이익이 보장되는 산업으로 인식되면서 많은 업체가 경쟁을 펼쳤다.
하지만 유례 없는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면세 업황은 크게 뒤바뀌었다. 시내면세점 한 구역을 쓸어가던 중국 보따리상(다이궁)도, 양 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20~30명씩 무리 지어 다니던 중국 단체관광객(유커) '깃발부대'도 이제는 예전만큼 흔하게 보기 어렵다. 시내면세점이 텅텅 비면서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도 하나 둘씩 철수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 시장이 변하면서 면세 산업도 영향을 받았다. 단체 관광객 대신 개별 관광객 비중이 늘어났고, 고객 연령층도 20~30대 MZ세대로 낮아졌다. 그 결과 구매 전환율과 객단가 모두 줄었다. 면세업계 큰 손인 중국은 내수 침체로 지갑을 닫았다. 원화 가치 하락으로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넘보면서 가격 경쟁력마저 잃어가는 실정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이라는 브랜드는 존재감이 커지고 있지만 세계 1위였던 '한국면세점'은 오히려 작아지고 있다. 영국 면세 전문지 무디데이빗리포트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세계 2·3위에 랭크됐던 롯데·신라는 각각 4·6위까지 밀려났다. 국내 빅4 면세점을 형성하고 있는 신세계·현대는 상위 10위 내에도 들지 못했다.
추락하는 면세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랜 시간 굳어진 규제는 풀어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특허수수료다. 면세업이라는 특허를 부여 받은 만큼 수익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환원하라는 취지로 도입됐다. 최초 도입 당시 매장 면적에 비례해 산정했는데 지난 2013년부터 수수료 기준을 매출액으로 변경해 규모가 크게 늘었다. 올해 적자가 불가피한 면세점 입장에서는 수익이 없음에도 수백억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특허수수료 기준을 영업이익으로 변경해 숨통을 틔워줄 필요가 있다. 예전처럼 황금알을 낳지 못한다고 고사하게 놔둬서는 안된다. 면세 산업에 대한 시각을 새롭게 고쳐야 할 시점이다.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


![[특징주] 닷밀, 코스닥 상장 첫날 -23%대 급락](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411/1091715_793837_148.jpg)

![[비즈 칼럼] 세계적 관심 얻은 K콘텐트, 성공 이어지려면](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3/886e7dc2-459d-4035-b2b9-0f1799523dc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