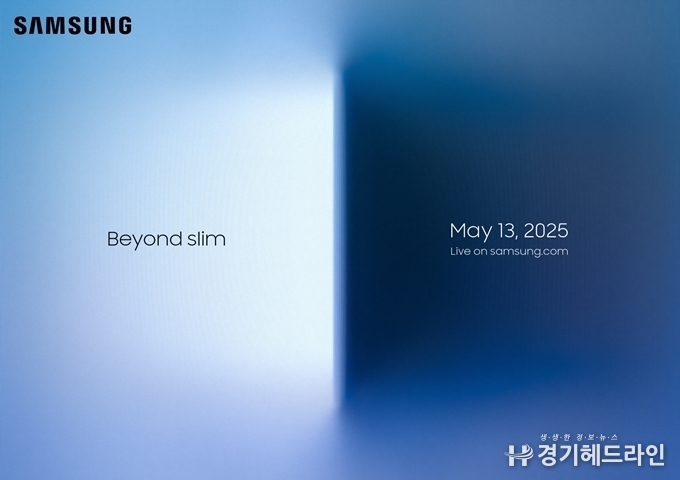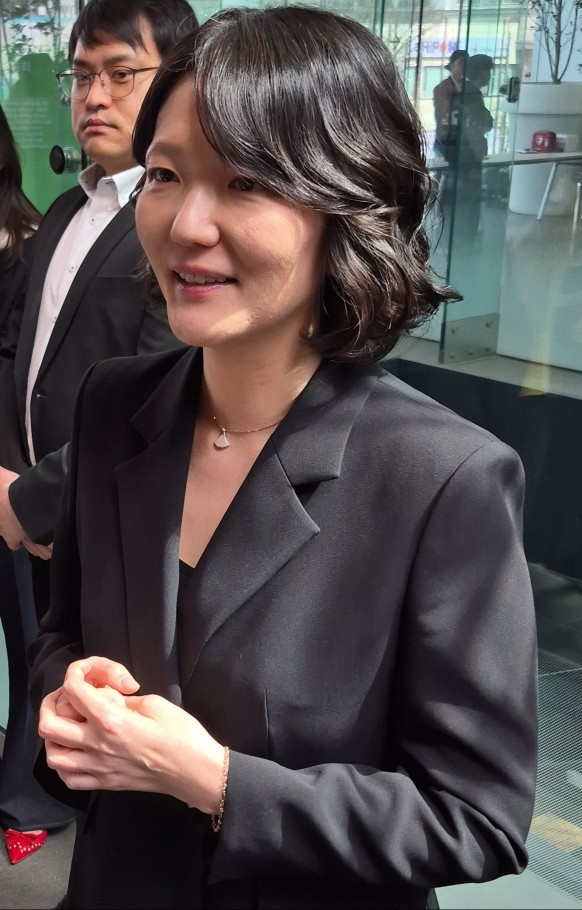고객 서비스의 AI 자동화 추세가 예사롭지 않다. 일상의 단순·반복적인 작업은 표준화되면서 '사람' 대신 터치스크린·챗봇·로봇이 처리하기 시작했다. 식당 주문은 '사람' 종업원 매개 없이 식탁 위에 설치된 태블릿을 통해 이루어진다. 실수하면 못 무른다고 하니 처음 가는 식당에서는 사심이 떨린다. 태블릿으로 식삿값 정산하면서 영수증 필요하면 프런트로 가 말해야 한다.
로봇이 음식을 가져다주는 모습도 일상화됐다. 대기 시간이 단축되고 '사람'은 세심함이 필요한 복잡하거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 집중할 수 있어 인간의 편리를 도모한다고 한다. 문제는 자동화가, 식당의 '물과 추가 반찬은 셀프'라고 쓰인 방식과 같이 식사 절차 부담의 일부를 고객에 전가하거나 종업원의 노동력·시간을 줄인다는 데 있다. 터치스크린에 익숙하지 않아 포기하는 노년층도 점점 눈에 띈다. 인구 절벽이 심각해지면 늘어날 풍경이다. 슈퍼마켓도 이미 반 이상의 계산대가 무인으로 대체되었고 한두 명 '사람' 담당자가 버벅거리는 고객에게 조작 방법을 설명해주는 정도이다. 염가 아이스크림 가게는 아예 무인으로 탈바꿈한 지 오래다.
물론 '사람'만 해낼 수 있는 영역도 있다. 미용이라든지 요리 만들기와 같이 감각적으로 정교하게 손을 놀리거나 발레리나나 K팝 가수가 온몸의 근육·마디로 춤을 추는 작업이 대표적이다. 수백만 년 동안의 진화과정에서 인간 세포에 체화돼 일단 숙련되면 인간에는 쉽지만, 논리·연산에 탁월한 로봇에게는 흉내 내기 어려운 동작이다. '모라베크(Moravec)의 역설'이라고 한다. 로봇이 음식을 날라다 주더라도 안전을 위해 테이블에 옮기는 것은 고객이다. 로봇이 모든 가능성을 예기하거나 다수 가능성 중 신속하게 선별하여 행동하지 못하는 '프레임 문제' 때문이다. 그러나 로봇의 움직임이 점점 '사람' 같아지고 조리 영역에도 자동화가 파고들고 있어 이 같은 주장이 무색할 지경이다. 기술이 '사람'을 보완하지 않고 대체하면 일자리는 없어지고 식당 아르바이트와 같은 계층 사다리는 언제 끊길지 모른다. 이러다 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차가운 기계보다 따뜻한 사람 손이 좋다.'라는 간병 분야 정도일지 싶다.
기계화를 반대한 러다이트 운동을 비판하고 새 포대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하지만, 이는 제1·2차 산업혁명까지의 일이다. 매개의 편리함을 가져온 플랫폼은 코로나와 중첩되면서 오프라인의 몰락을 초래했다. 여기에 더해 챗GPT는 자료 수집·정리를 전담해 온 비서·연구원이나 법무법인 시니어가 물어 온 사건의 법 조항과 판례를 정리하는 초년 변호사와 같은 지적 보조의 일자리를 갈아치울 기세이다. 오픈AI가 연간 3천만짜리 특화 챗GPT를 구상 중이라는데 이러면 인건비 절감과 더불어 능력은 배가되는 '사람' 대체는 곧바로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2030년 가까이서 우리나라의 총인구수가 급감하게 되면, 20년 전부터 일본 편의점에서 젊은 일본 청년을 찾아보기 힘들어졌던 것과 같이, '사람' 손이 아쉬워질 것이기에 보완적 자동화가 가져다줄 편익에 부정의 여지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작금의 경제 혹한기의 젊은 세대와 재취업 문을 두드리는 은퇴세대에는 답이 없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바스리] 노인을 위한 로봇은 있다](https://byline.network/wp-content/uploads/2025/05/hyodol-003.jp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