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 장흥군 회진면은 남도의 끝자락, 바다와 들, 산이 한데 어우러진 어촌이다. 이곳은 문학과 영화, 그리고 음식이 공존하는 예향의 땅이다. 소설가 이청준(李淸俊)이 태어난 회진면 진목리와 한승원(韓承原) 작가의 생가가 있는 신상리는 남도문학의 향기가 짙게 밴 고장이다.
이 두 작가의 작품은 장성군 출신의 거장 임권택 감독에 의해 영화로 다시 태어났다. 임 감독의 영화 《아제아제 바라아제》(1989)는 한승원의 동명 장편소설을 원작으로 하며, 불교적 구원과 해탈의 세계를 형상화했다. 《축제》(1996)와 《천년학》(2007)은 각각 이청준의 『축제』와 『선학동 나그네』를 원작으로, 인간의 삶과 죽음, 예술의 고독을 그렸다.
특히 《축제》와 《천년학》은 회진면 출신 작가의 작품일 뿐 아니라, 실제 회진면 일대에서 촬영되어 문학과 영화, 그리고 삶의 풍경이 겹쳐진 ‘남도 예술의 무대’로 남게 되었다. 《축제》의 주요 배경은 회진면 일대와 장흥군 용산면의 소등섬이다.
영화 속 장례 행렬이 바다를 따라 걷는 장면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흐리게 만들며, 썰물 때 드러나는 소등섬의 길은 “이승과 저승을 잇는 다리”처럼 상징적으로 사용되었다. 이는 남도 사람들이 죽음을 또 다른 삶의 연장으로 받아들이는 세계관을 보여준다. 임권택 감독은 “남도는 죽음마저 예술이 되는 곳”이라 말한 적이 있다. 그에게 회진의 풍경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인간의 근원적 감정을 드러내는 무대였다.
10여 년 뒤, 그는 다시 회진을 찾아 《천년학》을 촬영했다. 이 작품은 이청준의 『선학동 나그네』를 원작으로, 예인의 방랑과 예술의 숙명을 노래한다. 촬영지였던 회진면 회진리에는 세트 일부가 남아 있으며, 이청준의 고향 진목리 앞 마을 ‘산저’는 영화 속 명칭인 ‘선학동 마을’로 불리게 되었다. 지금은 매년 메밀꽃 축제가 열리고, 흰 메밀꽃밭 위로 부는 바람은 소리꾼 송화의 한(恨)과 닮아있다. 문학이 씨앗이 되고 영화가 꽃을 피운 셈이다.
장흥군 회진면의 예술은 스크린 속에만 머물지 않는다. 이곳은 예술이 삶이 되고, 음식이 기억이 되는 마을이다. 이청준과 한승원, 두 작가는 이 어촌에서 나고 자라며 열무된장물회를 먹고 자랐다. 여름이면 가족들이 갓 잡은 생선과 된장, 열무김치를 함께 버무려 식탁에 올렸고, 그 맛과 풍경은 훗날 두 작가의 문학 속 ‘남도의 정한’과 ‘삶의 온기’로 스며들었다.
특히 열무된장물회는 회진면의 풍토와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음식이다. 바닷일을 하던 어부들이 생선과 된장, 열무물김치를 섞어 간단히 끼니를 해결하던 데서 비롯된 이 음식은 남도 특유의 실용성과 공동체 정신을 담고 있다.
“배 위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고, 여러 사람이 함께 나눠 먹기 좋다”라는 회진지역 어르신들의 말처럼 열무된장물회는 ‘나눔의 음식’이다. 생선을 잘게 썰어 식초에 무친 뒤 된장과 열무김치, 잘게 썬 풋고추와 으깬 마늘 등을 섞고 찬물을 부어 먹는 방식은 손쉽고도 소박하다. 밥, 국, 반찬이 하나로 어우러진 그 구조 속에서 남도 사람들의 생활지혜가 배어 있다.
장흥 회진 일대의 열무된장물회는 다른 지역의 물회와 달리 된장과 열무김치를 주된 양념으로 사용한다. 바닷물의 짠맛과 된장의 구수함, 열무의 새콤함이 어우러져 여름철 입맛을 돋운다. 예전에는 해장 음식으로도 애용되어 “술 먹은 다음 날 속이 편하다”라는 말이 회진 어촌의 일상어가 될 정도였다. 이렇듯 열무된장물회는 단순한 별미가 아니라 노동과 생업, 가족과 공동체가 엮인 생활문화의 유산이었다.
오늘날 회진면 일대의 포구에서는 이 전통이 그대로 이어진다. 식당가에는 ‘된장물회’ 간판이 늘어섰고, 가정에서도 여전히 여름철 별미로 즐긴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의 아버지 한승원 작가가 태어나 자란 이곳을 찾는 문학 여행객들이 늘어나면서, 열무된장물회는 남도의 입맛과 외지인의 발길을 잇는 문화적 연결고리가 되었다.
문학과 영화, 음식이 한데 녹아든 회진면은 그 자체로 남도의 예술이다. 이청준의 문학이 인간의 고통을 성찰했다면, 임권택의 영화는 그 고통을 영상의 서정으로 승화시켰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된장물회 한 그릇에 삶의 지혜와 나눔의 미학을 담았다.
삶과 죽음, 예술과 일상, 맛과 기억이 공존하는 회진의 풍경은 그 자체로 하나의 ‘남도의 축제’다. 한승원의 언어로, 이청준의 문학으로, 임권택의 카메라로 이어진 예향의 리듬 속에서, 회진의 열무된장물회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바다의 생선과 육지의 채소가 만나 맛과 삶을 노래하는 또 하나의 예술이다.
참고문헌
허북구. 2025. 광양버꾸놀이로 읽는 광양숯불고기. 전남인터넷신문 허북구농업칼럼(2025-10-21).
허북구. 2021. 페루 세비체와 장흥 열무김치 된장물회. 전남인터넷신문 허북구농업칼럼(2021-12-20).
허북구. 2025. 정남진 장흥의 여름 별미, 갯장어와 된장물회. 전남인터넷신문 허북구농업칼럼(2020-06-01).
허북구. 2020. 장흥 된장물회와 열무김치. 전남인터넷신문 허북구농업칼럼(2020-09-09).
허북구. 2013. 근대 장흥의 된장물 문화와 된장물회. 세오와 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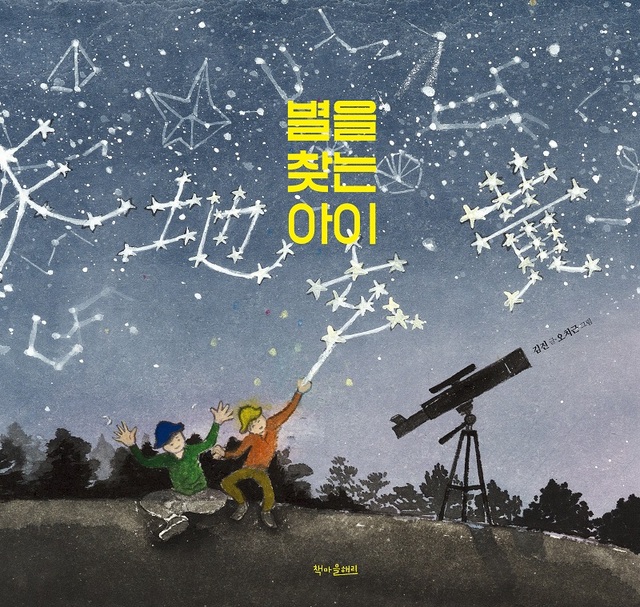


![[이 사람] 신한주 치과의사 겸 사진작가, 랜즈로 바라본 보이지 않는 세계](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1042/art_17605067728832_dfc9c1.jpg)

![[라이프 트렌드&] '건축의 마법사' 가우디의 예술·낭만을 만나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1/c4b8bc6b-ae55-4b20-bc6f-5b0e93961b6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