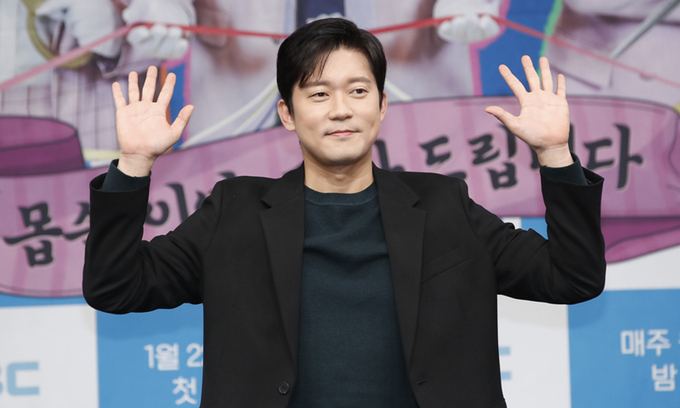대학 졸업생 김모씨(28)는 지난해 8월 1년 가까이 일한 영어학원을 그만뒀다. 학원생 수가 줄면서 그가 맡았던 수업이 폐강됐기 때문이다. 다른 학원 일자리를 찾았지만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곳은 없었다. 그는 “교육 쪽이 적성에 잘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실직해 막막한 심정”이라며 “공기업도 도전해보고 있지만 요즘 취업 문이 좁아 쉽지 않다”고 했다.
지난해 직장 폐업이나 정리 해고 등으로 일자리를 떠난 ‘비자발적 실업자’가 4년 만에 증가해 137만명을 넘어섰다. 주 17시간 이하로 일하는 ‘초단기 노동자’는 처음으로 250만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고용의 질과 양이 나빠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통계청 고용동향 마이크로데이터를 보면, 지난해 비자발적 실업자는 137만2954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0만6761명(8.4%) 늘어난 수치다. 비자발적 실직에는 ‘직장의 휴업·폐업’ ‘명예퇴직·조기퇴직·정리해고’ ‘임시적·계절적 일의 완료’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 부진’ 등의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가 포함된다.
비자발적 실업자는 코로나19 펜데믹 당시인 2020년 180만6967명으로 전년 대비 35.9% 급증했다. 이후 2021년 169만명→2022년 130만명→2023년 127만명으로 3년째 감소세를 이어가다 지난해 반등했다. 지난해 전체 퇴직자 10명 중 4명(42.9%)은 비자발적 실업자였다. 경기 침체로 실적 부진에 시달리는 기업들이 권고사직 등을 통해 구조조정에 나선 영향으로 분석된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종업원을 둔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증가한 영향도 있다.
‘초단기 취업자’ 증가세는 두드러졌다. 주당 1~17시간 일한 초단시간 근로자는 지난해 250만명으로 전년 대비 10.2% 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 36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도 881만명으로 역대 최대였다. 36시간 미만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8%로 1년 새 6.9%포인트 급증했다.

초단시간 근로자가 증가한 것은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특수고용노동자가 많아진 영향이 크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플랫폼 종사자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2.5%에서 2022년 3.0%, 2023년 3.3%로 매년 늘고 있다. 또 청년 취업난으로 단기 일자리를 구하는 경향이 심해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초단기 노동자는 통상 노동 환경이 불안정한 경우가 많다. 고용보험법은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된다.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는 주휴수당이나 퇴직금도 따로 받지 못한다. 정부는 올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플랫폼 종사자의 권리 강화를 골자로 한 ‘노동약자지원법’ 제정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경기 부진 탓에 최근 기업도 정규 일자리보다는 땜질식 초단기 일자리를 늘리고 있다”면서 “비상계엄 후 탄핵 정국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매우 커져 올해도 이런 추세가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원 5명 이하 영세 자영업자의 고용원을 보호할 ‘전국민고용안정망’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에듀플러스]2026학년도 N수생 최대규모 갱신할까…의대 정원 조정 변수](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1/07/rcv.YNA.20250107.PYH2025010711990001300_P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