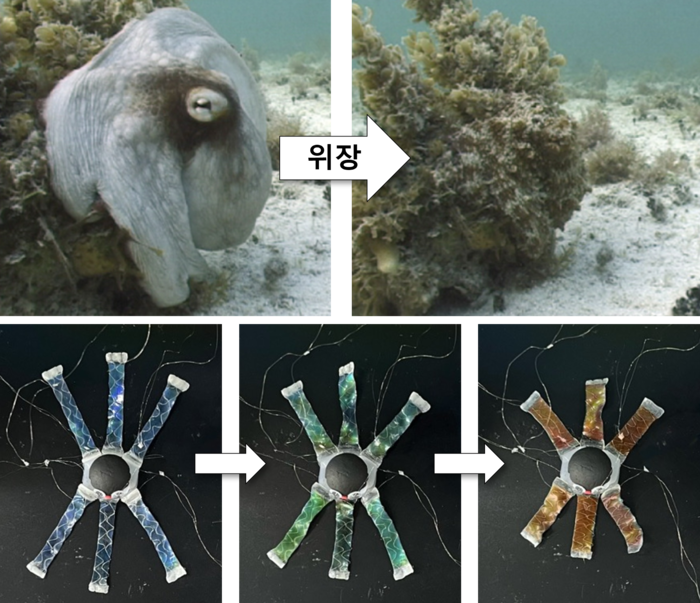인공지능(AI)은 생명을 모방할 수 있을까. 물로 된 컴퓨터가 필요할까.
데니스 노블(89)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 겸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초빙 석좌교수는 지난 11일 서울대 ‘룩스 메아(Lux Mea, 나의 빛)’ 포럼에서 이렇게 물었다. 컴퓨터의 핵심은 반도체 칩이고, 반도체 칩의 주재료는 실리콘이다. 실리콘이 아니라 물로 된 컴퓨터라니, 무슨 얘기일까.

인공지능 Vs. 생명의 지능
서울대 정밀기계설계공동연구소(소장 안성훈 교수)가 주관하고, DIGIST 등이 공동 주최한 이날 포럼의 주제는 ‘생명과 반도체: 지능의 본질과 미래 탐구’였다. 노블 교수는 전산생리학 분야의 석학이다. 1960년 컴퓨터를 사용해 세계 최초로 심장 박동을 수학적으로 규명한 ‘가상 심장(Virtual Heart)’ 모델을 만들었다. 이후 생명체를 유전자ㆍ단백질 등 개별 단위가 아니라 전체 네트워크 관점에서 분석하는 시스템생물학을 이끌어 왔다.
그는 강연에서 단단한 실리콘 결정 기반의 컴퓨터와 자유롭게 운동하는 물 분자로 된 생명체를 비교하며, AI와 생명체의 지능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가장 작은 유기체인 박테리아도 200억개의 물 분자로 돼 있다며 “현존하는 어떤 컴퓨터도 그 무수한 분자 상태를 재현할 수 없다”고 말했다. 빠르고 정확한 AI에 비해 생명체는 느리고 부정확하지만 “확률성을 바탕으로, 목적을 갖고, 창의적으로, 스스로를 통제한다”고 했다.
결국 자신의 질문에 대한 스스로의 답은 ‘생명 현상은 너무 복잡해, 생명체를 모방한 AI를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었던 셈이다.
사람과 똑같은 AI, 가능할까
노블 교수는 포럼 뒤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생명체는 30억~40억년에 걸친 진화를 통해 단계적으로 발전해 왔다”며 “생물학계 누구도 아직 그 모든 것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서울에 있는) 내 주먹이 뉴클레오타이드(DNA의 기본 단위)라면 세포막은 평양쯤에 있다. 그렇게 멀리 떨어진 생체 시스템이 분자 규모에서 어떻게 연결돼 작동하는지는 상상 밖”이란 것이다. 그는 AI가 생명을 모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빨리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능을 모방할 수 있다고 해도 가치의 문제가 남는다는 지적도 했다. “AI에게 우리와 같은 마음(mind)과 정신(spirit)이 있을까”라고. 그는 포럼에서도 이를 대단히 ‘도전적인 과제’로 언급했다. “어떤 학문도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며 시스템생물학자와 철학자, 엔지니어와 컴퓨터과학자 등의 학제 간 연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런 노블 교수의 ‘AI론’에 대해선 다른 의견도 있다. 기계공학자인 이건우 DGIST 총장은 포럼 대담 때 ‘공학적 관점에서 AI가 어디까지 갈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AI가 사람과 진짜 똑같아지려면 정신이나 감정 같은 것도 다룰 수 있어야겠지만 ‘꼭 그래야 하냐’의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AI가 “인간의 기능을 확장”하는 걸 넘어 “인간의 모든 걸 대체하는 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생명의 ‘주인공’을 둘러싼 공방
AI가 생명을 모방하기 힘들 것이란 노블 교수의 판단 근거 중 하나인 ‘생명체의 목적성과 주체성’은 사실 생물학계의 오랜 논쟁거리다. ‘특별한 목적 없이 자연선택된 유전자가 생명의 핵심이고, 생명체는 유전자의 운반체(vehicle)’라는 주류 이론(유전자 중심주의)과 정반대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 문제를 놓고 지난 2022년 『이기적 유전자』의 저자 리처드 도킨스와 치열한 공개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노블 교수는 이날도 “도킨스는 빼어난 작가, 빼어난 스토리텔러지만 완전히 틀렸다”며 “유전자는 생명의 설계도(blueprint)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 예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들었다. 이전에 없던 바이러스에 노출된 우리 면역 시스템이 스스로 유전자를 바꿔 면역 능력을 갖게 됐다며, “(유전자가 우리를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유전자를 바꾼다”고 말했다.
지지부진한 유전자 치료제 개발 현황도 반례로 들었다. 유전자가 생명의 설계도라면 지난 2003년 인간의 유전체 지도가 모두 공개(휴먼 지놈 프로젝트)된 뒤에도 왜 여전히 유전자 질환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고 있냐는 것이다.

“유전자 중심 치료법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포괄적인 재평가가 필요하다. 단순한 연관성(mere association)과 실제 인과관계(real causation)는 다르다. 조현병 관련 유전자는 약 300개나 된다. 그 중 어느 것도 원인이 아니다. 특정 질병에 관련된 유전자를 찾아낸다고 병을 치료하진 못한다.”
유전자 치료의 대안에 대해선 “유전자와 함께 세포와 장기, 전체 시스템을 함께 모델링해야 한다”며 자신의 심장 박동 연구를 사례로 들었다. 그는 1960년 ‘가상 심장’ 연구를 발전시켜 1992년 심장 세포 내에 최소 3~4개의 생리적 네트워크가 존재하며, 그중 하나가 작동을 멈춰도 나머지 네트워크가 그 기능을 대체해 심장이 정상 박동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한 프랑스 제약회사는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심장박동이 지나치게 빨라질 때, 심장에 치명적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부드럽게 심박수를 늦춰주는 약물을 개발했다.
그는 “그래도 학계는 여전히 유전자 중심 아니냐”라는 질문에 “자신이 서 있던 곳에서 물러나는 것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라며 “3년 전 토론 때 도킨스가 ‘당신이 옳다면 나와 다른 많은 과학자들이 50년 동안 다 틀렸다는 얘기’라고 하더라. 나는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였고 청중들은 웃었다”며 전했다.
이어 자신을 비판하는 주류 학자들에 대해, 웃으며 “내 연구 결과를 정리한 새 책(『The Pacemaker Channels of the Heart』)이 막 나왔다”며 “책에 내 답이 있다”고 말했다.

 AI 시대를 넘어 100년을 준비하는 교육개혁](https://img.newspim.com/news/2025/11/14/251114152525778_w.jpg)
![[ET시론] 'AI 네이티브 세대'를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3/21/news-p.v1.20250321.be8e4781f7b447cea23c619ee19319be_P3.jpg)

![[배양수의 Xin chào 1] 사이공(Sài Gòn)인가 서공(西貢)인가?](https://www.aseanexpress.co.kr/data/photos/20251146/art_17631619361994_4a7362.jpg?iqs=0.6702160863983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