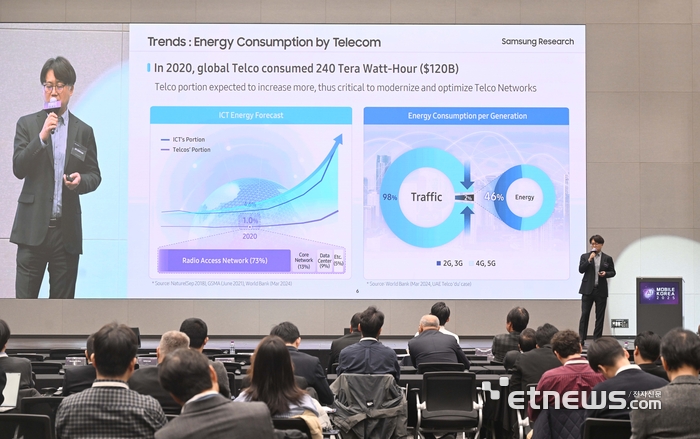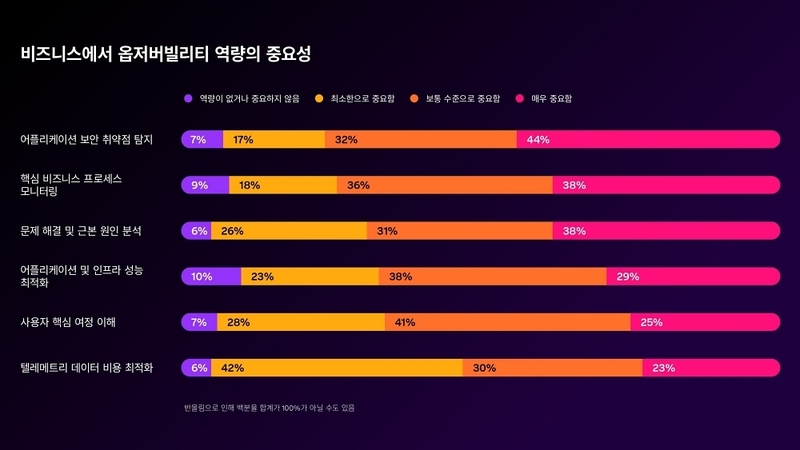인공지능(AI)은 일상생활과 업무 전반에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 특히 유용한 콘텐츠 생산 도구로서 AI에 대한 활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기 어려워져 혼란스럽다는 반응도 많지만, 이용을 막을 수는 없다. 뉴스라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언론사도 마찬가지다. AI 활용이 주는 효율성은 이미 저널리즘을 변화시키고 있다. 뉴스콘텐츠 품질과 관련된 여러 우려와 함께 탐사보도·심층보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생존전략은 상식이 됐다. 뉴스콘텐츠 생산 보조 도구로서 AI 활용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많다.
그럼에도 언론사와 AI기업의 갈등은 골이 깊어지고 있다. 국내외 많은 언론사는 AI기업과 소송 중이다. 뉴스저작권과 공정이용을 둘러싸고 양측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뉴스콘텐츠 이용 계약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저명한 거대 언론사의 얘기다. 다른 많은 언론사는 해결 방안을 찾기가 난망하다. 일단 지켜볼 수밖에 없다. 할 수 있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AI 서비스에서 뉴스콘텐츠의 기여분을 증명해야 한다.
지난 7월 미국의 AI 기반 브랜드 마케팅 회사인 제너레이티브 펄스(Generative Pulse)는 ‘AI는 무엇을 읽고 있나?(What Is AI Reading?)’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대표적 AI 서비스인 챗지피티(ChatGPT), 제미나이(Gemini), 클로드(Claude)의 인용 출처를 분석한 것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AI가 인용한 출처의 27%가 저널리즘 콘텐츠였다. 이중 최신성과 관련된 질문만을 보면, 49%에 해당한다. 물론 이들 AI는 로이터, AP, 파이낸셜타임스 등과 같이 잘 알려진 신뢰할 수 있는 출처, 즉 저명한 거대 언론사의 콘텐츠를 주로 인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저널리즘 콘텐츠는 주관적 질문보다는 객관적 질문에서 더 많이 인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I 서비스별로 저널리즘 콘텐츠 인용에 차이가 있었다. 챗지피티와 제미나이가 클로드보다 저널리즘 콘텐츠를 훨씬 더 많이 인용했다. 한편, 이들 AI의 유료 콘텐츠 인용은 5% 미만이었다.
언론산업 입장에선 막연히 그럴 것이라는 추측이 사실로 증명된 순간이다. 이제 대응이 남는다. AI 기업은 수많은 언론사 중 일부와 계약하면 그만이라는 견해일 것이다. 언론사가 AI기업과 맺는 개별 계약을 막을 방법이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 하지만 얼마나 평등한 조건에서 합리적으로 계약이 이뤄지는지는 살펴봐야 한다. 계약 내용의 상당수가 기술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언론사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때 언론사와 AI기업 간 ‘표준계약서’가 필요하다.
이 표준계약서를 근거로 해 개별 언론사는 AI기업과 뉴스콘텐츠 데이터 이용 계약에서 고려하고 점검해야 할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내용은 뉴스콘텐츠 데이터의 이용 목적과 방법, 뉴스저작권 및 뉴스콘텐츠 보호 방안, 보상의 형태와 비용 산정 방식, 명시적인 계약 조건과 법적 내용, 기술 지원 및 협력 내용, 모니터링 및 투명성 보고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촘촘히 구성돼야 한다. 특히 뉴스콘텐츠 데이터의 이용 범위와 보호, 보상을 위한 뉴스콘텐츠 가격의 산정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계약 당사자인 언론사와 AI기업 간 공정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제정과 보급에 국가행정기관이 적극 나서야 한다.

![AI, 인간 일자리 침공 서막…아마존 본사 3만명 자른다 [팩플]](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8/b4188b83-b441-4f21-9092-ead80f7e6a22.jpg)
![[K-오픈소스]“AI 시대 오픈소스 해법, '보안 거버넌스·하이브리드 DB'에서 찾아야”](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0/27/news-p.v1.20251027.0b49c5d66db1430b93b414109bbd4c33_P1.jpg)
![[APEC CEO 서밋] 가먼 AWS CEO "AI 에이전트가 산업 혁신"...400억 달러 투자](https://img.newspim.com/news/2025/10/29/2510291150353040.jpg)
![[로터리] AI생태계 구축 위한 저작권](https://newsimg.sedaily.com/2025/10/27/2GZCAZNAEP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