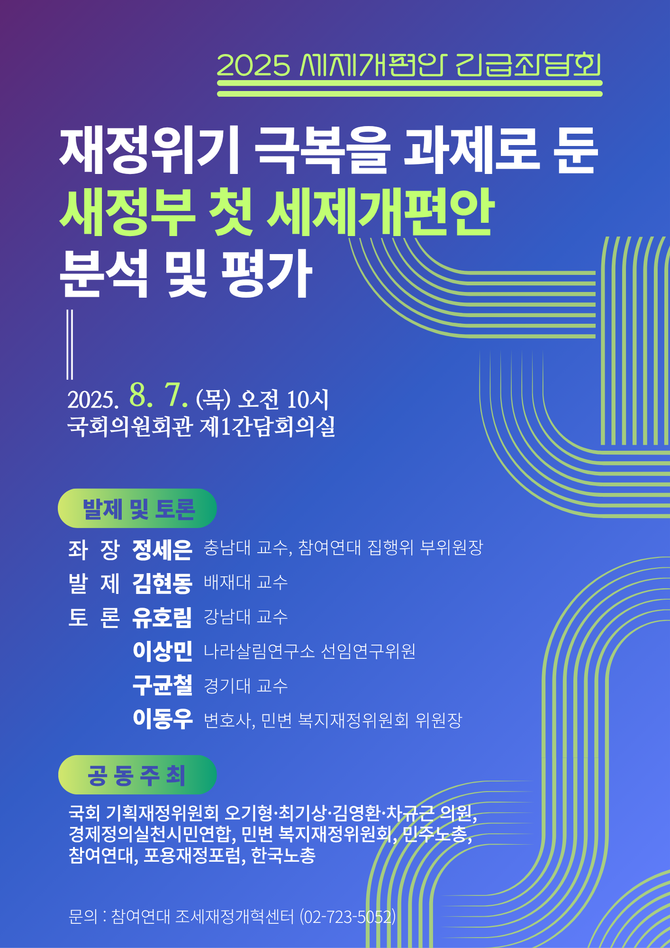민선 지방자치 시대가 부활한 지 올해로 30주년이다. 한 세대의 성과를 냉정히 평가해야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2022년에 지방자치법이 전면개정됐다. 2020년에는 지방일괄이양법이 제정되고, 2010년 지방소비세를 신설했다. 2007년엔 총액인건비 제도와 주민소환제가 도입됐다. 앞서 2004년의 주민투표제가, 1995년의 단체장 주민직선제 등이 떠오른다.
민선 자치의 성과를 한마디로 간추리면 주민 중심의 지방행정 구현이다. 임기가 보장된 자치단체장은 주민을 바라보며 지역 밀착형 행정 서비스에 매진했다. 민선 자치는 적잖은 성과가 있었지만 ‘2할 자치’라는 미로에 갇혀 있다.
지역 밀착형 행정 서비스 성과
일·책임 걸맞게 재정 이양하고
정당공천제는 폐지 또는 혁신을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따져보면, 그동안 지방자치는 철저하게 중앙 재원에 종속됐다. 비록 지방세 비율이 1995년 21.2%에서 2023년 24.6%로 높아졌으나 여전히 20%대 구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지방 사무 비율(36.5%)과의 간극은 더 큰 문제를 불러온다. 일과 책임은 넘기고 필요한 재원을 이양하지 않아 지방자치의 실패 가능성을 안고 있다. 그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국세 이양을 통한 ‘3할 자치’를 호소한다. 과감한 재원 이양 없이는 차세대 지방자치를 기약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정당공천제다. 현행 대표선출권은 외견상 견고해 보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정당 지배의 고약한 덫에 걸려 있다. 1995년 임명직 단체장에 의한 ‘관치’에서 선출직 단체장에 의한 ‘자치’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당공천제라는 ‘당치(黨治)’가 갑자기 끼어들었다. 1991년부터 2002년 지방선거까지는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을 배제했으나 2006년부터 정당공천제를 도리어 확대했다. 정당공천제는 정당정치와 책임정치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지만, 공천 비리가 문제 되고 정당의 지방 지배라는 폐해를 낳는다. 정당공천제가 있는 한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정당과 국회의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재원 이양과 정당 지배 중에서 더 급선무는 당색(黨色) 제거다. 기본적으로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 백번 양보해 지방선거에 대한 정당 개입을 인정하더라도 정당공천제를 혁신해야 한다. 정당이 입맛에 맞는 후보를 천거하는 정당공천제를 탈피해 주민경선에서 뽑힌 후보를 사후에 인정하는 정당추인제로 바꾸자. 주민경선에서 승리한 후보를 정당이 추인하면 정당공천제의 폐해를 없애면서 정당정치의 취지도 살릴 수 있다. 정당과 국회의원들도 정당공천제를 통해 지방자치를 지배할 의도가 아니라면 정당공천제 혁신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재원 이양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다. 적어도 지방 사무에 상응하는 지방세를 보장해야 한다. 지방 사무 비율이 36.5%이니 지방세 비율도 최소한 35% 이상으로 올려줘야 한다. 사무만 이양하고 재정을 그만큼 배정하지 않으면 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실패 가능성이 커진다. 결국 주민들에게 지방자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물론 국세 이양과 3할 자치는 말처럼 간단하지는 않다. 2023년 기준으로 국세는 344조원이고 지방세는 123조원이다. 국세 중 25조원을 지방세로 이양해야 3할 자치가 가능해진다. 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의 25.3%)의 비율을 35%로 올려도 지방세는 약 7조원밖에 증가하지 않는다. 법인세의 20%(약 16조원)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3할 자치는 꿈도 꾸기 어렵다.
이제는 지난 30년 동안 이루지 못한 정당공천 혁신과 재원 이양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정당공천 혁신은 정당과 국회의 반대를 극복해야 하고, 재원 이양은 기획재정부를 설득해 재정 격차의 산을 넘어야 한다. 그래도 결코 포기할 사안이 아니다. 풀지 못할 매듭이 없듯이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두 문제는 서로 긴밀히 연결돼 있다. 사무에 상응하는 재원이 이양되면 주민의 시각이 달라지고, 이를 통해 정당과 국회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 주민의 지지가 있다면 정당공천 혁신과 재원 이양이 수월해진다. 당색은 최소한으로 빼고 재원 이양은 최대한으로 늘려야 민선 자치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사설] 모든 지방의원의 겸직 실태 전수조사 하길](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5/08/.cache/512/20250508580175.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