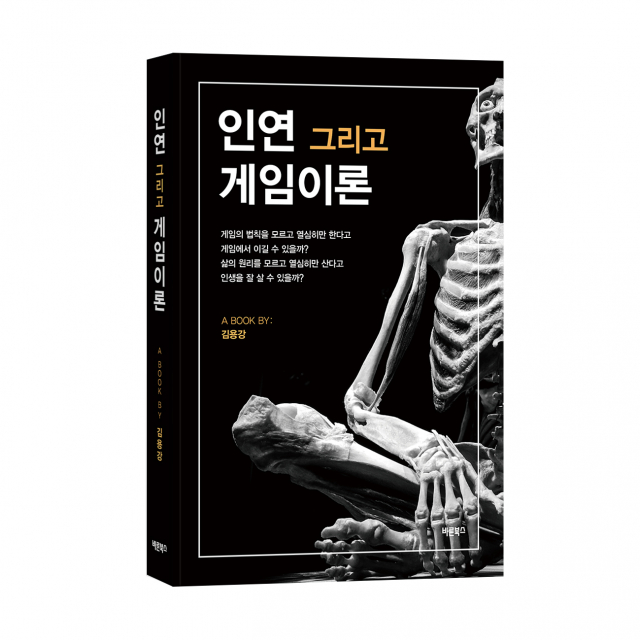군자란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에서 존경받는 이상적 인간상으로서 ‘성품이 어질고 학식이 높은 지성인’을 이르는 말이다. 이런 군자는 응당 사회에서 ‘모심’을 받아야 한다. 모신다는 것은 우러러 존경하고 예(禮)를 갖춰 따르면서 배우는 것을 뜻한다. 예는 물론 마음이 중요하지만, 표현방법도 필요하다. 이에, 공자는 군자를 모시는 방법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대화할 때는 말꼬리를 잡아 조급하게 묻지 말고, 응당 반응을 보여야 할 때는 반응을 숨기지 말며, 마치 장님인 양 군자의 안색을 살피지 않은 채 제 말만 하는 무례를 범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를 조(躁), 은(隱), 고(瞽) ‘3건(愆)’ 즉 ‘세 가지 허물’로 제시했다.

학생에게 선생님은 군자를 넘어 ‘스승’이다. 그런데, 오늘날의 학생들은 ‘3건(愆)’을 경계하기는커녕 오히려 범하려 덤비는 것 같다. 발표력 신장을 이유로 아무 질문이나 해대고, 질문에 대꾸도 안 하며, 선생님의 입장은 무시한 채 제멋대로 행동한다.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리 없다. 스승은 쉼 없이 인품과 실력을 닦아야 하고, 사회는 그런 군자 스승을 존경해야 한다. 군자 스승을 그저 동등한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인식하는 사회는 평등사회가 아니라 야만 사회이다.
김병기 서예가·전북대 명예교수

![[김정기의호모커뮤니쿠스] 말의 관계망](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9/07/20250907511350.jpg)
![[기고] 궁신접수(躬身接受)의 삶의 미학](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7/27/.cache/512/2025072758026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