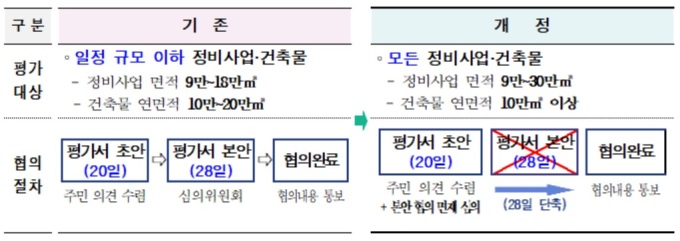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자체적으로 영상물 등급을 매기기 시작한 뒤 청소년관람불가 콘텐츠의 공급은 늘어난 반면 공식 사후조치는 한 자릿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등급 분류의 완화 경향이 뚜렷한 가운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온라인등급분류서비스를 자체 집계한 결과, 2023년 6월 OTT 자체등급분류제도가 시행된 뒤 청소년관람불가 콘텐츠 비중은 제도 시행 전(2022년 1월~2023년 5월) 20.6%에서 시행 후(2023년 6월~2025년 5월 17일) 14.1%로 감소했다. 이에 비해 전체관람가는 같은 기간 21.7%에서 40.8%로 급증했다. 이용 제한이 적은 콘텐츠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사후관리 법적조치인 직권재분류 등급을 받은 건수는 2023년 6건(2.9.0%), 2024년 9월 기준으로는 2건(1.1%)에 불과하다.
특히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등급을 수정해 종결한 '자진수정' 사례는 2024년 같은 기간 43건(23.8%)에 달한다. 이는 실질적 조치 없이 종결되는 구조다. 영등위의 법적 조치 이전에 자진수정이 이뤄지면서 제재 없이 마무리된다는 점에서 사후관리 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유사한 자율등급제 기반의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비교하면 차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게임위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요건으로 전담 인력과 외부 자문 전문가 지정, 업무 지원 시스템 구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정 기간은 3년이며 업무 적정성 평가에는 사업자가 제출한 계획의 이행 여부도 반영된다. 등급 책임자뿐 아니라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에 대해서도 연 4회 교육 이수가 의무화돼 있다.
OTT의 경우 지정 요건은 상대적으로 간소화돼 있고 지정 기간도 5년으로 게임보다 길다. 등급분류 책임자 지정 외에 별도 인력 구성 요건은 없으며 업무 적정성 평가는 등급 준수 여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교육 체계 면에서도 등급 책임자 1인의 연 2회 교육만 의무화돼 있으며, 실제 등급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에 대한 제도적 교육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업무 적정성 평가에 이행 계획을 포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지정 기간에 차등을 두는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자체등급분류제는 OTT 사업자가 영등위의 사전 심의 없이 자체적으로 콘텐츠 등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넷플릭스, 티빙, 웨이브, 쿠팡플레이, 디즈니플러스 등 지정사업자가 등급을 결정하면 즉시 심의가 완료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등위가 적정성을 재평가하는 사후 규제 방식이다. OTT 산업 발전을 위해 기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동십자각] IMA 사업 특혜 논란 자처한 금융당국](https://newsimg.sedaily.com/2025/05/18/2GSUHWL9J3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