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경 기자 greennforest21@kyeonggi.com
기자페이지
할아버지·아버지 등 8대 걸쳐 ‘옹기장’ 계승 어린 시절 ‘가마’ 놀이터이자 보금자리 삼아 SNS 활용해 해외에서 큰 인기 끌어 전통에 현대 예술성 접목해 ‘글로벌화’ 온힘
청년 장인, 전통을 잇다⑥ ‘옹기장’ 전수자 김희건씨

3.3㎡(1평) 남짓한 물레간에 자리를 잡는다. 옹기와 그 앞에 자리 잡은 이, 단 둘뿐이다. 호숫가의 우아한 백조처럼 정적이고 고요한 공간 아래로는 두 발이 분주하고 바쁘게 움직인다. ‘통통통…’. 팔 길이의 동그란 가래떡 같은 점토를 또아리 삼아 쌓아 올리고, 바느질 하듯 점토를 한 땀 한 땀 엮어내며 쌓아 올리다 보면 어느새 여러 겹의 흙덩이는 하나의 옹기로 이어져 있다.
이제 기다림의 시간이다. 건조 과정을 거친 옹기를 가마로 옮겨 포개어 쌓는다. 불을 땐 그곳에 은은하고 서서히 온기를 높이며 6일을 보내고, 마지막 7일 차에 1천200도의 뜨거움으로 옹기를 완성한다. ‘옹기’. 투박하면서도 묵직하고, 건조한 이 옹기에는 온 가족의 식탁을 채우는 각종 장과 반찬, 집안의 소중한 물건들을 품어낸 따스함이 담겨있다.
2002년생 김희건씨는 경기도 무형유산 옹기장 전수 장학생이다. 2023년 전수 교육을 받기 시작해 지난해 전수 장학생이 된 그는 8대에 걸쳐 옹기의 길을 얼어 온 장인 집안의 막내로 그의 할아버지는 김일만 국가 무형유산 옹기장 보유자이고, 아버지는 김용호 경기도 무형유산 옹기장 보유자다. 어린 시절부터 전통의 길을 걸어온 그는 현재 현대미술 전공자이자, 유튜버이자, 인스타그램 팔로워 약 2만 1천명을 보유한 MZ세대 청년 장인이다.
■ 경기도의 중요한 민속자료가 된 가마, 그 곳에서 놀며 자라나…

옹기의 핵심은 옹기가 파손되지 않도록 잘 구워 완성하는 일이다. 그렇기에 ‘가마’란 존재는 옹기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 희건씨의 집안에서 가장 상징적이고 중요한 공간이자, 현재 경기도 민속자료 제11호인 여주 이포리 옹기가마는 어린 시절 그의 놀이터이자 보금자리이기도 했다.
집안 어르신들이 옹기를 만들어 가마터로 옮겨오면 희건씨를 비롯한 어린 자녀들은 입구에서부터 25m 길이의 가마 안으로 항아리를 옮겼다. 옹기를 굽는 과정이 끝나면 치킨 한 마리 얻어먹는 뿌듯한 일터이기도, 어느 9살 땐 새벽 2시까지 불을 지켜보다 그곳에서 잠이 들기도 한 공간이었다.
MZ 장인인 희건씨는 그의 집안에 젊은 시각으로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초등학생 시절부터 정해진 길처럼 ‘틀’이 있는 옹기의 길을 집안 어르신들과 걸어온 그는 현재 대학에서 현대미술을 전공하고 있다. 평일이면 의왕의 계원예대에서 순수미술을 공부하고, 주말에는 가족이 있는 여주로 내려와 전수 교육을 받고 있다. 명확한 ‘틀’이 정해져 있는 옹기와 자유로움의 상징과도 같은 순수예술 사이에서 희건씨는 자기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 팔로워 2만명·숏폼 활용 젊은 장인… 한국 전통 교육으로 해외에서 큰 관심 일으켜

“전통에 매몰되지 않고, 시대에 맞춰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 볼 생각입니다.”
희건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적극 활용해 옹기의 매력을 젊은 세대는 물론 해외에까지 전파하고 있다. 최근 종료한 여주 도자기 축제, 지난 1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한국 전통 옹기 제작 워크숍’ 등에서 아버지의 작업 과정을 찍어 올린 숏폼 영상은 조회수 220만을 기록했다. 또 해외의 많은 이들이 그의 집안으로 옹기 제작을 체험하기 위해 줄을 서며 인기 강사로 거듭나기도 했다.
그가 이 같은 길을 걷는 이유는 사라져가는 전통, 집안의 소중한 과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다. 2000년대 초반엔 아침에 눈을 뜨면 사람들이 줄지어 구매를 기다릴 정도로 한 때 옹기는 불티나게 팔렸다. 하지만 김치냉장고, 값싼 플라스틱 용기 등이 인기를 끌수록 옹기에 대한 수요는 줄었다. 이에 희건씨는 전통이 나아갈 길을 젊은 감각으로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삶을 대하는 태도 알려준 인생의 장인 할아버지…“전통 새롭게 일으킬 것”

“할아버지는 제게 삶을 대하는 자세를 가르쳐주셨습니다.”
23살. 어린 나이지만 그의 책임감은 여느 장인 못지 않다. 어깨너머 배웠던 옹기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하면서 높은 벽에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 전동물레 대신 수동으로 발을 움직이는 물레, 옹기가 커질수록 더해지는 무게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남몰래 울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그를 묵묵히 응원했다.
일평생 ‘옹기’ 밖에 생각하지 않았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길을 따라 희건씨 역시 전통의 명맥을 이어가려고 한다.
2027년엔 전통 옹기 기법을 집중적으로 연습하고, 그해 아버지와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옹기 워크숍을 할 계획이며 이듬해엔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와 옹기를 배우는 마스터 클래스를 만들겠다는 청사진도 만든 상태다.
“전통과 현대, 그 사이에서 저 만의 길을 찾아갈 겁니다. 전통 공예와 순수미술의 영역을 넘나드는 작가로 전통성과 현대성, 예술성을 모두 갖춘 우리의 훌륭한 옹기를 전 세계에 알리는 데 힘을 쏟겠습니다.”
옹기란?
‘옹기’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다소 생소한 단어처럼 들린다. 하지만 옹기는 선사시대부터 우리 곁을 지켜온 존재다. 국가유산청 등에 따르면 ‘도기’와 ‘자기’를 합친 개념이 ‘도자기’다. 옹기는 이 중 도기에 속하는데, 직접 흙을 채취해 가공한 후 원하는 형태로 성형해 시유·건조하고, 가마에 쌓아서 불에 굽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옹기는 ‘숨을 쉰다’. 옹기토의 미세한 모래 알갱이가 옹기의 안과 밖으로 공기를 통하게 해 간장, 김치, 젓갈과 같은 발효 음식의 저장 그릇으로 많이 사용되고, 옹기를 가마 안에 넣고 굽는 과정과 잿물유약 등으로 보관품을 잘 썩지 않게 만드는 특성이 있다.
성형 기법은 지역에 따른 차이가 있는데, 경기도를 비롯한 중부지방에선 흙을 가래떡 형태로 둥글게 만드는 흙가래(질가래)를 쓰며, 흙을 층층히 쌓은 기술인 ‘타림’의 측면에선 마치 바느질을 박는 모습과 흡사하다고 하여 ‘배기타림’ 기술을 활용한다.
●관련기사 :
광대 왔소, 줄을 서시오…줄타기 이수자 ‘한산하’ [청년 장인, 전통을 잇다①]
“열 네살에 매료된 양주별산대놀이, 이젠 운명”…이수자 ‘윤동준’ [청년 장인, 전통을 잇다②]
“세밀함의 예술, 완성에 끝이 없어”…불화장 전수자 ‘정수현’ [청년 장인, 전통을 잇다③]
“마을의 뿌리, 우리가 지키는 것”…화성팔탄민요 전수자 ‘이정민’ [청년 장인, 전통을 잇다④]
3대에 걸쳐 전하는 입사의 매력…‘빛이 된 금과 은의 향연’ 입사 전수자 ‘박승준’ [청년 장인, 전통을 잇다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막걸리엑스포에서 눈길 끄는 막걸리 6종은? [이복진의 술래잡기]](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5/25/2025052550924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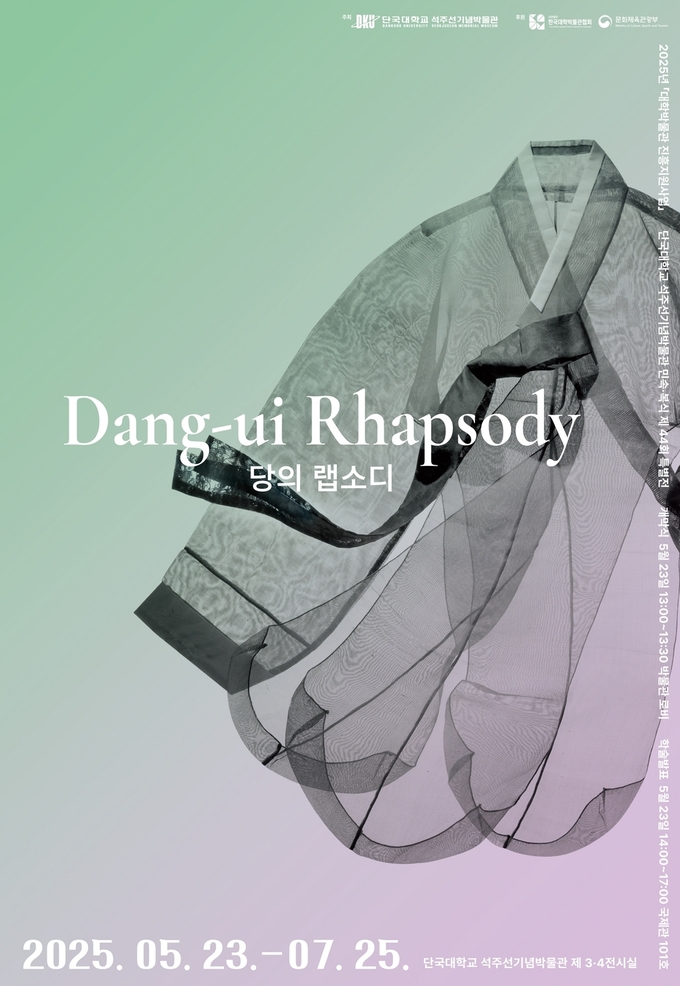
![[NBS 하이라이트] 버섯농장 일상 담아 홍보하는 최지연씨](https://www.nongmin.com/-/raw/srv-nongmin/data2/content/image/2025/05/23/.cache/512/20250523500608.jpg)
![‘300만송이 장미’ 화려함에 황홀… 힐링 안겨준 국내 최초 꽃 축제 [김동환의 김기자와 만납시다]](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5/22/20250522514538.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