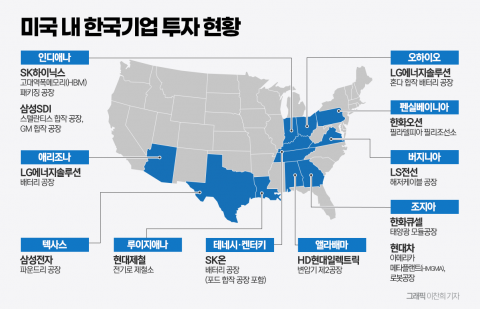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1%대로 추락한 한국의 잠재성장률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를 반전시키는 것을 정부의 최우선 경제 과제로 제시했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 경제의 ‘기초 체력’과 같다. 물가 상승과 같은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 능력으로, 이 수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실력 자체가 약해지고 있다는 위험 신호다. 실제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인구 감소(노동), 투자 부진(자본)과 함께, 이 모든 생산요소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총요소생산성(TFP)의 증가세마저 급격히 둔화하면서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다.
오랫동안 국가별, 기업별 생산성의 격차는 풀기 어려운 퍼즐과 같았다. 비슷한 기술과 자본을 사용하는데도 왜 어떤 기업은 다른 기업보다 월등한 성과를 내는가? 최근의 연구들은 이 퍼즐의 핵심 조각이 바로 ‘경영 방식(Management Practices)’에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경영’이란 단순히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십이 아니다. 성과를 체계적으로 추적하고,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며, 성과에 기초해 보상과 승진이 이뤄지는 합리적인 시스템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는 놀라웠다. 이 경영 점수가 높은 기업일수록 생산성, 수익성, 생존율이 월등했다. 경영 방식의 차이가 국가 간 및 기업 간 생산성 격차의 약 25%에서 3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개발 투자만큼이나 크고, 인적 자본이나 정보기술 투자보다도 더 큰 영향력이다. 심지어 좋은 경영은 인공지능(AI) 투자 같은 다른 투자의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이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이 유럽보다 빠른 생산성 성장을 이룬 것의 절반가량이 바로 이 경영 능력의 차이 때문이었고, 이는 선진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도 실망스러운 결과를 얻는 이유가 결국 경영진의 문제임을 보여준다.
나아가 이 연구들은 경영 실패의 어두운 측면도 명확히 드러냈다. 장남에게 승계된 기업이 경영 방식이 나쁘며, 경영 방식이 나쁜 기업은 팬데믹과 같은 위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며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한국 경제의 가장 아픈 현실과 마주하게 된다. 최근 한 보고서는 지난 30년간 한국의 자원 배분 비효율성이 심각하게 악화됐다고 진단했다. 특히 혁신을 이끌어야 할 고생산성 신생기업들은 자본 부족에 시달리는 반면, 시장에서 퇴출당해야 할 저생산성 한계기업들은 과도한 자원을 차지한 채 연명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결국, 자원이 흘러가야 할 곳으로 가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고여 썩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재벌 총수들은 지난 30년간 계속된 잠재성장률 추락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재계는 늘 그랬듯 기업 발목을 잡는 규제를 탓하지만, 문제의 원인은 외부에만 있지 않다. 바로 성과에 책임지지 않는 총수들의 ‘유체이탈’식 경영 방식이다. 지난 30년간 잠재성장률이 추락하는 동안, 그 책임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재벌 총수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만약 미국이었다면 형편없는 실적을 낸 총수는 주주들의 압박으로 벌써 몇번은 쫓겨났을 일이다.
오히려 한국에서는 위기를 빌미로 전문경영인을 해임하고, 경영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3·4세가 ‘구원투수’인 양 등장하는 구태를 반복한다. 오죽 답답했으면 대표적인 보수 언론마저 최근 ‘불황 속 오너들의 고연봉 잔치’라며 이들의 행태를 비판하고 나섰을까. 경기 침체로 직원들은 희망퇴직으로 내몰리는 와중에 2025년 상반기 한화 김승연, CJ 이재현 회장 등은 여러 계열사에 이름을 올리는 ‘꼼수 겸직’으로 고액 보수를 챙겼다. 이러한 행태는 성과와 보상이 괴리된 나쁜 경영의 전형이다. 결국 이 모든 것이 기업의 생산성과 국가의 잠재성장률을 갉아먹고 있다.
데니스 뮬런버그 전 보잉 최고경영자(CEO)는 재임 기간 중 발생한 두 차례의 737 기종 추락 사고로 346명이 사망한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해임됐다. 사고의 근본 원인이 안전을 경시한 경영 문화와 치명적인 소프트웨어 결함임을 인지하고도 은폐하려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는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 결국 뮬런버그는 이사회에 의해 퇴출당했으며, 이 과정에서 약 800억원에 달하는 퇴직금과 보너스 등 막대한 보상을 포기해야 했다. 이러한 사례로부터 교훈을 얻어, 잠재성장률 하락이라는 위기 앞에서 총수 일가를 보호하는 낡은 방식은 버려야 한다. 오히려 경영 능력이 없는 총수 3·4세는 언제든 자리에서 밀려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 재벌 총수들에게 필요한 것은 ‘벼랑 끝에 몰린 절박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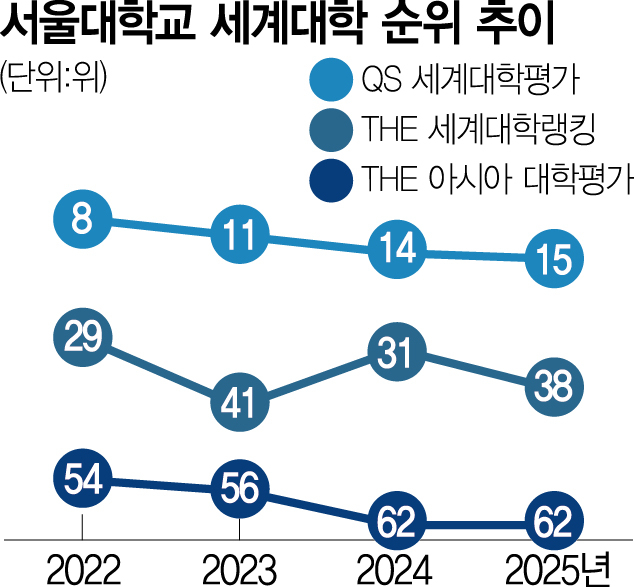


![[속보] 李대통령 “‘부동산 자금 쏠림 방지’ 모험·혁신투자 환경 만들어야”](https://ypzxxdrj8709.edge.naverncp.com/data2/content/image/2025/09/10/.cache/512/2025091058019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