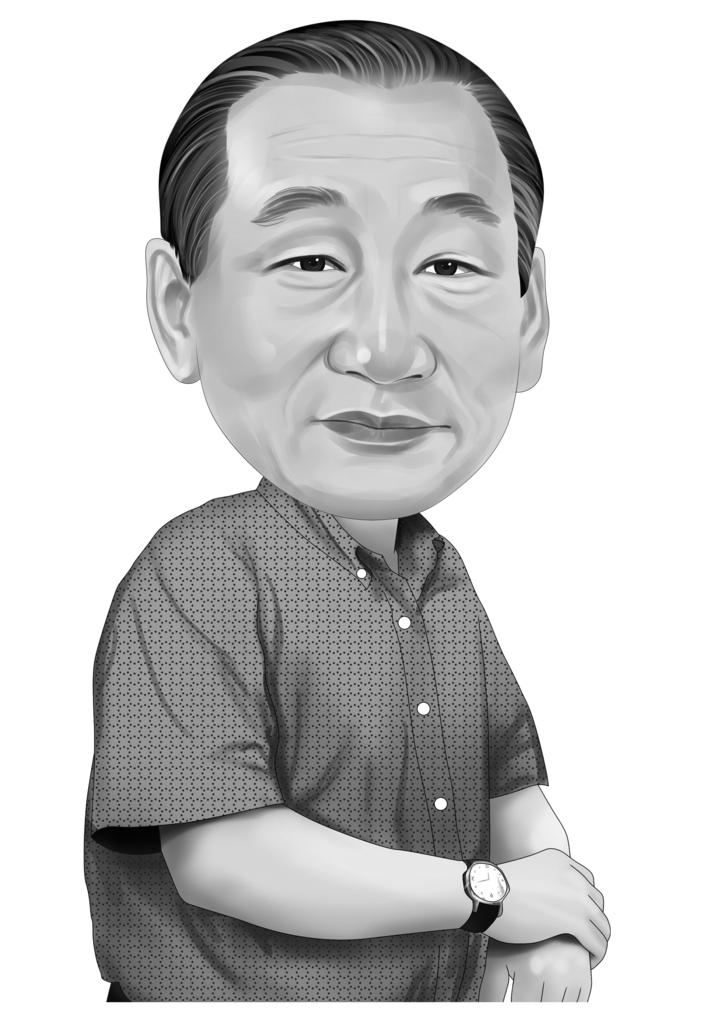
큰딸의 법무팀장 승진기념으로 안식구가 사준 카디건을 그만 손녀에게 빼앗겼다(?)고 한다. 새 것을 사주려고 큰마음 먹고 들린 백화점에서 낯익은 이름을 만났다.
소쉬르(Chaussure), 분명 프랑스어인데 국산 수제구두 가게다. 알파벳은 조금 달라도 기호학의 창시자로서 구조문학 이론을 탄생시킨 스위스 Saussure와 이름이 같다.
유럽 이름은 찰스 칼 카를로스 샤를르가 같고, 피터와 페드로도 한 이름 아닌가?
상품이든 예술작품이든 간에 이름이 같거나 울림이 크면, 그 친숙성(Congeniality)이 사람의 눈길을 끌고 인기를 보장한다. 작가가 글을 쓰거나 회사에서 신상품을 기획할 때 이름 짓기(Naming)에 골몰하는 이유다. 우주선 개발계획에 관심 모으기와 예산확보를 위한, 미 항공우주국의 멋진 이름짓기를 칼럼에 쓴 적이 있다(1995.12).
한 인간을 우주로 보내는 전령(傳令)은 머큐리계획, 두 사람 태우기는 쌍둥이 별자리인 제미니, 달 착륙용 3인승은 세 바퀴 수레를 탔다는 아폴로의 이름을 붙였다.
옷을 사면서 “둘째에게는 수제구두 한 켤레 사줘야지.” 마음먹었다.
치문회(齒文會) 월례모임에서는 서로의 글을 평하고 바루는 시간을 자주 갖는다.
지난 모임에는 갓 다녀온 남아프리카 여행기 ‘잠베지의 해넘이’를 가져갔는데, 그밖에 시와 수필이 각 두 편씩이었다. 비교적 접근이 쉬운 수필은 시나 소설보다 가볍다하여, 중국에서는 Essay를 잡문(雜文)이라고 한다던가? 비하의 뜻은 없다지만 그 수준만큼이나 질 떨어지는 번역이다. 수필이던 만필(隨筆·漫筆)이던 일본 번역이 한 수 위다. 따를 수에 붓 필이니 ‘붓 따라, 붓 가는대로...’ 얼마나 담백하고 멋진가? 우리 한자어 70%가 일본계라니 불행 중 다행이다. 어문각 사전은 수필을, “일정한 형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체험이나 느낀 바를 쓴 글로, 개성과 인간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라고 설명한다. ‘잠베지’는 기행문이니 별 지적사항이 없었고, “아프리카 여행의 로망은 사라져가는 지구의 맨살을 만나고 싶은 마음” 이라는 한 줄이 정재영 시인의 칭찬을 들었다. 기대한 정 시인은 김영임 프로의 시 소개로 대신하여 다소 실망했으나, 시 쓰기의 어려움은 모두가 아니까 해설로 만족, 그냥 넘어갔다. 수필 ‘동숭동 골목길에서 길을 묻다(김계종)’와 ‘골목길 접어들 때면(임용철)’은, 훌륭한 내용과는 별도로 꽤 유의한 일반론적 토론을 이끌어냈다.
시나 단편소설에 비하여 울림이 작은 수필을 보다 돋보여줄, ‘구조 또는 형식은 무엇일까?’에 관한 갑론을박이었다. 그 내용에 필자의 생각을 덧붙여 정리해본다.
첫째, 중언부언(重言復言): 붓에 맡기다보면 동의어반복이 많아질 수 있으니, 퇴고하면서 줄인다. 둘째, 수미상응(首尾相應): 기승전결에는 못 미치더라도, 앞뒤 문장 간에 일관성을 유지한다. 셋째, 수순유수(手順流水): 생각의 흐름에 맞춰 물 흐르듯 문장의 순서를 정리한다. 넷째, 분량조절: 대형사극은 인터미션 포함 4시간도 좋고, 액션 영화는 가끔씩 쉬어가며(Lull) 120분도 좋으나, 아드레날린이 펑펑 솟는 공포 영화가 90분을 넘으면, 관객은 지쳐서 그립(Grip)을 놓친다. 물론 특 A급인 Psycho, Omen이나 Exorcist의 예외도 있지만... 때로는 과감하게 버리고 줄인다. 숏 폼(Short Form)이 대세라고 ‘짧을수록?’, 할지 모르나, 자칫하면 심심풀이 땅콩이 되니까 원고지 12장은 채우자. 다섯째, 유종의 미(有終之美): 바둑 승부도 대부분 끝내기에 좌우된다. 충격적인 액센트는 마무리에 배치하자. 극적인 반전(反轉; Reversal)이라면 금상첨화. Initial로 통일해보면, Concise-Consistent-Current-Condense-Climax쯤 될까?
이날의 백미는 역시 한 수의 시, ‘오만과 편견(남현애)’이었다. 부제(副題)는 ‘요세미티국립공원 숲에서.’ 대자연의 경이 앞에 “한없이 작아지는 나”를 그림처럼 그려냈다. 필자가 30년 전 초행, 두 번을 다녀왔어도, 또다시 가보고 싶은 곳.
굉음과 함께 쏟아지는 3단 폭포와 하프돔, 엘 카피탄 봉우리와 거대한 신의 조각공원, 그리고 산불에 불타서 어지럽게 널브러진 메타세쿼이아 시신(?)의 야적장.
그 앞에 서면 평생을 쌓여왔던 반성과 회한(悔恨)이 더 깨어지는 우울의 쓰나미.
시인은 내가 짊어져 온 후회의 응어리가 바로 ‘오만과 편견’이었음을 깨닫는다.
시의 정의는 “자연과 인생에 대한 감동 따위를 운율적인 언어형식으로 쓴 글”이니, 이 시에 실린 자연과 인생의 격조 높은 대화야말로, 훌륭한 시가 아닐 수 없다.
한 가지 걸리는 건 제목이다. 첫째, 제인 오스틴(1775-1817)의 ‘오만과 편견’은 울림이 큰 러브스토리로서, 시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독자를 그쪽으로 끌어당긴다.
둘째, Pride와 Prejudice는 발음의 첫마디만 닮았을 뿐이지, 등위접속사(coordinate conjunctive)를 전후로, 피차에 만나기 쉬운 추상명사가 아니다. 바로 그런 까닭에, 시인의 절절한 감정이 독자에게 이입되는 과정은, 어쩔 수 없이 상처를 받게 된다.
그렇다고 제인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가해자”라고 부를 수는 없지 않은가?
치문회(齒文會) 월례회의 강평과 바루기 시간에는, 항상 재미와 의미가 함께한다.
세상이 불안하고 살벌할수록 “뭉치면 살고 헤치면 죽는다”는 말이 가슴에 와 닿는다. 뭉침의 첫걸음은 만남이다. 치과계의 모임은 많을수록 좋고, 성원은 클수록 좋다. 어려울 때일수록 자주 만나는 것이 힘이요, 항상 올바른 해법을 불러온다.
==========================================
오만과 편견
먼,/ 아주 먼 과거의 시간 속으로/ 떠나온 곳/ 요세미티 숲/ 그 숲!//
현재의 시점,/ 미래, 그 예측 불허한 시간/ 함께 공존하는/ 의식의 공간//
카메라 렌즈/ 그에 포착되어지는/ 요세미티 숲속 풍경//
# 하늘 향해 곧게 뻗어있는/ 나무들의 울림/ 그 숲사이로 내리쬐는/ 강렬한 햇살//
밑둥잘린 나무/ 그가 두른 수만, 그 몇 겹의/ 나이테//
그사이/ 세콰이어, 나뭇잎의/ 작은 흔들림//
그 숲속, 나무들 사이/ 한없이 작아지는/ 나,/ 주름, 반영되어 숲속에 있어.//
멀고먼 시간속/ 천둥, 번개 맞으며/ 버티고 서있는/ “세콰이어” 나무//
그들, 침묵속 향연//
그앞,/ “오만과 편견” 무너지고/ 피사체로 렌즈에 담기는/ 우리, 아니 나의 모습//
그리고/ 세콰이어 나무들의/ 긴 행렬 -----
부제: 요세미티국립공원 숲에서, 남현애: 치과의사 문인회 회원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ditor's chatter] "무럭무럭 자라는 아깽이들"... 디지털포스트(PC사랑) 2025년 1월호](https://www.ilovepc.co.kr/news/photo/202501/52440_143028_2636.jpg)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하는 어린이시 읽기] 알밤-오유석 송천초 6학년](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1/07/.cache/512/2025010758012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