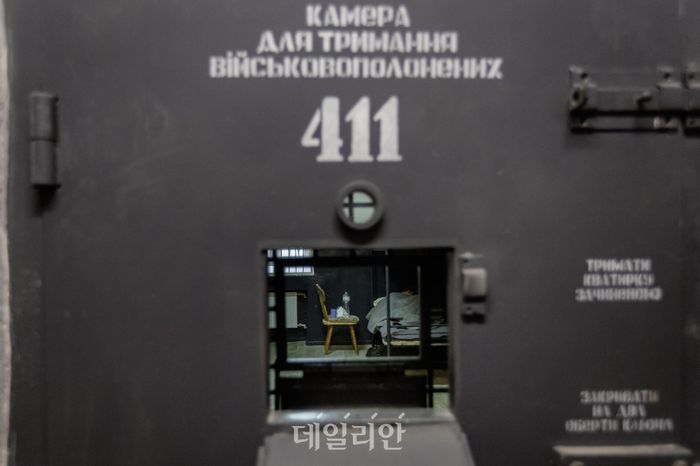법원이 19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의 탈북민 강제북송 관련자들에 대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에 대해 2019년 당시 남북 및 북·미 관계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재판부는 문 정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남 추진을 위해 북송을 결정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현실성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 또한 결과론적 해석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김정은이 왔겠느냐"…검찰 주장 반박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을 2019년 11월 25~26일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부산으로 불러서 남북 관계 개선의 물꼬를 터보기 위해 북송을 결정했다며 정 전 실장 등을 기소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인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던 중 (중략) 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친서를 보내는 기회에 김정은을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초청하기로 했다"며 "(친서를 보낼) 준비 중 북한 주민들 월선이 이뤄져 이들을 나포·송환해 북한과의 화해·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북한을 존중한다는 의지를 보여주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지적했다.
망명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을 북송함으로써 화해 제스쳐를 보여 김정은의 방남을 성사시키려 했다는 취지다. 문 대통령의 친서 발송은 2019년 11월 5일이었다. 해당 탈북민 신병 확보는 11월 2일, 강제북송은 닷새 뒤인 11월 7일 이뤄졌다.
재판부는 이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단 한 번도 남한으로 온 적이 없던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직접 오는 상황이 행사 불과 20일 전인 2019년 11월 5일에 친서 전달로서 일어날 수 있다는 가정 자체가 실무상 실현 가능성이 없다"면서다. 행사 직전에 친서를 보낸다고 해서 김정은이 올 리는 없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2018~2019년 대화 국면에서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비롯한 고위급 혹은 실무급 협상은 하루 만에도 성사되는 등 전격적으로 이뤄지는 게 부지기수였다. 2018년 5월 26일 판문점에서 열린 '깜짝 남북 정상회담'은 당시 미 측의 일방 통보로 북·미 정상회담 파투 위기에 몰렸던 김정은이 전날 오후 문 전 대통령에게 만나자고 SOS 연락을 하면서 곧바로 성사됐다.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미 정상의 회동 또한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비무장지대(DMZ)에서 인사하자며 트윗을 날리면서 이뤄졌다.

김정은 '심기 경호' 안간힘 가능성
이런 남·북·미 대화의 패턴을 경험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선 시일이 촉박해도 조건만 맞으면 김정은을 부산으로 초청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봤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강제북송 직전인 2019년 10월에는 스웨던 스톡홀름에선 북·미 간 실무협상이 진행됐다. 하노이 노 딜 이후 협상의 불씨를 살려보려는 노력이 이어진 셈이다.
이는 김정은의 방남에 대해 애초에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검찰이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와 관련해 제기한 혐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재판부의 판단이 자의적이거나 결과론적 해석에 불과하다는 지적으로 이어진다.
재판부는 또 "국정원 내에서 (한·아세안 정상회의)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도 일관되게 (김정은 초청) 친서 전달 업무를 처리하면서 청와대의 북송 결정 관련 회의 등을 인식·의식하지 못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나 강제북송 결정은 문 정부 최고위급 외교안보 및 정보 라인 인사 소수만이 참여해 이뤄진 고도의 정무적인 판단에 해당한다. 이를 국정원 실무자들이 몰랐다고 해서 '김정은 방남 추진'과 '강제북송 결정'의 연관성이 없다고 보는 건 무리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재판부, 강제북송 '현실 외면' 지적도
재판부는 또 "북송 결정 및 집행이 북한의 입장에서 대한민국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할 신호가 되거나 그러한 상황으로 인식되게 할 사건이 아니다"라고 했다. 북한 주민 둘을 돌려보냈다고 해서 김정은이 이를 긍정적으로 해석했을 가능성이 작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 또한 수십 년째 탈북민 강제북송이 이뤄지는 배경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북한은 모든 탈북민에 대해 "조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가족을 버린 인간쓰레기"라고 칭하며 주민 이탈을 막기 위한 '본보기' 목적으로 이들을 적발해 가혹한 처벌을 해왔다. 북한이 강제북송된 탈북자들을 반역자로 낙인 찍어 고문, 폭행, 강제낙태 등 인권 유린을 일삼는 실상은 이미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2014년)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규명됐다.
대부분의 강제북송은 탈북민들의 주된 루트인 중국에서 이뤄지는데, 이런 대규모 중국발 강제북송에 대해 '중국이 북한에 주는 선물'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이런 배경에서다. 북한은 탈북민의 존재 자체를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김정은이 '대한민국 정부 최초의 강제 북송'을 어떻게 인식했을지까지 재판부가 단정적으로 예단하는 게 적절했느냐는 의문으로 이어진다.
![[뉴스핌 이 시각 PICK] 경찰, 尹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입건 外](https://img.newspim.com/news/2025/02/21/250221145007212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