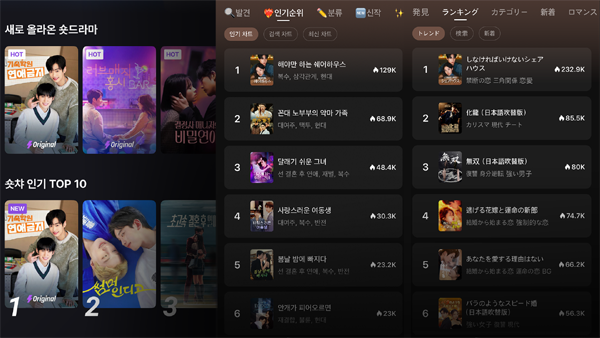[비즈한국] 2013년 1월 22일 구글 최고 책임자 니케시 아로라(Nikesh Arora)는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유튜브 광고만으로 8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벌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수익을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강남 스타일의 댄스, 말춤이었다. 하지만 정작 말춤의 안무가 이주선 씨는 기본 안무비와 싸이가 챙겨준 보너스 외에는 추가 수익이 없었다. 유튜브 조회 1회당 1원씩만 받아도 수백억이 됐을 텐데 말이다. 더군다나 영화,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등등 많은 콘텐츠에서 이 춤을 무료로 사용했다. 유튜브의 조회 수 카운팅 시스템을 완전히 바꾼 ‘강남 스타일’ 뮤직비디오는 2025년 4월 16일 현재 55억 뷰를 기록했다.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을 이끈 강남 스타일보다 훨씬 이전인 1990년대 중후반 시작된 한류 열풍의 원조는 클론이었다. 클론도 안무 저작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 하지만 변화의 조짐은 그들에게서 시작되었다. 2022년 2월 6일 클론의 강원래는 SNS에 K팝 안무 표절에 대해 쓴소리를 적었다. “방송 광고(CF)에 여러 안무가 많이 나오는데 눈에 띄는 안무가 많다”라며 “이제 제 안무 그만 베껴라”라고 했다. “대중은 몰라도 안무가 본인은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 히트한 노래와 불가분인 춤의 저작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2024년 4월에는 KB금융그룹 광고에 배경음악으로 ‘꿍따리 샤바라’가 등장했다. 출연자들은 꿍따리 샤바라 노랫말에 맞춰 춤을 췄다. 이를 본 강원래는 자신이 만든 춤을 대가 없이 사용한 점을 지적했다. 노래는 저작권이 있는데 안무는 저작권이 없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보통 광고에는 노래와 춤이 짝을 이루는 댄스곡을 곧잘 사용하지만, 음원 저작권료만 지급한다. 이후 강원래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소송 없이 국내 최초로 안무 저작권을 인정받고 KB금융그룹에서 저작권료를 받았다. 이제는 강남 스타일의 말춤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도록 선례를 만든 셈이다.
사실 안무 저작권이 강화되는 건 대중음악계가 반가워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같은 음악계라고 해도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쪽은 계산이 다를 수 있다.
지난 3월 26일 한국매니지먼트연합(한매연),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연제협),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음레협),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 등 4개 음악 단체는 안무 저작권에 관한 성명서를 내고 “K팝 안무는 음악과 춤이 상호 필수 불가결하게 결합한 특수한 유형으로서 미국이나 일본 등 유사하게 대중문화예술산업이 발전한 국가의 저작권법에서도 안무에 대한 별도의 수익 배분 청구권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언급했다.
이 성명문의 맥락은 해외 선진국들의 대중문화예술산업계에서는 수익 배분을 하지 않는데 한국에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성명서 내용에 담겼다. “K팝 안무는 음악과 춤이 상호 필수 불가결하게 결합한 특수한 유형”이라는 대목이다. K팝은 댄스음악이고 군무를 기본으로 하기에 춤이 필수요소다. K팝 커버 댄스 대회가 전 세계적으로 열풍인 점을 생각해도 충분히 알 수 있다. 따라서 K팝만큼 안무가 중요한 음악 장르가 없기에 다른 나라에 선례가 없는 것이다.

물론 비슷한 선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세계적인 안무가 카일 하나가미(Kyle Hanagami)와 게임 ‘포트나이트’ 개발사 에픽게임즈(Epic Games)의 안무 저작권 소송이 대표적이다. ‘포트나이트’에는 이모트(emote)가 등장한다. 게임 아바타를 통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데, 아바타를 움직여 댄스 동작 등을 한다. 1심 재판부는 2초간의 춤 동작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했다. 핵심은 “4박자 음악에 맞추어 8개 몸동작을 2초간 조합한 부분”이라고 규정하며 5분가량의 전체 안무는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지만, 2초 정도에 해당하는 안무 부분은 짧은 루틴이고 전체 안무 가운데 일부 요소(small component)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2심은 달랐다. 안무는 여러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개별로 보호되지 않는 요소를 안무가가 ‘선택’하고 ‘배열’했기에 보호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1심 판결은 ‘자세(pose)’를 판단했는데, 2심은 자세 외에도 신체의 위치(body position), 체형(body shape), 신체 동작(body actions), 전환(transition), 공간 활용(use of space), 타이밍, 일시정지(pause), 에너지, 모티브, 대비(contrast), 반복(repetition) 등이 모여 이뤄졌기 때문에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즉 팔다리 동작, 손과 손가락 동작, 머리와 어깨 동작, 템포의 선택과 배열을 창조적으로 했기 때문에 안무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봤다.
더구나 해외에서는 발레와 오페라 같은 공연예술의 안무 저작권을 인정한다. 공연할 때마다 안무가에게 저작권료를 지급한다. 해외 무용수를 초청해 공연할 때도 10분 정도일 경우 회당 약 300~600유로의 대가를 준다. 국제 저작권법에 따르면 안무가는 살아 있는 동안은 물론 사후 70년 동안 저작권이 보호된다. 상업적 목적으로 드라마, 영화, 사진, 비디오 혹은 인터넷 영상에 춤을 넣으면 안무가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고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국공립 단체는 안무자에게 사례비를 지급하는데 국립극단이나 국립무용단, 오페라단 등은 외부에 안무를 의뢰했을 경우 극장에서 3년 동안 저작권을 갖고, 재공연을 할 때는 일정한 저작권료를 안무가에게 지급한다.
미국은 1909년 저작권법에서 안무는 극적 구성(dramatic composition)을 ‘연극저작물’로 보호했지만, 1961년 미국 저작권청은 스토리나 주제와 갖는 연관성과 별개로 추상적인 춤의 저작권을 보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976년 저작권법을 개정하고 안무 저작물(choreographic works)을 규정했다.
우리도 안무 저작권이 보호되어야 한다. 우선 작사, 작곡자와 마찬가지로 안무가에게도 무대 공연 횟수에 따라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한다. 무대 공연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방송사 음악 프로그램의 무대 공연이며, 다른 하나는 월드투어나 콘서트 무대 공연이다. 음악 프로그램의 공연은 방송사에서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는 소속사에서도 반가워해야 할 일이다. 콘서트의 안무 저작권료는 소속사에서 지급해야 하는데, 콘서트 입장료나 현지 대행사의 비용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영화와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에 안무가 삽입되는 경우에도 안무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 역시 소속사에는 긍정적이다. 자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뮤직비디오를 게시했을 때 생기는 수익도 배분해야 한다. 소속사는 난색을 보이겠지만, 안무 저작권의 본질과 맥락상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속사가 안무가에게 저작권 수입을 배분해야 한다. 예컨대 곡 발매 후 6개월이나 1년 정도는 소속사가 안무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모든 노래가 다 성공할 수는 없으니 소속사가 어느 정도 위험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영화계의 러닝 개런티와 비슷하게 일정 수익을 넘어서면 추가로 수익을 지급하는 러닝 로열티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물론 상업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팬들의 커버 댄스는 허용해야 할 것이며, 공교육 기관의 교육 등 공적 목적의 사용도 예외로 해야 한다. 사실 강원래는 저작권료를 자기 수익으로 챙기려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KB금융에서 받은 안무 저작권료 전액을 2024년 11월 한국실용무용학회 발전기금으로 기부했다.
마지막으로 안무 저작권 보장은 K팝 산업 전체를 위해 필요하다. 팬들이 원하는 춤의 수준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고,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발전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과거처럼 누군가의 희생이나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기획 매니지먼트는 한계에 이른 현실을 생각해야 한다.
필자 김헌식은 20대부터 문화 속에 세상을 좀 더 낫게 만드는 길이 있다는 기대감으로 특히 대중 문화 현상의 숲을 거닐거나 헤쳐왔다.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터가 활약하는 21세기에도 여전히 같은 믿음으로 한길을 가고 있다.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
writer@bizhankook.com
[핫클릭]
· [K컬처 리포트] 키스 오브 라이프 '흑인 흉내'가 문제 되는 이유
· [K컬처 리포트] '아티스트 인권 보호 센터' 설립을 제안하며
· [K컬처 리포트] 지드래곤, K팝 아티스트의 정체성이자 미래인 이유
· [K컬처 리포트] 아이유와 지수, 연기돌 넘어 '하이브리드 아티스트'로
· [K컬처 리포트] 청춘스타를 지켜줄 '사회적 자본'이 필요하다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