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 자재·표준위원회에서는 국제표준화기구 치과기술위원회(ISO/TC 106)에서 심의가 끝나 최근 발행된 치과 표준을 소개하는 기획연재를 2014년 2월부터 매달 게재하고 있습니다. 환자 진료와 치과산업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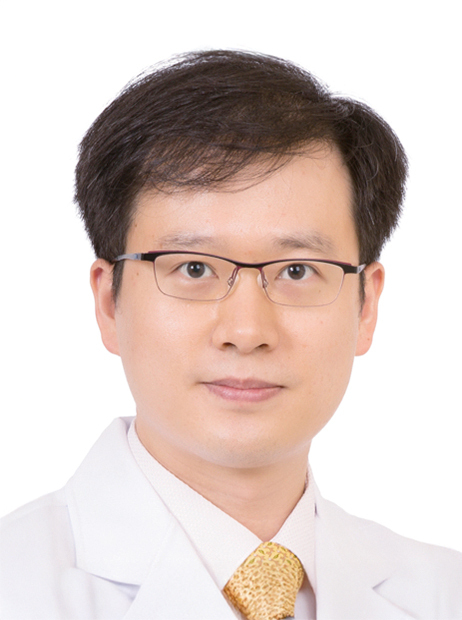
회의장이 열리기 전, 로비를 가득 채운 다양한 언어의 인사말 속에서 먼저 뛰기 시작한 것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었다. 장비와 소재, 소프트웨어의 성능을 한 뼘 더 밀어 환자에게 돌아갈 이익을 키우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레 집중을 불러왔다. 서울에서 만난 세계의 동료들은 각자 다른 배경을 지녔지만, 더 나은 진단과 치료라는 목표 앞에서는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총회는 표준의 초안을 다듬는 자리이자, 임상 현실을 더 정밀한 언어로 옮겨 적는 과정이었다.
개인적으로 서울은 오래 묵은 아쉬움을 덜어 준 장소였다. 2013년 인천 송도에서 총회가 열렸을 무렵, 나는 구강스캐너 성능평가 국책과제와 협회 단체표준 작업을 하며 표준의 문턱을 두드리던 초보자였다. 그러나 정작 회의장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2017년 홍콩에서 처음 총회에 참여한 뒤 국제표준의 매력에 빠져 매년 발걸음을 이어왔고, 이번 서울총회는 그 초심을 다시 꺼내어 임상과 데이터를 문장으로 잇는 나의 역할을 재확인한 시간이었다.
회의실에서는 데이터가, 회의실 밖에서는 사람이 표준을 만든다
내가 프로젝트 리더로서 활동하고 있는 SC 9(캐드캠 장비 소위원회)/WG 3(스캔장비 작업반), WG 7(3D프린팅 작업반)의 논의는 매일의 진료 장면을 책상 위로 올려놓는 일이었다. 먼저 스캔 장비의 정확성은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니다. 금속 반사 때문에 흔들리던 마진, 치은 속으로 사라지는 변연, 장비·소프트웨어 버전이 바뀔 때마다 생기는 미세한 결과 차이를 어떻게 다룰지까지 함께 적어 주어야 임상에서 그대로 쓸 수 있다. 밀링/3D 프린팅의 가공성 역시 장비와 소재의 조화가 핵심이다. 버 직경과 최소 두께, 공구 진입과 흔들림, 적층 두께·방향, 후경화·소결 수축 보정 등을 ‘장비-소재 최적화’라는 한 표준 틀에서 시험소간시험(ILT)으로 데이터를 축적했고, 표준 문서에는 허용 범위와 기준선(cut line)을 반영해 넣었다. 소프트웨어 간 파일 교환은 어떤 회사의 CAD를 쓰더라도 파일을 열고 각 시스템의 장점을 선택해 쓸 수 있도록, 좌표계·단위·처리 이력 등 기본 메타데이터를 공통 규격으로 표준화하는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다.
회의실 문이 닫히면, 복도와 커피 테이블이 또 다른 논의의 장이 된다. 같은 그래프를 보고도 서로 다른 해석이 나오는 지점에서, 우리는 데이터의 의미를 사람의 언어로 번역한다. 제조사의 개발자, 임상가, 심사자, 연구자가 서로의 문법을 배우는 과정은 느리지만, 바로 그 느림 덕분에 문장 하나가 단단해진다. 갈라 디너에서 함께 웃고, 다음 날 아침 같은 문장을 다시 읽을 때 전날의 표정이 떠오른다. 표준은 텍스트이지만, 그 텍스트를 설득력 있게 만드는 것은 결국 신뢰라는 것을, 서울의 밤이 조용히 가르쳐 주었다.
서울 총회의 얼굴: 프로그램과 ‘K-컬처’가 만든 온도
이번 총회는 포멀한 진행과 따뜻한 환대가 균형을 이뤘다. 공식 일정은 컨비너 교육과 WG(작업반) 집중 토의, SC(소위원회), TC(전체 기술위원회) 본회의로 이어졌고, 공식 세션 사이 잠깐의 쉬는 시간마다 로비의 테이블이 금세 협의 자리로 바뀌었다. 제조, 임상, 심사 등 각 분야 사람들이 그래프와 표를 함께 보며 용어를 맞추고 해석의 차이를 좁혔고, 합의는 큰 선언이 아니라 문장을 한두 단어 줄이고 정의를 분명히 하는 작은 수정에서 시작되었다. 그렇게 다듬어진 초안은 표현이 더 간결해지고, 표와 도표는 임상 현장에서 바로 이해될 만큼 또렷해졌다.
갈라 디너는 그 합의를 지탱하는 온기를 더했다. 연세대 치과대학 댄스팀의 ‘오징어 게임’ 테마 무대가 분위기를 열었고, 달고나 뽑기 시합과 로제의 ‘APT’ 춤 따라 하기가 자연스레 이어졌다. 세계 각지에서 온 전문가들이 팀을 이뤄 웃고 몸을 움직였다. 최신 한국 문화의 대중성이 학술회의의 어색함을 녹였고, 다음 날 같은 문장을 다시 읽을 때 전날의 표정이 떠올랐다. 표준은 텍스트이지만, 그 텍스트를 설득력 있게 만드는 것은 결국 신뢰라는 사실을, 서울의 밤이 조용히 가르쳐 주었다.

다른 SC에서 본 흐름, 그리고 다음 회의까지의 숙제
디지털을 넘어 전 영역에서도 흐름은 분명했다. SC 1(충전 및 수복 재료)은 배지명 교수님이 진행한 FDIS 6876(근관 실러 개정)과 차정열 교수님의 NP 24277(클리어 얼라이너 소재)을 통해 시험 항목과 보고 형식을 임상 의사결정에 더 가깝게 맞추었다. SC 2(보철 재료)에서는 김광만 명예교수님과 이상배 교수님이 각각 CD TS 24275(투명도·불투명도), PWI 22674(치과용 금속재료)로 재현 가능한 계측 기준과 비교 틀을 제시했다. SC 4(치과용 기구)는 권재성 교수님의 FDIS 15087(엘리베이터), NP 4865-1(핸드 인스트루먼트), 박창주 교수님의 NP 14457(핸드피스 역류방지), 이혜인 연구원님의 DIS 3630-8(전자 근관장 정확도), 이민용 연구원님의 ISO 19490(상악동 거상 기구)·NP 21850-3(티타늄), 김경남 교수님의 ISO 21850-2(폴리머)로 안전·성능 요구사항을 최신화했다. SC 6(치과용 장비)에서는 장현양 대표님의 CD 23402-2(포터블 유닛)을 통해 실제 사용 환경을 반영했고, SC 8(임플란트)에서는 김광만 명예교수님의 CD 3843(부착장치 장착·제거력)이 임상 적용성 높은 측정 기준을 제시했다. SC 9(CAD/CAM)은 오승한 교수님의 ISO 18618(소프트웨어 호환성), 제가 리딩한 ISO 20896-1 리비젼·WG 7 2차 ILT, 김훈 박사님의 AM ILT를 축으로 스캔 정확성, 교환 메타데이터, 장비-소재 최적화 기반 가공성 지표를 한 흐름으로 엮었다. TC 106/WG 12는 권재성 교수님의 AWI 8172(임플란트 수술 가이드용 폴리머)로 임상 적용 기준 마련을 추진했다.

돌아보면, 나는 표준의 문을 두드리던 초보자에서 그 문 안에서 책임을 나누는 사람으로 자리를 옮겨 왔다. 그 변화는 거창한 일이 아니라, 매년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로 돌아오는 꾸준함에서 비롯되었다. 환자에게 더 나은 진료를 제공하려는 임상가의 욕심, 데이터를 더 정직하게 만들려는 연구자의 고집, 서로의 언어를 배우려는 동료들의 배려가 쌓여 표준이 된다. 다음 총회에서도 나는 그 꾸준함을 계속할 것이다. 더 나은 문장 하나가 결국 더 나은 치료 하나로 이어진다는 믿음을 서울에서 다시 확인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