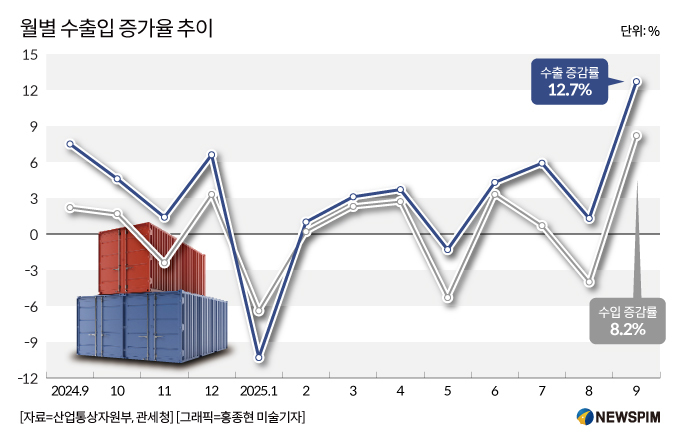2021년 10월, 중국이 요소 수출을 틀어막자 대한민국 화물차가 멈춰섰다. 이른바 ‘요소수 대란’이 벌어진 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중국산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선 다변화에 힘쓴 덕분에 지난해 20%대까지 떨어졌지만, 올해 도로 60%대로 치솟았다.
21일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에 따르면 올 1~9월 산업·차량용 요소는 총 25만2102톤(t) 수입됐다. 수입국별 비중을 따지면 중국산이 62.4%(15만7221t)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2.4% 급증한 수치다. 뒤이어 베트남(26.6%·6만6994t), 일본(5.8%·1만4542t), 카타르(3%·7500t) 순이었다. 요소는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줄여주는 요소수의 원재료다. 대형 공장과 발전소의 매연 저감 장치에도 쓰인다.

그동안 값이 싸고 물류비가 적게 드는 중국산 요소가 전체 수입의 80~90%를 차지해왔다. 하지만 2021년에 이어 2023년 말에도 중국이 요소 수출을 일부 제한하면서 한국 정부는 수입선 다변화를 추진했고, 지난해엔 베트남산 비중(53.1%)이 중국산(27.1%)을 크게 눌렀다. 당시 정부는 베트남·일본 등 중국 이외 국가에서 요소 수입을 위한 장기 계약을 체결하면 단가 차액의 50%를 보조해주는 지원책을 실시했다. 중국산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업체들도 베트남·일본산으로 눈을 돌렸다.
그러나 올해 들어 중국산 비중이 다시 급등했다. 특히 9월 한 달만 놓고 보면 중국산 비중은 95.1%로, 사실상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했다. 일본산은 4.7%, 베트남산은 0.1%에 그쳤다.
업계에선 수입선이 막히지만 않는다면 가격 경쟁력을 고려해 중국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실제 중량 대비 단가를 단순 산식으로 계산했을 때 중국산은 t당 400달러 수준이지만, 카타르산은 440달러, 베트남산은 455달러, 일본산은 496달러로 큰 차이가 났다. 중국산과 일본산만 놓고 비교하면 중국산이 t당 96달러 저렴한데, 지난해 수입량(약 35만t) 기준으론 연 3000만 달러(약 430억원) 이상의 비용 차이가 발생한다. 업계 관계자는 “범용 제품인 요소 특성상 국가별로 품질 차이가 거의 없다 보니 조금이라도 값싼 제품을 찾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 3월 공급망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차액 보전 비율을 기존 5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하고, 공공 비축도 기존 50일분에서 70일분으로 늘리는 등 지원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입처도 베트남·일본뿐만 아니라 중동·유럽까지 다변화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업계 대상으로 지원 사업 설명회를 여는 등 수입선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보다 적극적인 유인책이 없다면 시장 논리에 밀려 장기적인 다변화를 이루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중국이 목줄을 쥐고 있는 상황에선 언제든 ‘제2의 요소수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며 “수입선 다변화에 따른 보조금 지원 규모를 더욱 확대하고, 국가전략물자로 지정해 긴급 상황에선 국내에서 일부라도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