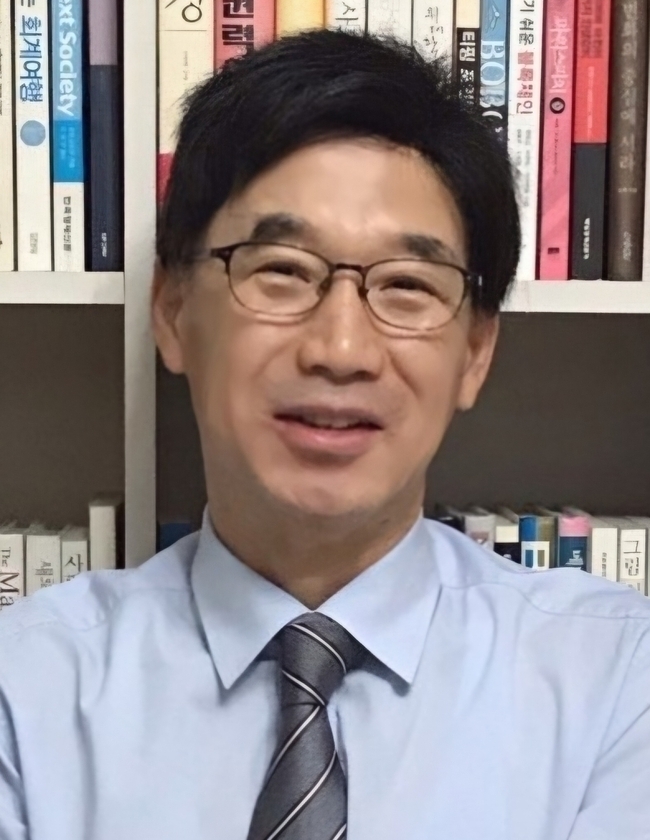엄마가 요양병원 다인실에 입원한 지 1년이 넘었다. 넘어져 고관절을 다친 이후 엄마는 일어나지 못했다. 엄마와 요양보호사의 첫 만남은 줄다리기하듯 팽팽했다. 병실은 엄마의 쩌렁쩌렁한 경상도 사투리로 한동안 시끄러웠다. 엄마는 다른 환자들보다 더 빨리 더 나은 대우를 요구했다. 덩달아 내 전화기도 불이 나서 하루에도 여러 번 나는 요양보호사와 통화해야 했다. 경력 10년이 넘은 노련한 그녀에게 엄마의 특별 대우는 가당치 않았다. 보통의 환자들처럼 체념에 이르는 수용 단계에 불과했다. 딸에게 하듯 그녀를 대했다가 곤욕을 몇 번 치른 후 엄마는 작전을 바꾸었다.
아들만 챙기고 딸에게는 냉정
엄마에 대한 애증 떨치는 길은
모성 발휘해 엄마를 돌보는 것

병실도 하나의 세계여서 헤게모니 쟁탈전이 난무했다. 자식이 얼마나 자주 찾아오는지, 병실에 음식 나눔은 풍요로운지, 또 간병인의 노고를 얼마나 알아주는지도 관건이었다. 나는 엄마가 다른 노인들의 박탈감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불평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기류가 달라졌다. 엄마와 요양보호사의 관계가 끈끈해졌다. 충격을 받은 건 나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엄마의 목소리였다. 부드럽고 따뜻했으며 때로 어리광이 섞여 있었다.
이제 엄마의 권력은 아들에게서 요양보호사로 넘어간 것 같았다. 일제 강점기에 태어난 엄마에게 아들은 권력이었다. 여자면서 여자인 딸에게 냉정해서 내게 엄마는 오래된 분노이자 슬픔이었다. 엄마는 당신의 인생을 전적으로 조선족 출신인 그녀에게 의존하고 있었다. 몸은 쇠락했어도 엄마는 권력의 중심이 어디인지 본능적으로 깨달은 듯했다. 전화로 갑자기 치킨 몇 마리 주문이 들어오면 나는 엄마가 권력을 관리한다고 생각했다. 누워 움직이지 못하는 노인의 생존 전략이었다. 자식이 노모에게 신뢰와 유대감을 주지 못한다는 것은 서글펐다.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노인에게 곁에 있는 사람이 곧 신이었다. 바쁜 나도 요양보호사를 의지하며 그녀의 눈치를 살폈다. 여자인 내가 일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여자의 도움이 절실했다.
엄마가 점점 잠 속으로 미끄러지는 시간이 많아졌다. 요양보호사는 빠른 손으로 엄마의 속옷을 갈아입혔고 잠이 들면 주변을 정리했다. 나는 로비에 앉아 글을 쓰거나 창밖의 무성한 나뭇잎을 바라보거나 했다. 내가 병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깨어나면 나를 찾을 것이었다. 엄마가 부를 이름은 이제 나밖에 없었다. 여자 노인들만 누워있는 병실에서 나는 옆 침대의 딸과 몇 번 마주쳤다. 면회하는 이들을 자주 못 본 것은 내가 주로 평일에 왔기 때문일지도 몰랐다. 다른 노인의 딸과 나는 창밖을 보면서 일회용 커피를 마셨다.
그녀도 나도 잉여 인간이었다. 그녀는 구로공단 출신이었고 평생 일했으나 여전히 가난했다. 오빠들은 대학을 나왔지만, 며느리들이 시모를 돌보지 않는다고 했다.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농담을 던졌다. 그 며느리도 딸이라서 우리처럼 자기 엄마를 돌보느라 시간이 없을 거라고 했다. 우리는 여자면서 여자를 적으로 돌리고 있었다. 우리들의 엄마는 지아비에게 양처였지만 딸에게 현모는 아니었다. 모든 엄마가 타고난 모성으로 희생과 봉사를 했던 건 아니었다.
세상의 엄마가 다 같지 않듯 세상의 딸도 저마다 달랐다. 내가 아는 시인의 엄마는 젊은 날 그녀와 어린 동생들을 남겨두고 가출했다. 몇십 년 후 가장 노릇을 하느라 늙어버린 그녀에게 더 늙고 병든 엄마가 찾아왔다. 나는 그녀가 노모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으로, 산속으로 다니는 걸 이해하지 못했다. 권리는 없고 의무만 남은 효도를 경멸하면서도 시인을 이해하려 애썼다. 아마 연민이었을 것이다. 그러다 문득 나는 그녀가 스스로 어머니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애증을 뛰어넘는 방법은 딸이 아닌 어머니가 되는 일이다. 우리는 같은 세대였다. 시인의 출판기념회에 건강이 호전된 노모가 참석했다. 노모는 진짜 시인의 딸이 되어있었다. 그래도 어릴 때 버린 아들 앞에 연신 떡과 음식을 밀어놓았다. 나는 예세닌의 시 ‘어머니의 편지’를 떠올렸다.
“네가 시인이라는 거,/ 좋지 않은 평판만 듣고 있다는 거,/ 난 정말이지 못마땅하다/ (중략) / 네가 집에만 있었더라면,/ 지금쯤 우리에게 모든 게 있을 텐데/ 네 머리로 동네 읍장인들 안 됐겠느냐/ 그랬더라면 더 당당하게 살았을 텐데,/ 아무한테도 끌려다니지 않고,/ 너 역시나/ 필요 없는 고생은 안 했을 텐데/ 네 처한테는/ 실 잣는 일이나 시키고/ 너는 아들답게/ 우리의 노년을 돌보지 않았겠느냐?”
엄마는 잠결에 아들의 이름을 부르지만 이제 노년을 돌봐 줄 아들은 세상에 없다. 믿기지 않지만, 나도 요양병원에서 엄마처럼 노후를 보내리라 믿는다. 세상의 모든 딸이 서로 엄마가 되는 곳에서 나도 권력을 잡아보련다.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가끔 간병인에게 슬쩍 용돈을 쥐여줄 수 있으면 된다. 나의 병실에 침대는 햇빛이 잘 드는 창가였으면 좋겠다.
김미옥 작가·문예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