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농을 육성하려면 적극적인 재정 지원과 함께 금융 상담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독립 자영농 외에 다양한 형태의 농업경영체로 활동하는 이들을 청년농 정책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뒤따랐다.
GS&J 인스티튜트는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관련 중장기 정책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5년 이내 청년농 육성 정책 수혜자 363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이에 따르면 청년들이 영농 준비단계에서 겪는 가장 큰 걸림돌은 자금 확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8.3%(중복 응답)가 시설 등 투자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웠다고 답했다. 특히 기반이 부족한 비승계농이 자금 마련에 더 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런 애로를 덜어주고자 후계농육성자금·영농정착지원금 등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대출·보증 한도가 낮아 청년농이 충분한 자금을 융통하기 쉽지 않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특히 담보 제공 능력이 부족하고 신용도가 낮은 신규 청년농·비승계농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여러 금융정책과 시행 기관마다 절차가 다르고 복잡한 탓에 청년들이 자금 지원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황의식 GS&J 인스티튜트 농정혁신연구원장은 “후계농육성자금 대상자를 선발할 때는 담보 능력보다는 사업성 또는 영농 준비성 등 장래를 보고 평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덧붙여 “정책자금 지원 대상자가 된 이후 금융 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다”며 “통합적으로 컨설팅해줄 수 있는 창구 등 전담기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청년농 정책이 다양한 형태의 경영체를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현행 정책은 전업의 가족농 육성을 주요 방향으로 잡고 독립된 농업경영체를 주요 대상자로 삼고 있다. 농업법인 조합원 등은 정책 대상자에서 제외된 셈이다. 실태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9.1%가 단독 자영농으로 조사됐는데, 보고서는 “실제로는 조부모·부모와 공동 영농을 하더라도 정책 수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독립 경영체를 소유하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지유리 기자 yuriji@nongmi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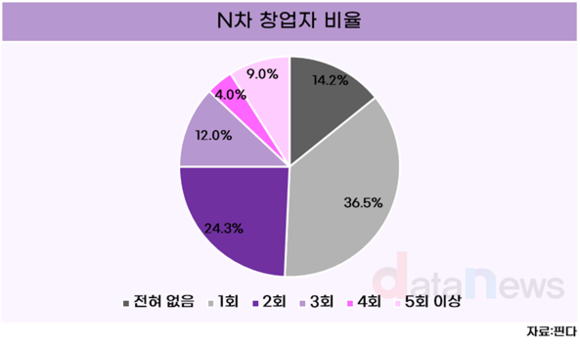
![[선택 2025] 이재명 10대 공약, 재원 추계 물어보니…민주 "집권하면 구체적 발표"](https://img.newspim.com/news/2025/05/12/250512124551604_w.jpg)

![[에듀플러스]10주년 맞은 SW중심대학 사업,“전교생 AI·SW 교육 예산 부족으로 어려워…구조적 변화 필요해”](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5/09/news-p.v1.20250509.61302d87e7994bcaa1a8a5417d0f6d27_P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