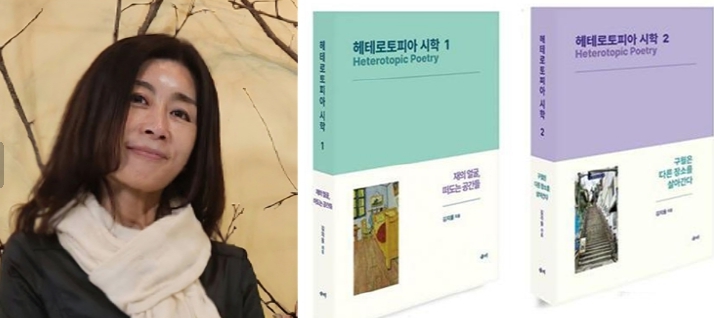에르메스의 많은 공방 중에서도 파리 외곽 팡탱(Pantin)에 자리한 ‘쁘띠 아쉬(petit h)’의 공방은 유독 특별한 에너지를 품고 있다. 정해진 설계도, 완성된 목표도 없다. 장인과 아티스트가 모여 에르메스 각 메티에(métier·제품군)에서 사용되지 않은 최고 품질의 가죽·실크·금속·포슬린·유리·크리스털 등 소재를 다시 꺼내 들고, 그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한다.
에르메스의 ‘쁘띠 아쉬 서울 스톱오버’ 만든
고드프루아 드 비리유 디렉터와 류성희 감독 인터뷰

“재료는 단순한 소재가 아니라, 창작의 출발점입니다.” 지난 10월 1일 화상을 통해 만난 쁘띠 아쉬의 고드프루아 드 비리유(Godefroy de Virieu)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는 이렇게 설명했다.
“장인이란, 미처 쓰이지 못한 한 조각까지 존중하며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에르메스가 말하는 진정한 장인정신이자, 쁘띠 아쉬의 철학이지요.”
2010년, 에르메스 6대손 파스칼 뮈사르(Pascale Mussard)의 발상으로 탄생한 쁘띠 아쉬는 브랜드의 16번째 메티에로 자리 잡았다. 이곳의 작업 방식은 기존 디자인 공정을 완전히 뒤집는다. 아이디어가 먼저가 아니라, 소재가 먼저 말을 건다. 이러한 ‘Creation In Reverse(창조의 역순)’ 방식은 장인의 직관과 손의 기억으로 완성되며, 그 결과물은 늘 예측 불가능하다. 그래서 쁘띠 아쉬에서 탄생하는 오브제는 하나같이 단 하나뿐인 작품이 된다.

쁘띠 아쉬는 단순히 사용하지 않는 재료를 활용하는 차원을 넘어, 지속 가능성을 예술로 전환하는 시스템이기도 하다. 에르메스가 오랜 세월 이어온 장인정신에 ‘창조적 재탄생’이라는 의미를 더함으로써, 럭셔리의 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하나의 언어로 묶은 결과다. 드 비리유는 “쁘띠 아쉬는 장인과 아티스트가 만나는 교차로입니다. 쓰이지 못했던 재료가 창작의 기회로 바뀌고, 그 안에서 지속 가능성이 아름다움으로 전환됩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프랑스 국립산업디자인학교(ENSCI)를 졸업한 산업 디자이너로, 자연과 재료에 대한 감각적 통찰을 바탕으로 실용적이면서도 시(詩)적인 오브제를 만들어온 인물이다.

일상의 기억이 예술이 되는 공간
그 쁘띠 아쉬가 서울에 도착했다.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9일까지 에르메스 메종 도산에서 열린 ‘쁘띠 아쉬 서울 스톱오버(Petit h Seoul Stopover)’ 행사는 쁘띠 아쉬의 철학을 한국적 감수성으로 재해석한 공간이다. 현장 연출을 맡은 이는 영화 기생충·올드보이, 드라마 '폭삭 삭았수다' 등의 미술감독으로 잘 알려진 류성희 감독. 그는 10월 1일에 함께 진행한 화상 인터뷰에서 “서울의 전통적 형상보다는, 서울에서 살아온 세대들의 ‘손의 기억’에 초점을 맞추고 싶었다”고 기획 의도를 전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이라는 도시의 기억, 손의 기억, 그리고 에르메스의 손길이 한데 섞여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사람들은 단순히 오브제를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의 공기와 냄새, 질감, 그리고 ‘손의 온도’를 상상할 수 있다.
그가 만들어낸 공간은 ‘3대가 함께 살던 집’의 기억에 뿌리를 둔다. 관객은 쁘띠 아쉬의 공간에 들어서면 마치 낯익은 집으로 들어가는 듯한 착각에 빠진다. 1층 쇼윈도 공간은 부엌, 할머니의 방, 세탁실로 구성된다. 부엌에서는 어머니가 담금주를 담그는 모습이, 소파 위에 뜨개질 도구와 담요가 놓인 할머니 방에선 온기가 느껴진다. 다림질이나 빨래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세탁실 공간에는 다양한 실크 의상들이 놓여있다.
류 감독은 "우리의 일상적 손 작업과 에르메스의 장인정신은 닮아 있습니다"라며 "일상의 노동이 예술이 되고, 예술이 다시 생활로 돌아오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공간 곳곳에 ‘의도적 부조화’를 심었다. 디렉터 체어 옆엔 항아리가 놓여 있고, 콘크리트 질감의 공간에는 가죽으로 만든 오브제가 놓여 있다.
“논리적 시선으로 보면 어색할 수 있지만, 그 어색함이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어울리면서도 어울리지 않는 경계의 미학, 그것이 쁘띠 아쉬의 매력이에요.”
3층 공간은 더 실험적이다.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지하실 모티프의 공간 속에서 다양한 오브제가 각기 다른 표정을 드러낸다. 류 감독은 “럭셔리 하우스의 공간에 지하실을 만든다는 게 낯설지만, 바로 그 낯섦이 쁘띠 아쉬의 태도와 닮았어요. 완벽한 조화보다 생소한 충돌이 더 큰 울림을 준다고 생각했죠”라고 말했다.




서울에서 피어난 창조적 지속 가능성
이번 서울 행의 중심에는 한국 문화로부터 영감을 얻은 대표적인 세 가지 오브제가 있다. 한국 전통 조각보 기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조각보 선반, 제주 해녀의 지혜를 형상화한 레더 마케트리 버킷, 그리고 테라코타 위에 실크와 가죽을 입힌 패치워크 항아리다.
프랑스·미국 출신의 듀오인 스튜디오 부분(Studio Booboon)과 공방 장인 셀리아(Célia)가 협업한 조각보 선반은 가죽·면·금속이 어우러져 완성됐다. 가죽으로 만든 수납용 버킷은 해녀가 바다 속으로 뛰어드는 모습이 새겨졌으며, 항아리는 한국인의 생활 속 ‘용기(容器)’ 개념을 예술로 확장했다.
이번 서울 프로젝트는 에르메스가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예술의 새로운 언어로 읽힌다. 사용되지 않았던 것들이 생명을 얻고, 손의 노동이 예술이 되며, 장인정신이 삶과 만나는 지점. 그것이 바로 쁘띠아쉬가 전하고자 한 메시지이자, 에르메스가 오늘의 서울에 던지는 조용한 선언이다.
드 비리유는 이번 서울 프로젝트를 “에르메스의 비밀 정원을 한국 관객에게 여는 순간”이라며 “쁘띠 아쉬의 철학은 환경과 재료, 그리고 장인정신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버려질 수 있는 것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능력, 그것이 우리가 세상과 나누고 싶은 가치이고 이것을 서울에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그에 더해 류 감독은 “에르메스를 단순한 명품이 아니라, 이야기와 기억을 담은 오브제로 바라보길 바랐습니다. 일상의 장면 속에 에르메스가 존재하는 순간, 그 브랜드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라고 덧붙였다.




![전례 없이 부드러운 가죽으로 옷과 신발을 짓는 토즈의 저력 [더 하이엔드]](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3/ea6134f6-5aa9-4e87-99e0-4ba85404b07f.jpg)
![[한 컷 미술관] 김근미 개인전: 사과드립니다](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10/22/.cache/512/20251022580143.jpg)
![루이 비통, 100년 넘은 패턴으로 금빛 주얼리 빚어내다 [더 하이엔드]](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3/fbf0461b-8f63-4d30-95f0-0c8c4ef4ecc1.jpg)
![혁신의 대명사가 만들면 원과 사각 시계도 다르다... 리차드 밀의 데일리 워치 [더 하이엔드]](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3/8e864e73-cecc-4827-ab88-317ea605654b.jpg)
![반클리프 아펠, 춤으로 가득 찬 서울의 가을을 만들다 [더 하이엔드]](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3/a2957184-d346-442d-9393-28f969ada30d.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