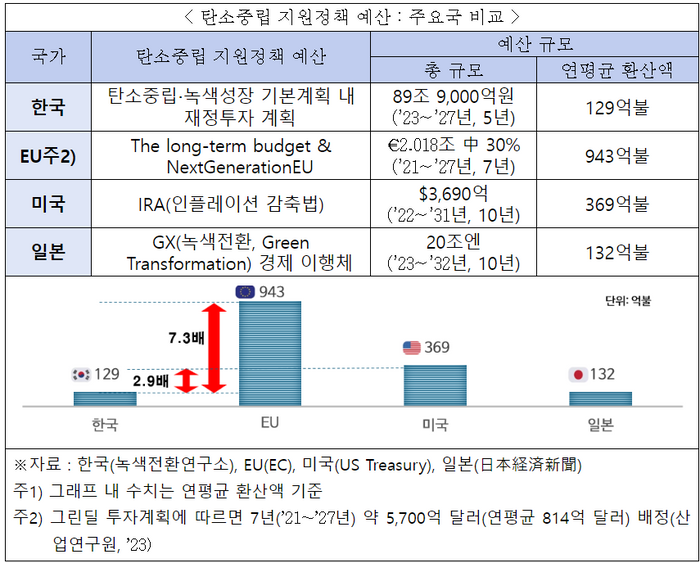쇳물은 멈추지 않는다
내다 팔 자원이라야 ‘오징어’밖에 없던 나라…

포스코 정문에 붙어 있는 슬로건이다. 이 슬로건은 디자인은 몇 번 바뀌었지만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포철 건립 당시 한국은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자원 빈국이었다. 팔아먹을 자원이래야 텅스텐이나 오징어밖에 없었다. 당연히 제철 원료도 부족했다. 1971년 국내의 철광석은 포철에 쓰일 물량의 20%에 불과했고, 코크스용 무연탄은 전량 수입해야 했다.
포철은 먼저 호주에 관심을 기울였다. 나는 일본 미쓰비시상사의 한국지점장 미야모토에게 의견을 구했다.
“광산업자들은 잘못될 경우부터 먼저 따집니다. 무연탄이나 철광석은 미리 채굴해 두어야 하니까요. 한국처럼 준(準)전시상태에 있는 국가의 신용장을 받아줄지 의문입니다.”
미야모토는 아마 나의 자존심을 헤아려 ‘빈곤한 국가’ 대신 ‘준전시 국가’라고 표현했을 것이다. 그는 위탁수수료를 내면 미쓰비시상사가 괜찮은 조건으로 위탁판매를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나는 웃으면서 거절했으나 새삼 우리 처지가 서글펐다. 물론 미야모토의 의견이 틀린 것은 아니었다. 포철 외국계약팀이 호주와 접촉한 결과가 그것을 증명했다. “귀사가 제철소를 성공적으로 건설할지 누가 보장하느냐? 미리 투자했다가 잘못 되면 누가 책임지느냐?”라는 핀잔만 들은 것이다.
나는 어금니를 깨물었다. 어떻게 해서든 일본 제철소와 같은 조건으로 원료를 구매해야 했다. 원료값을 더 물면 그만큼 포철 경쟁력이 약해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