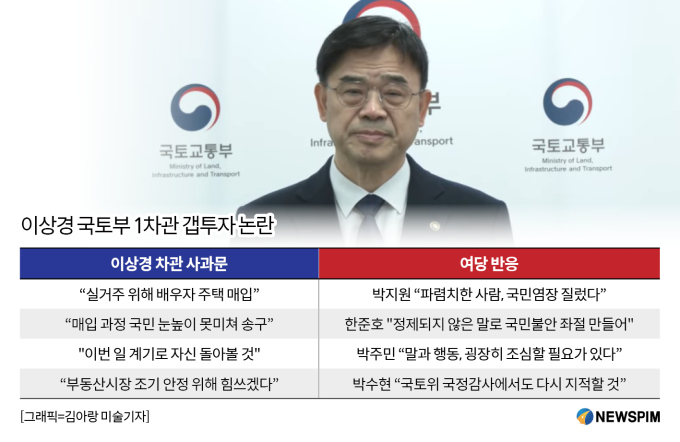열린우리당이란 정당이 있었다. 오늘날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이다. 노무현정부 첫 해인 2003년 11월 친노(親盧·친노무현) 성향 정치인들끼리 뭉쳐 만들었다. 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07년 8월 “범(汎)민주 진영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대통합민주신당과 합쳐지며 4년 남짓 존속하고 사라졌다. 하지만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이 2005년 열린우리당에 입당하며 정계에 뛰어든 점에서 보듯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작지 않다. 이 대통령은 올해 4월 민주당의 21대 대선 후보로 뽑힌 직후 수락 연설에서 자신이 ‘20년 민주당원’임을 강조했다. 여기서 20년이라는 기간은 바로 열린우리당 당원이 된 시점부터 계산한 것이다.

2005년 4월 30일 국회의원이 공석인 전국 6개 지역구에서 4·30 재보선이 실시됐다. 개표가 시작된 뒤 여당인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당원들의 이목은 일제히 경북 영천에 쏠렸다. 다른 선거구 다섯 곳은 제1야당인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또는 한나라당 성향 무소속 후보가 일찌감치 앞서갔다. 유독 영천 한 곳만 열린우리당 정동윤 후보가 한나라당 정희수 후보와 엎치락뒤치락 백중세를 이뤘다. 열린우리당 입장에서 정동윤 후보의 당선은 그저 재보선 6전 전패를 면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열린우리당의 ‘불모지’로 통하는 대구·경북(TK)에 귀중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경주 출신으로 대구에서 고교를 나온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선거운동 기간 내내 영천에 상주하며 정동윤 후보를 응원했겠나. 하지만 결과는 2만5537표(51.3%)를 얻은 정희수 후보의 신승이었다. 정동윤 후보는 그보다 1200여표 적은 2만4251표(48.69%)로 아깝게 낙선했다. 그래도 TK에 출마한 열린우리당 후보의 성적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높은 득표율이다.
정동윤 후보는 누구인가. 그는 제5공화국 시절 여당인 민주정의당을 통해 정계에 입문했다. 1985년 12대 총선 당시 민정당 전국구(현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나 당선권에 들지는 못했다. 그런데 1987년 12월 대선에서 민정당 노태우 후보가 승리하며 천운(天運)이 찾아왔다. 민정당 전국구 의원이던 노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의원직을 사퇴하자 전국구 순번에 따라 정 후보가 이를 승계한 것이다. 다른 사람도 아닌 대통령한테 금배지를 넘겨 받은 그는 여세를 몰아 1988년 13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이번에는 고향인 영천에 당당히 지역구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하나 여의도와 정 의원의 인연은 딱 여기까지였다. 1990년대 들어 그는 여러 차례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보수에서 진보로 아예 진영을 바꿔 도전한 2000년 총선(새천년민주당) 그리고 위에 소개한 2005년 재보선(열린우리당) 결과도 씁쓸하기만 했다.

제12·13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정동윤 전 의원이 23일 별세했다. 향년 88세. 정계 입문 전 경영학을 공부한 고인은 특히 보험·해운 분야 전문가로 ‘보험투자론’, ‘해운 기업의 수익성 분석론’ 등 저술을 남겼다. 고려대·명지대·숭실대·배재대 등 대학 강단에 섰고, 직접 기업 경영에 참여하기도 했다. 2005년 열린우리당 공천으로 4·30 재보선에 출마한 뒤로는 정치 그리고 선거에서 멀어졌다.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렵겠으나 민정당에서 정치 활동을 시작해 열린우리당에서 관련 경력을 마감한 인물은 고인 말고는 없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대통령 당선인에게서 비례대표 의원직을 물려받은 사례는 고인이 유일무이하다. 민주당 계열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로 TK에 출마해, 비록 낙선했지만, 50% 가까운 득표율을 올린 것 역시 값진 기록임이 분명하다. 정치인으로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고인의 명복을 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