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식당과 호텔 곳곳에서 사용 중인 서빙로봇이 해킹 등 외부 침입에 노출돼 있음에도 사실상 '보안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보급된 서빙로봇은 약 1만 7000대이며 이 가운데 60%가 중국산 제품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이들 로봇 상당수가 외부 중국 클라우드 서버와 실시간으로 영상과 위치 정보를 주고받는 구조라는 점이다. 즉로봇이 촬영한 영상과 데이터가 해외 서버로 전송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ISA 등 정부 기관은 서빙로봇의 보안 점검 권한조차 없다.
KISA는 과거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시중 로봇청소기의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즉시 조치했지만 서빙로봇은 기업 간 거래(B2B) 형태로 유통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임의 점검이나 결과 공개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KISA 관계자는 "서빙로봇의 경우 기업 동의 없이 사전 점검이나 결과 공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무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 의원은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온 로봇이 해외 서버와 연결된 채로 방치된다면 이는 결국 '한국형 빅브라더'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보안 인증 제도가 현재 국내 제품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수입 제품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은 중국산 드론과 로봇을 '안보 위협 장비'로 지정해 연방정부의 구매 및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 역시 중국산 로봇의 데이터 처리 과정에 대해 '데이터 주권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서빙로봇은 단순한 편의 장비가 아니라 영상과 위치 정보를 다루는 이동형 폐쇄회로(CC)TV에 가깝다"며 "보안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한국 소비자의 일상이 해외에 생중계되는 셈"이라고 경고했다.


![[데스크의 눈] ‘양치기 정부’ 안되려면](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0/21/20251021518324.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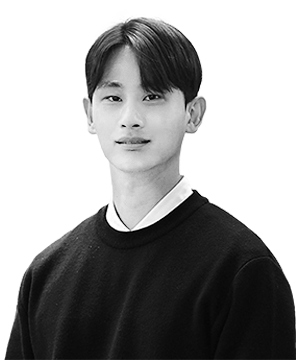
![[기고] 스턱스넷 이후의 교훈: 사이버전쟁 시대의 국가보안 전략](https://img.newspim.com/news/2025/09/09/2509091419209090.jpg)
![[ET시론]원산지 표시제 강화로 국민의 식탁을 더 든든히](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0/22/news-p.v1.20251022.4cfaf3b7e3b3414f89536eb314c5e631_P3.png)
![[2025 국감] 해외직구 급증하는데…관세청 사전구매검사 '유명무실'](https://img.newspim.com/news/2025/10/20/251020171216234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