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가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계약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한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송상 필요한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는 행위는 정당행위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4일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B씨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C씨의 소송을 위임받아 대리했다. 문제는 B씨가 재판 과정에서 작성한 준비서면의 내용과 관련해 발생했다. B씨는 준비서면에서 “A씨는 ‘다단계판매 그룹에 대한 투자 관련 분쟁’에 연루된 다수 투자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해 고소장 작성 등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며 “해당 사건의 주장들은 A씨에 의해 왜곡된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기술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제3자인 D씨와 A씨가 체결한 계약서 사진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했다. 해당 계약서에는 ‘A씨가 D씨에게 소송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D씨가 수령한 피해보상금의 50%를 A씨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계약서에는 A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A씨는 “B씨가 개인정보를 누설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3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가 금지하는 개인정보 누설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제3자가 이용하도록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B씨는 업무상 알게 된 A씨의 개인정보를 A씨의 의사에 반해, 제3자와의 민사소송 과정에서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B씨는 A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진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하며,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B씨가 제출한 계약서가 소송 수행을 위한 정당한 행위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B씨가 해당 계약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행위는 소송행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며 “계약서 사진의 취득 과정에서 다른 법익을 침해했다는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민감정보가 아니며, 소송과 무관한 제3자에게 제공될 위험성도 크지 않다”고 판시했다.
![[예규‧판례] 이름 빌려줬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사 등재…인정상여 부과 못 해](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040/art_17593809432613_620a2c.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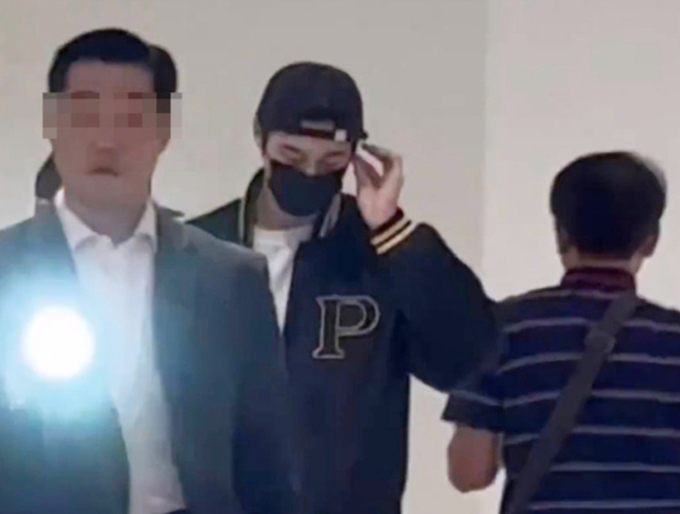
![[속보] '李 최측근' 김현지 부속실장 고발당해…"나이·학력 왜 공개 안하나"](https://newsimg.sedaily.com/2025/10/06/2GZ2OCPUDB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