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년 3·1운동 이후 일제의 탄압은 조선 전역을 숨 막히게 옥죄었다.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거점을 중국, 러시아 등 해외로 옮기던 시기였다. 그러나 사방이 일본 고등경찰의 감시망에 둘러싸인 일본 열도 한복판에서, 또 일제가 남은 저항의 불씨마저 가혹하게 짓밟던 조선 땅을 다시 밟으며 더욱 거센 무장투쟁을 이어간 이들이 있었다.
도쿄 한복판, 밀정 순사 처단
1931년 1월 18일 일본 도쿄. 관동자유노동조합 소속으로 재일 조선인 노동자의 권리 확보에 앞장서던 유종환(22)과 유록종(19)이 기숙하던 거처의 문이 거칠게 열렸다. 들이닥친 이는 일본 고등계 순사였다. 그는 다짜고짜 “본적이 어디냐"며 "성명은, 연령과 직업, 학교는”이라며 캐물었다.
이 순사는 그간 조선인 운동권 인사를 감시하고 염탐해온 밀정이었다. 당시 동아일보는 유종환에 대해 "일본 경찰이 항상 경계하던 대상"이라며 "중등 정도 학교를 졸업하고 동경으로 건너가 고학하며 조선해방운동에 가담한 '주의 인물'로 분류됐다"고 보도했다.
잠시 뒤 순사는 이른바 ‘불온서적’을 찾아내더니 두 사람을 연행하려 했다. 그 순간 유종환과 유록종은 눈빛을 주고받았다. 조직을 지키기 위해 더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결심이었다. 유종환은 순사의 목과 머리를 누르고 유록종을 돌아보며 “죽이자!”라고 외쳤다. 이어 넥타이를 순사의 목에 감았고 그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다. 이들은 시신과 소지품을 급히 치웠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않았다. 사건은 곧 발각됐고 이튿날 두 청년은 잇달아 체포됐다.

검거 직후 두 사람은 경시청으로 호송됐다. 당시 기사 속에 '엄중한 취조', '엄밀 취조'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일본 경찰의 가혹한 고문이 있었다는 걸 시사한다. 재판 결과 유종환에게는 사형이, 유록종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일본 내 조선인 사회에 적지 않은 울림을 남겼다. 일본 내무성의 사상월보(1932)도 “좌우를 막론하고 조선인은 모두 내심 통쾌히 여겼으며 극좌분자는 두 사람을 용감한 투사로 추칭하고 격문을 날렸다”고 기록했다. 이는 일본 당국조차 당시 분위기를 기록으로 남길 만큼 당시 조선인 사회의 분노와 독립에 대한 열망이 거셌다는 방증이다.
'친일 군수' 심장 겨눈 방아쇠
1920년 5월 28일 황해도 은율군. 대한독립단원 황윤상(39)의 집에 결의에 찬 무장 단원들이 모여들었다. 압록강과 대동강을 건너온 이들은 권총과 탄환을 품고 있었다. 대한독립단은 일본의 군경과 친일파를 공격하고, 독립군과 군자금을 모집하는 단체였다. 당시 신문은 그들이 받은 명령을 이렇게 전했다.
“독립운동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고, 이를 방해하는 자는 살해하라.”
표적은 정해졌다. 은율군수 최병혁, 그리고 은율군 참사 고학륜. 두 사람 모두 친일파이자 독립운동을 방해하는 세력으로 지목됐다. 작전은 치밀하게 짜였다. 그리고 석 달 뒤인 8월 15일, 대한독립단원 이지표는 최병혁의 집 담장을 조용히 넘어섰다. 곧 방아쇠가 불을 뿜었고, 총탄은 최 군수의 가슴을 꿰뚫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다. 고학륜 참사는 뒷문으로 달아나 목숨을 부지했다. 25년 뒤 광복을 예견이라도 한 듯한 날짜에 이뤄진 거사였다.

‘은율군수 처단 사건’은 친일 세력에 경종을 울리며 민심을 요동치게 했다. 그날 울린 한 발의 총성은 친일의 말로를 각인시킨 셈이었다.
이듬해인 1921년 8월 해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이들의 재판에는 조선인 방청자만 2000여 명이 몰려들었다. 공범으로 지목된 대한독립단원은 무려 43명에 달했다.
막후에서 작전을 지원한 황윤상은 결국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해주형무소에서 차가운 세월을 견디다 1922년 7월 풀려났다. 그날의 총성은 꺼지지 않는 독립의 메아리로 오래도록 울려 퍼졌다.
세 명이 일본 순사를 무너뜨린 날
1922년 6월 14일 자정 무렵, 함경남도 갑산군 동인면의 고요한 밤을 세 명의 발자국 소리가 깨뜨렸다. 무장 독립운동 단체 광정단(光正團) 소속의 정갑선·김병수·한성조, 세 명의 독립운동가가 함정포 경찰 주재소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다. 당시 20살에 불과했던 정갑선은 이미 3년 전 갑산공립보통학교 시절부터 학생과 졸업생들에게 독립의 필요성을 부르짖던 결의에 찬 청년이었다.
그날 세 사람은 악명 높은 일본인 순사를 사살하고 네 명의 경관에게 중상을 입혔다. 이어 무기를 탈취한 뒤 주재소와 면사무소를 불태우고 쌓아둔 공문서를 모조리 소각했다. 1922년 8월 1일자 독립신문은 이를 "세 용사의 대승리"라고 평가했다.
함흥지법 판결문에는 이들이 “권총을 겨누며 자신들이 조선독립단원이라고 알린 뒤 군자금을 제공하지 않으면 살해하겠다고 협박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모든 행동은 오직 독립자금 마련을 위한 것이었다.

앞서 정갑선은 중국 장백현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광정단에 몸을 담았다. 그는 독립자금 모금과 주재소 공격은 물론, 국경 부근의 전신과 전화선을 끊어 통신망을 마비시키는 등 거침없는 활동을 이어갔다.
1924년 체포돼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서대문형무소와 경성형무소에서 긴 세월을 보냈지만, 감형으로 1930년 11월 서대문형무소의 문을 나설 수 있었다. 백두산을 넘나들며 싸웠던 정갑선의 이름은 2019년에야 독립기념관 산하 독립운동가 자료발굴 TF팀에 의해 세상에 드러나 그의 투쟁이 역사의 한 줄로 기록될 수 있었다.
특별취재팀=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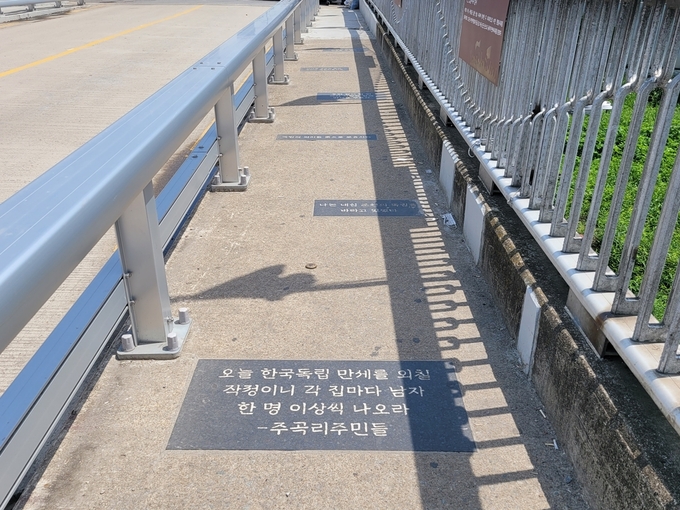

![[맷돌고성] 음수사원(飮水思源)의 중국?](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833/art_17549575402693_f61a45.jpg)



![[단독] 경찰, ‘범죄단체 조직’ 혐의 백골단 단장 불송치 결정](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3/5d5b6971-7c79-4fea-84df-6a68e945965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