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이름은요?” 뒤풀이 자리에서 한 학생이 해맑은 표정으로 잔인한 질문을 한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그 신원을 확인하는 행위는 사회 활동의 기본이다. 그래서 첫인사에서도 자신의 신원을 알리는 두 정보를 주고받는다. 얼굴과 이름이다.
내 수업의 수강생들은 나와 사제의 연을 맺었으니 이름과 얼굴을 외우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학생들은 그런 내가 신기했는지 술자리에서 본인의 이름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젠 나도 예전 같지 않다. 얼굴은 본 기억이 나는데,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다.

사실 이름 외우기는 쉽지 않다. 어떤 친구를 떠올릴 때 얼굴, 버릇, 함께 겪었던 사건들은 생생한데, 이름만 생각나지 않는 경우를 종종 경험할 것이다. 이를 ‘설단현상’이라고 한다. 기억 속에 저장된 정보가 제대로 인출되지 않아 생기는 현상인데, 이름이 대표적이다. 이름은 생각보다 나와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이름은 신생아 시절에 부모 혹은 가족에 의해 지어진다. 그래서 이름에 담긴 것은 나의 특징이 아닌, 부모님의 소망일 뿐이다. 차라리 학창 시절 별명이 내 특징과 더 관련 있는 셈이다.
그래서 얼굴이나 별명은 기억나도, 이름은 떠올리기가 쉽지 않다. 나이가 들어가고, 노화가 진행되면서 더 어려워진다. 뇌가 구조적으로, 기능적으로 변화하면서 정보 인출의 능력이 어느 정도 감소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 역시 자연스러운 현상. 요즘 부쩍 지인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다고 치매를 떠올리며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차라리 이름은 기억하기 쉽지 않으니, 내 이름을 남에게 기억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하면 어떨까? 보통 우리는 에티켓이라는 이유로 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타인의 예의 없음만을 탓한다. 하지만 그들 역시 어려웠을 뿐이다. 내 이름을 기억 못 하는 주변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름을 알려주는 노력을 하자. 긍정적 정서와의 연합을 위해 따뜻한 미소도 곁들이면 더 좋겠다.
최훈 한림대 교수

![[우리말 바루기] 행운을 가져다주는 ‘징크스’는 없다](https://img.joongang.co.kr/pubimg/share/ja-opengraph-img.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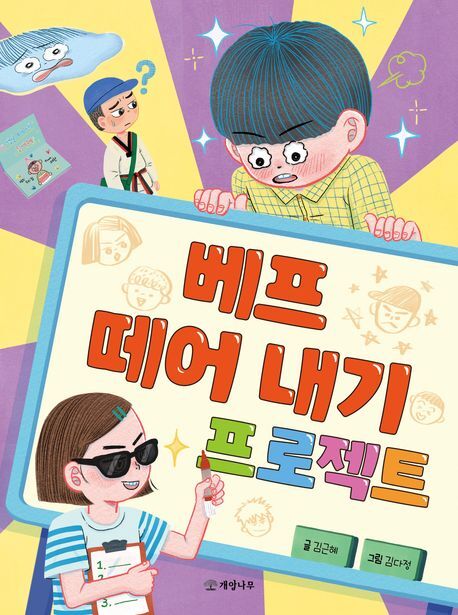
![[여호영의 시대정신] 〈28〉자서전을 망설이는 이유](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11/11/news-p.v1.20241111.e2dc92cd022845a6b399e74a2bf57f1a_P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