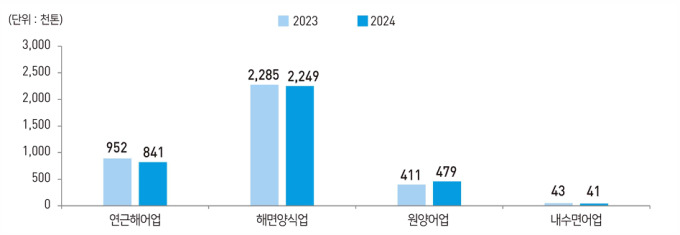수출 효자 품목으로 꼽히며 승승장구하던 파프리카가 최근 이상기상, 병해충, 수출 감소 등의 악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장에서는 파프리카 생산기반 축소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국내 파프리카 재배면적은 그간 시설 지원사업 확대와 건강소비 패턴 확산 등으로 최근까지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재배면적이 2019년 728㏊에서 2023년 807㏊로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2023년을 고점으로 2024년 791㏊로 감소했으며, 올해는 이보다 더 줄어든 779㏊에 그칠 것으로 관측됐다.
감소세의 첫 원인은 이상기후에 따른 생산성 저하가 꼽힌다. 파프리카 주산지인 경남은 일반적으로 7월초 파종 후 11월초부터 출하가 시작돼 이듬해 6월까지 8개월여간 출하한다. 그런데 최근 들어 여름 고온기가 길어지면서 첫 출하 시기가 점점 늦춰졌고, 그 여파로 출하 가능 시기가 점점 줄어들었다는 게 농가들의 전언이다.
경남 의령의 파프리카농가 정태경씨(44)는 “지난여름에 고온기가 계속되면서 파프리카 생장이 더뎌진 탓에 첫 출하 시점이 11월말로 늦춰져 생산량이 평년 대비 15% 이상 줄었다”고 말했다. 정씨는 “고온 피해에 대한 지원책이나 보험이 필요하다고 호소하는 농가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파프리카 생산성이 저하된 또 다른 원인으로 ‘파프리카 털뿌리병’이 꼽힌다. 털뿌리병은 뿌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해 뿌리이상비대증(Crazy root)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병에 걸린 파프리카는 영양생장이 길어지고 생식생장으로 전환이 늦어져 착과 불량과 착과수 감소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경남지역의 적잖은 농가들이 이 때문에 생산성 저하와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지만, 털뿌리병에 대한 확실한 방제 방법은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 창원에서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농가 김삼수씨(58)는 “경남에서 주로 유행하던 털뿌리병이 최근에는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했다고 들었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방제법을 시급히 마련해 보급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출시장마저 축소돼 농가들은 삼중고를 겪고 있다. 국내에서 생산한 파프리카는 대부분 일본으로 수출하는데, 대일본 수출량은 2019년 3만5325t에서 2023년 2만1700t으로 크게 줄었다. 같은 기간 국내 생산량 대비 수출량 비중은 43.7%에서 28.0%로 급감하면서 내수 비중이 늘어난 상황이다.
이는 ▲엔저 현상으로 국내 농가 입장에서 수출시장 매력도가 떨어진 점 ▲그동안 일본 내 파프리카 자체 생산량이 늘어난 점 ▲일본 파프리카 소비 증가세가 둔화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수출 대상국 다변화, 해외 마케팅 강화 등을 통해 수출 물량을 일정 수준 이상은 확보해야 내수 수요가 감소했을 때 대응할 수 있다는 게 많은 농가들의 지적이다.
문제는 이처럼 수출시장의 어려움이 가속화하고 생산성 저하가 지속되면 농가 이탈이 계속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경남지역에선 지난 3년간 파프리카 농가 수가 185명에서 150명으로 줄었다.
조근제 한국파프리카생산자자조회장은 “지난해부터 농산물 수출보조금이 폐지됐고, 농사용 전기료도 많이 오르면서 농가 생산비 부담이 더 커진 상황”이라면서 “파프리카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생산비 지원, 병해충 방제법 개발 등 다각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령·창원=박하늘 기자 sky@nongmin.com

![[단독] "베트남 전자담배 공장 멈췄다"... KT&G '릴 하이브리드 3.0' 발주 중단](https://img.newspim.com/news/2025/02/21/250221132125079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