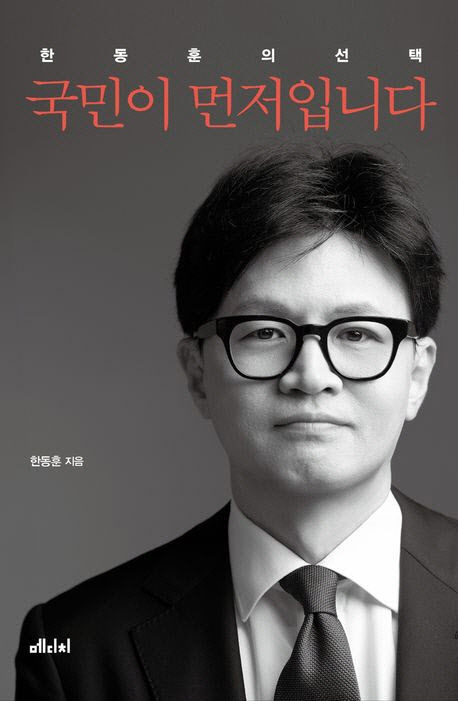어느 국회의원(A)이 회의 석상에서 어느 국회의원(B)에게 고함을 질렀다. 저거 순 쓰레기네! A의 입에서 나온 말은 마이크를 타고 경향 각지의 안방까지 들렸지만 정작 건너편 B의 귀에서는 그냥 스치고 말았다. 둘은 같은 공간에서 또 말을 주고받는다. 말만 A의 발등을 찧었나. 이후 B가 아니라 A만 보이면 쓰레기가 먼저 A의 얼굴을 덮어버린다. 말의 작용이다.
어느 변호사가 기자들을 모아놓고 12·3 내란 사태 당시 계엄군이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려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 “체포의 ‘체’ 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상하다. 그의 말이 오히려 당시 국회에 투입된 군인들이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측근은 거짓말로 인터뷰하고, 당사자는 자기 살길만 찾는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말의 반작용이다.
입에서 나와 귀로 사라지는 말. 이는 사람 사이로 뜻을 연결하는 실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을 묶는 밧줄이기도 하다. 한번 뱉고 나면 엎질러진 물처럼 주워 담을 수 없는 말. 이런 말에 대해 공자도 깊이 천착했다. <논어>에는 말을 다루는 내용이 많다. 그중 한 대목. 古者 言之不出 恥躬之不逮也(고자 언지불출 치궁지불체야). 여러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요는 이렇다. 옛사람이, 말을 함부로 내뱉지 않은 것은, 부끄럽게도, 자기가 그 말을 체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말의 성질이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는 인간사에서 항용 있는 일이라고 치부하고 말 것인가. 막강한 힘을 소지한 어느 대표의 입 앞에는 늘 마이크가 있다. 그가 발언할 때마다 수시로 열리는 입술 너머 가지런한 치열이 보인다. 이빨 하나 빠져도 말이 새고 나중 발음이 뭉개져 옹알이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 언어란 목구멍에서 소리로 나왔다가 이빨의 도움을 받아야 말이 되는 것 같다. 이빨은 정직한데 왜 말은 막걸리가 되는가.
하루를 살자면 손으로 저지르는 일이 많다. 세수란 말도 그래서 생겼나 보다. 얼굴이야 아침저녁이면 족하지만 더러 화장실 갈 때 손만 닦을 건 아니다. 씻어야 할 건 입술이다. 흐르는 물로 허전한 입술을 문질러보라. 입꼬리에 남은 말의 찌꺼기들이 쩔렁쩔렁 떨어져 내린다.


![[강상헌의 심우도] 불출(不出)의 시대](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208/art_17400117788656_c46abe.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