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미국 연방항소법원의 뉴섬 판사는 한 판결문에 흥미로운 보충의견을 남겼다. 그는 사건을 심리하면서 인공지능(AI)의 답변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자신이 AI에 어떤 질문을 던졌고, AI가 어떤 답을 했는지 판결문에 상세히 기록했다. 나아가 다른 사건에서도 판사가 AI의 의견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가 다룬 사건은 언뜻 평범해 보인다. 원고는 자기 집 뒷마당에 놀이기구를 설치하다가 다쳤다. 다행히 상해 보험을 들어 놓았는데, 보험 계약에는 조경 작업 중 입은 부상을 보상해 준다고 되어 있었다. 문제는 놀이기구 설치가 그 조경에 들어가느냐는 것이었다. 조경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할지는 생각보다 애매한 문제였다.
미국 판사는 판결문에 AI 인용
AI로 시민시선 볼 수 있기 때문
반목의 시대 넘어서는 도구로
AI 답변 현명하게 활용하기를

계약서 문구를 해석할 때는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의미가 기준이 된다. 이런 점에서 AI의 능력은 꽤나 빛을 발한다. AI는 이제껏 수많은 인간이 쓴 글을 학습해 통계적으로 가장 가능성 높은 답을 만들어낸다. 덕분에 AI가 제시하는 해석은 사회 평균인의 이해에 가까운, 통상적 의미라 할 수 있다. 그러니 인간 판사가 자신의 제한적 경험에만 기대어 해석하는 것보다 AI의 의견이 더 객관적일 수도 있다.
물론 뉴섬 판사는 사법부가 AI를 활용할 때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더라도 판사가 개인적 시각을 넘어 일반 시민의 관점에서 판결을 내리려 한다면 AI의 도움의 유용성은 작지 않을 것이다. 판사들은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러니 자기 생각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매 순간 인식하고 다른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AI는 바로 그런 목소리를 내줄 수 있다.
판사가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는 AI를 통해 다른 생각을 접할 수 있다. 필자가 가장 유용하게 AI를 활용하는 방식은 내 생각을 비판하고 그 논거를 제시하라고 시켜보는 것이다. 이렇게 받은 여러 반대 논거를 하나씩 살펴보며 내가 놓친 점은 없는지 되짚어 본다. 그 과정에서 내 의견을 더 정리하거나 발전시킬 수 있고 때때로는 생각을 바꾸게 되기도 한다.
반대로 AI를 잘못 활용하는 방식은 자신이 모르는 문제에 대해 정답이 무엇인지 묻는 것이다. 세상에는 정답이 없는 문제가 무수히 많다. 그런데 AI에 정답을 물으면 그럴듯한 답 하나를 통계적으로 만들어 보여줄 뿐이다. 그 답이 정말 정답이라는 보장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그래서 어떤 문제의 정답을 찾고 싶다면 결국은 스스로 답을 얻고자 노력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AI가 대신 정답을 정해줄 수는 없다. 반대로 어떤 문제에 대해 ‘이게 정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생각을 AI에 확인해 보는 편이 좋다. AI의 도움을 통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배울 수 있다.
와튼스쿨의 심리학 교수 애덤 그랜트에 따르면 우리 마음에는 전도사, 검사, 정치인 같은 사고방식이 자리잡고 있다고 한다. 내 믿음이나 의견과 다른 사람을 만나면, 이러한 사고방식이 본능처럼 작동한다. 전도사처럼 타인에 내 믿음을 전하려 애쓴다. 검사처럼 타인의 주장을 따져 묻는다. 정치인이 된 마냥 내 생각에 대한 지지를 얻으려 온갖 전략을 동원하기도 한다.
그랜트 교수는 이런 사고방식 때문에 애초에 자신의 믿음이 맞는지 성찰할 기회를 놓치기 쉽다고 지적한다. 남의 생각을 바꾸려는 데만 몰두하다 보면, 정작 자신을 돌아볼 틈이 없다. 이런 ‘고집스러움’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앓고 있는 고질병이다. 필자도 예외는 아니다. 누가 내 생각을 비판하면 두고두고 마음에 남고, 내 의견과 다른 사람을 만나면 한참을 붙들고 설득하려 든다.
이런 고집스러움에는 AI가 의외의 특효약이 될 수 있다. AI는 세상 수많은 사람의 생각을 학습한 결과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AI를 통해 타인의 관점을 배울 수 있다. 사고의 유연성을 키우고, 내 의견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
다만 AI는 잘 써야 한다. AI에 내 생각을 뒷받침해 달라고 요청하면, AI는 그런 답변만 생성해 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AI는 그저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만 들려주는 아첨꾼이 되어버릴 수 있다. 그러니 내 생각을 바꿀 마음을 갖고 AI에 물어야 한다.
세상은 원래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한 곳이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사처럼 자기 의견을 타인에 전파하고, 검사처럼 타인과 논쟁하며, 정치인처럼 협상하는 사고방식을 갖게 되었다. 자기 생각이 옳은지 반추해 보는 태도를 갖추기란 쉽지 않다. 그런 점에서 AI는 고마운 비판자가 될 수 있다. 서로가 극단의 반목을 거듭하는 사회에서 AI가 우리 각자에게 다른 관점을 비춰주는 거울이자 꾸준한 비판자가 되어주기를 기대한다.
김병필 KAIST 기술경영학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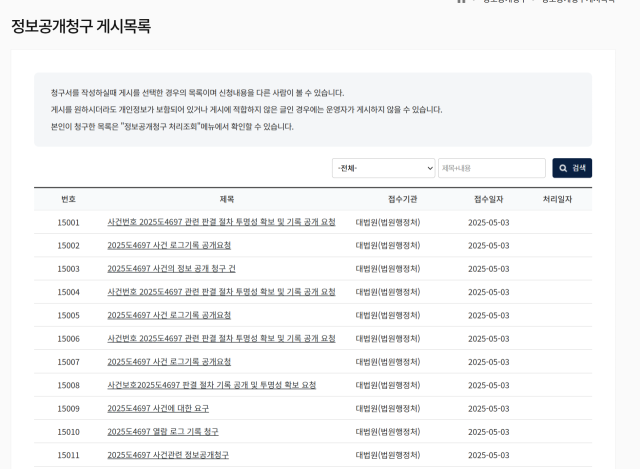

![오피스의 고장난 시계, 고치려다 말았더니 생긴 일 [김성칠의 해방일기(18)]](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03/f94a77bb-d273-4555-8b03-4ced2a50972a.jpg)

![학익진 글씨체도 좌우로 정렬…갤탭만 있으면 나도 ‘필기머신’? [이동수는 이동중]](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5/02/2025050251181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