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에서 ‘환자의 생명’을 위해 당연하게 여겨졌던 의사의 장시간 근무 문화에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가 반기를 들면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올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서 주목 받은 종합병원 전공의(레지던트)의 장시간 근무 문제에 시사점을 주는 모습이다.
3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약 30명의 미국 의사들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이러한 현상을 조명했다.
미국의사협회(AMA)에 따르면 미국 의사들의 평균 근무 시간은 주당 59시간에 이른다. 과거에는 의사들이 이러한 장시간 노동과 그에 따른 피로·스트레스를 직업에 따르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지만 최근 의대를 졸업한 젊은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인식이 바뀌면서 과거의 관행을 거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플로리다주에서 내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조지프 콤포트(80)는 "의사들도 다른 근로자들과 똑같다"며 "그것이 신세대들이 행동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브리검 여성병원에서 레지던트 교육 프로그램을 지도한 의사 조엘 카츠(66)는 젊은 의사들이 ‘의사의 소명’이라는 전제에 거부감을 드러내며 다른 근로자들처럼 병가와 연차 휴가, 최소 근무 시간 등의 복지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험과 같은 행정 업무 부담 가중도 젊은 의사들 사이에서 '사명감'이 줄어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샌프란시스코에서 1년 차 레지던트로 일하고 있는 크리스토퍼 도만스키(29)는 "환자들에게 좋은 진료를 제공하고 함께 있는 것은 매우 기쁘지만, 의료계는 더욱 기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변에 많은 의사가 환자를 돌보기보다는 보험 회사와 씨름해야 하는 상황에 불만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워라밸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개업보다 대형 병원에서 정해진 시간만 일할 수 있는 파트타임 근무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는 모습도 나타났다. 올해 초 첫 아이를 가졌다는 도만스키는 “레지던트 수련을 마친 뒤에는 주 4일 근무할 수 있는 파트타임 일자리를 알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입원전담전문의로 일하는 카라-그레이스 리벤탈(40)은 “정해진 출퇴근 시간에 맞춰 근무하는 현재 직책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많은 젊은 의사들이 의사들의 '워커홀릭' 문화가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돌봐야 한다"면서 또래 많은 의사가 일을 하면서 자녀나 나이 든 부모를 부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전반적인 의료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젊은 의사들이 거부한 야간 응급실 근무를 위해 나이 든 의사들이 대신 투입되는 경우도 생기면서 세대 간 갈등의 모습도 보인다. 30년간 외과 의사로 일한 제퍼슨 본(63)은 최근 한 달에 5∼7일은 야간 응급실 근무를 한다면서 "우리 '늙은이'들이 모든 응급실 전화를 받고 있고, 30대의 젊은이들은 매일 밤 집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과 삶에 대한 그들의 바람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다"라면서 "다만 환자가 우선돼야 하는 때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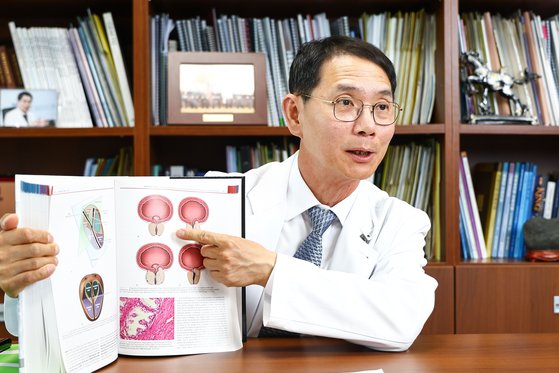

![[조석중의 북트렌드] (102) 꾸물 거리지 말고, 꿈을 그리자](https://www.domin.co.kr/news/photo/202411/1490661_669258_1154.jpg)



![[건강한 가족] 담즙 쌓여 간 파괴되는 질환 ‘피픽’, 신약 적용 땐 소아 간 이식 부담 덜어](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04/143761ea-c4a2-4124-92f4-9cf1c1d8d043.jpg)
![[전문가 칼럼] 찬바람 불면 심해지는 목이물감과 입냄새 해소 방법](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30835/shp_169328445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