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피플 존
정이현 지음 문학동네 | 368쪽 | 1만8000원

“페이스트리는 뜻밖에 정치적인 빵이다. 겹겹이 쌓인 층과 층 사이, 선처럼 얇은 틈이 숨어 있다.”
소설집을 열고 처음으로 만나는 문장은 이렇다. 얇은 구조의 과자가 수백겹 겹쳐 있는 이 빵은 맛있지만, 먹을 때 쉽게 바스러진다. 입안으로 넘어가 풍미를 자아내는 것들과 입 밖으로 떨어져 끝내 쓰레기가 되는 것들의 운명은 크게 다르다. 페이스트리라는 일상의 음식을 통해 계급적 긴장감이 첫 문장부터 날카롭게 다가온다. 인상적인 문장을 품에 안고 소설을 읽어 내려 간다. 작가는 도시적 욕망의 이면을 그려온 소설가 정이현이다.
그가 <상냥한 폭력의 시대> 이후 9년 만에 발표하는 소설집 <노 피플 존>의 첫 작품은 ‘실패담 크루’다. 살아오면서 겪은 실패의 경험을 고백하는 실패담 말하기 크루에 가입한 삼십대 변호사 ‘나’가 주인공이다. 확실한 학력도 뒷배도 없었기에 원하던 로펌에 들어가지 못하고 작은 법률사무소에 자잘한 사건들만 처리하던 ‘나’는 의사, 건축회사 대표 등 이미 사회적 위치가 확고한 이들이 모인 자리에서 근사한 실패담을 발표하려 하지만 매번 실패한다.

“실패했다는 기분이 들었다. 실패는 현상이 아니라 기분의 문제인지도 모르겠다.” 모임에서 실패담 발표의 성공과 실패가 점수로 매겨지는 것은 아니나 ‘나’는 사람들이 뿜어내는 무언의 분위기로 자신이 발표에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자신들이 가진 사회적 지위와 자산을 잃게 할 정도는 아니되 적당히 고난의 냄새가 풍기는 그런 종류의 실패를 ‘나’는 만들어 낼 수 있을까.
도시적 욕망 이면 그려온 정이현
가진 자들의 훈장이 되는 실패담
상급지 아파트 열망하는 커플 등
현시대에 대한 감각 다룬 소설집
현시대에 대한 감각은 이어지는 소설들에서도 드러난다. ‘우리가 떠난 해변에’는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방송됐다는 가상의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러브 애드벌룬’을 소재로 한다. 조건에 맞춘 결혼 상대가 아니라 자유로운 인간 대 인간의 만남을 위해 기획되었다는 프로그램에서 커플 매칭에 성공한 이들의 현재를 다큐멘터리로 풀어내고자 하는 프로듀서와 작가의 이야기다. 최근 몇년간 수많은 채널에서 난립한 연애 예능 프로그램들이 떠오른다.
‘가속 궤도’는 교제폭력의 문제를, ‘이모에 관하여’는 육아휴직을 쓰지 않기 위해 중국인 입주 도우미를 구하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 양육과 일, 돌봄 노동에 대해 말한다. “노 키즈 존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을 때 이런 생각을 해 본 적은 있다… 그게 누구든 얼마나 어리든 또는 얼마나 늙었든 자신이 있는 곳에는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노 피플 존.” 책의 제목이 등장하는 소설 ‘단 하나의 아이’는 놀이 가정교사 업체에 취직한 이십대 여성 한나의 이야기다.
소설집의 마지막 작품인 ‘사는 사람’은 첫 작품인 ‘실패담 크루’와 가장 조응하는 작품처럼 보인다. 유명 수학 학원의 상담 실장으로 일하는 다미가 주인공이다. 그는 남자친구와 상급지 아파트로 부동산 임장을 다닌다. 집을 살 것처럼 거짓 연기를 하며 다니는 임장에 대해 다미는 걱정하지만, 남자친구는 “안 믿을 건 뭐야. 아까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없잖아”라고 말한다.
소설에서 부동산은 현시대 젊은이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요소로 등장한다. 부동산이 이들에게 현재의 문제라면 다미가 몸담고 있는 사교육 현장은 과거의 트라우마 혹은 미래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역할을 한다. 소설에서 돌핀 학원은 학부모들에게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상징의 집합체”다. 한국 사회에서 사교육은 이제 부모의 재력과 뒷받침 능력을 상징하는 일종의 무형 자산에 가깝다.
다미는 학원에서 일종의 선의로 한 학생을 돕지만 곧 그 선의의 무용함을 깨닫는다. 다미는 자신이 “거대한 거미줄의 한 귀퉁이에 얽혀버린 날벌레”였는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이미 공고화된 계층 사회에서 인물들은 자신이 그들로 표현되는 상급지 아파트의 주민, 값비싼 사교육의 주인공들과 ‘다를 것 없다’고 믿어보려 하지만 끝내 실패한다. 어쩌면 ‘사는 사람’ 전체의 이야기가 다미의 실패담인지도 모르겠다.
저자가 2017년부터 올해까지 쓴 9편의 소설이 묶였다. 작가의 말에서 정이현은 자신이 쓰는 소설이 “보이지 않는 틈새에 숨겨진 것을 기어이 끄집어내겠다는 목적으로 성실하게 움직이는, 얇고 매끄럽고 실용적인” 치실에 가까웠으면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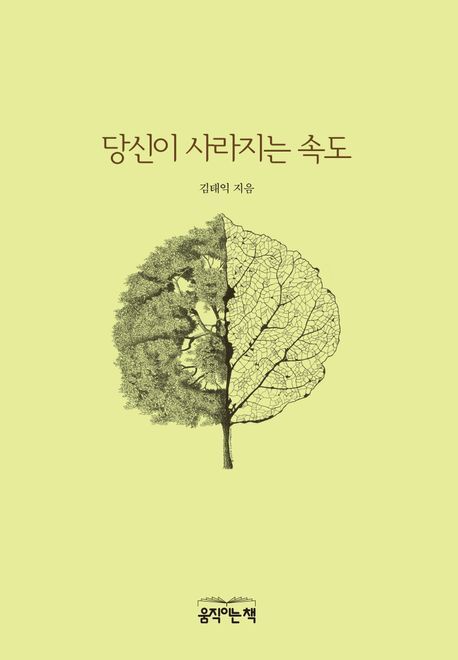
![[신간] 우리는 왜 남의 말에 휘둘리는가, '거짓 공감'](https://img.newspim.com/news/2025/10/22/251022101031071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