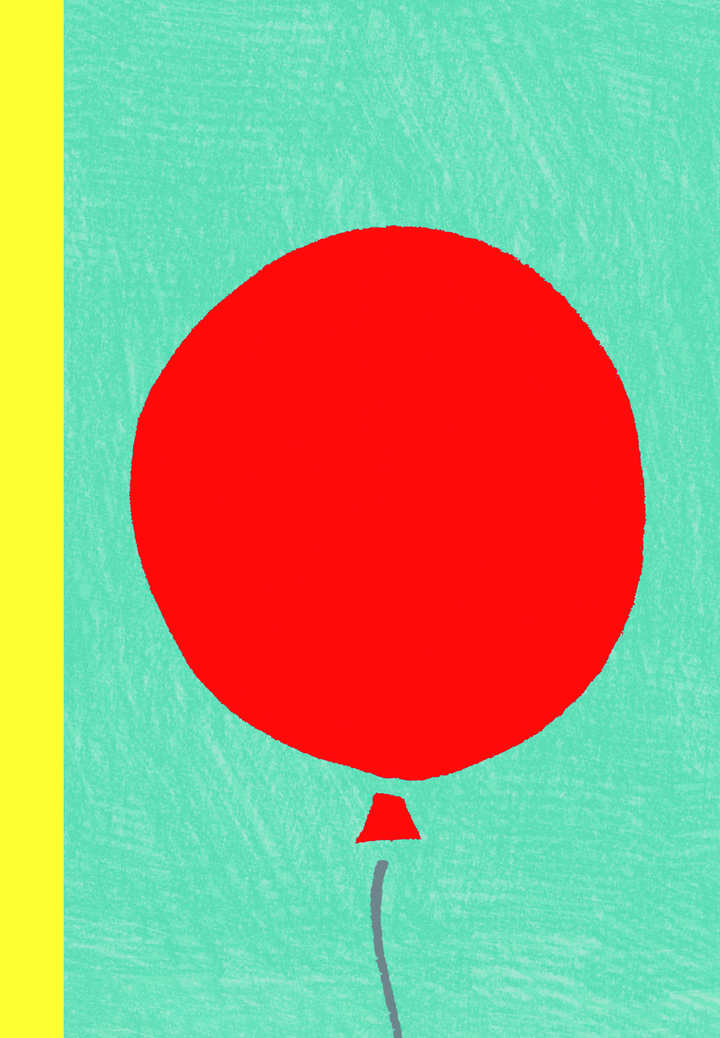중학교 1학년 입학 후 자전거 타는 것을 배웠다. 용두동 사대부중 정문 안쪽에 정문에 이르는 넓은 아스팔트 길은 주말에는 거의 다니는 사람이 없어 자전거 배우기에 좋은 곳이었다. 자전거를 잘 타는 친구가 대여점에서 자전거를 빌려왔는데 핸들에 브레이크 조정장치가 없이 페달을 거꾸로 돌리면 브레이크가 작동되는 자전거였다. 정문 앞 길은 건물 쪽에서 찻길을 향해 어느 정도 내리막길이었다. 자전거를 처음 배워서 어설픈데 내리막에 감당 못할 정도로 가속이 붙으니 페달을 거꾸로 돌릴 여유도 없어 그대로 번잡한 찻길로 달려 나갈 판이라, 핸들을 급히 꺾어 길옆 좁은 숲 쪽에 쳐 박았다. 여기저기 멍들고 까진 것은 물론이다.
‘마법사의 제자(The Sorcerer’s Apprentice, 독 Der Zauberlehrling)’는 1797년에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가 발표한 시로, 마법사와 그의 제자 간의 이야기를 다룬 14연(聯)으로 구성된 발라드 시이다. 이 시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노련한 노마법사가 집을 떠나며 제자에게 집안일을 맡기는데 제자는 물을 긷는 일을 하게 된다. 제자는 마법사가 없는 틈을 타 자신이 배운 마법을 시험해 보기로 결심하고, 빗자루에 마법을 걸어 대신 물을 긷게 한다. 마법이 잘 작동하여 빗자루가 연못물을 길어오고, 물을 다 긷자 제자는 빗자루를 멈추게 하려하지만 멈추게 하는 주문을 알지 못해 빗자루가 계속 물을 길어와 집안이 물에 잠기게 된다. 빗자루를 주문으로 멈추게 하지 못하자 도끼로 빗자루를 쪼개고, 쪼개진 조각은 각각의 빗자루가 되어 물을 길어 2배의 속도가 되니 제자는 더욱 곤란해져 절규한다. 돌아온 노마법사에게 읍소하여 노마법사가 마법으로 빗자루를 멈추게 해 상황을 정리하고, 제자에게 강력한 마법을 다루기 위해서는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남긴다.
이 시는 마법의 힘을 잘못 사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경고하는 내용으로, 이 이야기는 후에 1940년대에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판타지아’에서도 ‘마법사의 제자’로 각색되어 미키마우스가 제자역할을 하였다. 2010년에는 존 터틀토브(Jonathan Charles Turteltaub, Jon Turteltaub) 감독, 니콜라스 케이지(Nicolas Cage) 주연의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이러한 시대를 초월한,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이야기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이 현대 일터에 등장한 것에 섬뜩함을 느끼게 한다. ChatGPT처럼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의 마법 같은 기능을 맛본 지식인이라면 누구나 마법의 힘을 탐하는 마법사의 제자를 떠올리게 될 것이다. 인간의 지혜로 컨트롤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은 언제든 어떤 형태로든 커다란 위험과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
‘마법사의 제자 증후군(Sorcerer’s Apprentice Syndrome)‘이라는 용어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상황, 곧 기술이 통제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설명할 때 사용된다. (예: 인공지능, 자동화 문제)
공상과학소설 작가였던 아서 C. 클라크 경(Sir Arthur C. Clarke)의 과학 3법칙은 다음과 같다. 1)저명한 노과학자가 무언가가 가능하다고 말했을 때, 그것은 거의 확실한 사실에 가깝다. 그러나 그가 무언가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을 때, 그것은 그릇된 경우일 확률이 높다. 2)어떤 일의 가능성의 한계를 알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불가능의 영역에 살짝 도전해 보는 것뿐이다. 3)충분히 발달한 과학 기술은 마법과 구별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이해를 넘어선 변화를 이끌어내는 훨씬 더 가상적인 초지능 단계(Superintelligence stage)의 문턱에서 클라크의 제3법칙을 실감하게 되며, 인간의 지혜를 넘어서는 향후 인공지능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파에톤(Phaethon)은 ‘빛나는 자’라는 의미로, 그리스 신화에서 태양신 헬리오스(Helios)와 바다의 님프 클리메네(Clymene)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어머니 클리메네의 보호 아래 성장했고, 자신의 아버지가 태양신 헬리오스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헬리오스의 궁전으로 여행을 떠난다. 헬리오스는 아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약속한다. 파에톤은 헬리오스의 태양 마차를 하루 동안 몰아보고 싶다고 요청하지만, 헬리오스는 그 요청을 만류한다. 그러나 파에톤은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여 결국 헬리오스의 허락을 받고 마차를 몰게 된다. 파에톤은 마차를 제대로 조종하지 못하고, 태양 마차는 지구에 너무 가까워져서 땅을 태우고, 너무 멀어져서 얼어붙게 만든다. 이로 인해 지구는 큰 재앙에 처하게 되고, 결국 제우스(Zeus)는 파에톤을 번개로 쳐서 그를 죽인다. 그의 시신은 에리다노스 강에 떨어지고, 그의 누이들인 헬리아데스(Heliades; 헬리오스의 딸들)는 그를 애도하다가 포플러 나무로 변하고, 그녀들의 눈물은 호박(琥珀)이 되었다.
이 이야기는 과도한 자만과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이다. 그의 비극적 결말은 신화 속에서 인간의 오만함이 초래하는 재앙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파에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성장하며, 그로 인해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졌고, 이는 ‘파에톤 콤플렉스’라는 심리적 개념으로도 설명되며, 부모의 사랑과 인정이 결핍된 경우 자녀가 겪는 심리적 갈등을 나타낸다.
구글 검색이 아닌, 챗GPT나 코파일럿(Copilot)의 AI 검색을 사용하다가 최근에 나온 Felo AI 검색을 사용해 보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편리함과 풍부함을 느끼지만, 변호사 천국인 미국의 변호사업이 망해간다는 소식에 한편 두려움도 커져간다.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전북일보 신춘문예 작가들이 추천하는 이 책] 최아현 소설가 – 김채람, 양소영, 이풀잎 '효자, 시절'](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4/02/.cache/512/20250402580183.jpg)


![[작가 세상] 그 많던 행복은 다 어디로 갔을까](https://www.usjournal.kr/news/data/20250403/p1065614170941502_814_thum.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