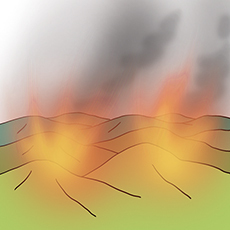
불쑥 찾아와 쑥대밭을 만들었다. 기다렸던 봄날, 피하고 싶었던 불청객이다. 새 생명이 움트는 계절, 남녘의 ‘꽃소식’을 기다렸는데 ‘불소식’이 먼저 왔다. 봄의 전령 매화와 산수유, 그리고 개나리와 진달래, 벚꽃이 전국의 산과 들에서 다투어 피어나야 할 때, 우려했던 그 괴물이 몸집을 불려가며 국토를 삼켰다. 현장의 주민들은 물론 멀리서 하릴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도 속이 새까맣게 탔다. 건조한 날씨에 강풍이 더해지는 계절, 거세게 타오른 불길을 잡는 건 쉽지 않다. 결국은 애타게 기다린 봄비가 아주 적은 양이었지만 진화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가까스로 ‘급한 불’은 껐다. 하지만 상처가 깊다. 이번엔 유난히 크다. 기록을 갈아치웠다. 화마는 물러갔어도, 돌아갈 곳이 없는 이재민이 적지 않다. 소중한 삶의 터전을 순식간에 잃고 결국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우리 산골, 우리네 고향은 더 적막해진다.
‘폭풍이 지난 들에도 꽃은 핀다. 지진으로 무너진 땅에도 맑은 샘은 솟아난다. 불에 탄 흙에서도 새싹은 움튼다.’ 주옥 같은 명문으로 유명한 영국의 낭만파 시인 바이런이 남긴 명언이다. ‘절망 속에 잉태되는 희망’을 새삼 강조한 표현이다. 바이든이 노래한 것처럼 자연의 치유력은 대단하다. 시간 문제다. 불에 탄 숲이 복원되려면 수십 년이 걸리고, 토양이 살아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올봄 화마가 할퀴고 간 폐허에도 생명의 불씨, 희망의 불씨는 분명 다시 살아날 것이다.
산불이 사그라들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꽃소식이 올라온다. 따스한 봄날을 알리는 벚꽃이 여기저기서 꽃망울을 활짝 터트리고 있다. 꽃잔치 소식도 속속 들려온다. 당장 축제를 눈앞에 두고 행사 취소·연기를 심각하게 고민했을 지자체들이 앞다퉈 꽃잔치 소식을 전하며 상춘객을 유혹하고 있다. 그래도 봄은 축제다. 좌절을 딛고 함께 희망을 노래해야 한다.
그렇다고 모두가 생각 없이 꽃잔치에 취해 있을 때는 아니다. 봄날의 이 악몽을 해마다 되풀이할 생각이 없다면 말이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산불이 대형화·장기화하고 있다. 산불 대응체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국가재난사태를 겪으면서 ‘산불 예방과 초기 대응을 위해 임도(林道) 확충이 시급하다’거나 ‘산불에 저항력이 강한 활엽수림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나온다. 대형 산불이 있을 때마다 어김없이 반복되는 지적이다. 산림청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임도 확충’을 놓고는 ‘조기 진화에 효과가 적고, 산사태 위험만 키운다’는 반론이 맞서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어쨌든 지금의 산불 예방 체계를 재점검해야 하고, 장비와 인력 보강을 포함한 진화 대책의 전환도 요구된다. 긴 겨울을 보내고 설레는 마음으로 맞이한 생명의 계절, 모두가 기다리는 남녘의 꽃소식이 화마에 묻히는 일은 이제 두 번 다시 없어야 한다.
/ 김종표 논설위원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꽃잔치 #산불 #봄날 #불청객
김종표 kimjp@jjan.kr
다른기사보기
![[초대시] 김철규 시인의 ‘세상의 창’](https://www.domin.co.kr/news/photo/202504/1508329_693871_292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