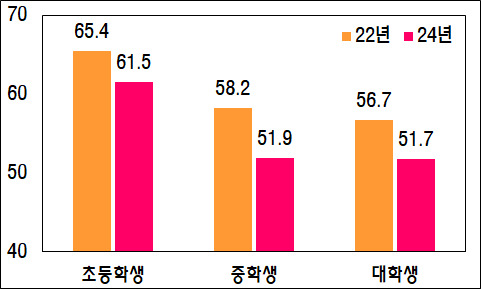샌프란시스코 유학 시절, 거리 곳곳에 1센트짜리 동전들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신기했던 기억이 있다. 당시 한국에선 IMF 사태로 환율이 두 배 이상 급등해 1센트는 20원 상당의 가치가 있었는데 아무도 줍지 않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졌기 때문이다.
호기심에 수업을 같이 듣던 타인종들에게 왜 아무도 동전을 안 줍느냐고 물었다. 돌아온 대답은 “줍는 데 드는 칼로리를 돈으로 환산하면 손해야” “여긴 언덕이 많아서 줍기 귀찮아” 등 제각각이었다.
하지만 최근 불경기 탓인지 동전을 줍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데이터 분석업체 유고브가 지난해 2977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 10명 중 8명은 길에 떨어진 동전을 줍겠다고 답했다. 단돈 1센트를 줍기 위해 기꺼이 몸을 굽힐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50%나 됐다. 사람들이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그동안 무시했던 동전의 가치를 다시 바라보게 된 것이 아닐까 싶다.
페니(Penny)로 불리는 1센트 동전은 1793년 처음 발행된 이후, 230년 넘게 미국 경제의 일부로 자리 잡아 왔다. 특히 1909년 에이브러햄 링컨의 초상이 새겨진 이후에는 미국을 대표하는 화폐로 상징적인 존재가 됐다. 그러나 지금은 대다수가 페니를 거스름돈으로 받아도 잘 사용하지 않고, 주머니나 서랍 속에 방치하고 있다.
연방준비제도에 따르면 지난해 주조된 31억7200만 개를 포함해 약 1140억 개의 페니가 전국에 유통되고 있다. 조폐국은 2024 회계연도에 페니 하나를 생산, 유통하는데 약 3.69센트의 비용이 투입돼 8530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들어 낼수록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경제적 비효율성을 이유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재무부에 페니 생산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그의 결정은 경제학자들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벤틀리대 경제학과 데이비드 걸리 교수는 “페니 하나를 만드는 데 추정비용이 3센트로 경제적 부담이 되고 매년 수백만 개가 사라지기 때문에 조폐국은 지속해서 대체 동전을 공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이 1센트 동전을 폐지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다고 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페니가 사라질 경우 소액 상품의 가격 증가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최소 화폐 기준이 5센트로 되면 9.96달러짜리 제품 가격이 10달러로 반올림돼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업체들이 가격을 반올림할지, 반내림할지는 불분명하지만, 비즈니스 목적이 이윤 추구에 있으므로 반올림될 가능성이 더 크다.
또한 페니 퇴출은 현금 의존도가 높은 저소득층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국내 현금 사용 비율은 20% 이하로 줄었지만, 여전히 은행 계좌가 없거나 카드 결제가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동전이 중요할 수 있다.
웨이크 포레스트대 경영대학원 아자이 파텔 교수는 디지털 결제가 보편화된 계층에게는 문제가 없지만, 현금 거래에 의존하는 계층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경제와 역사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페니의 주조 중단이 바로 사용 중지가 되는 것은 아니나 시대가 바뀌면서 그 역할이 점점 미미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5센트 동전인 ‘니클(Nickel)’의 주조 중단도 논의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니클을 제조하는 데 11센트가 들기 때문에 페니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비효율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페니의 운명은 사실상 정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여파는 단순한 비용 절감 이상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소비자 물가 상승이 고착화되고 서민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작은 동전 하나가 주는 상징성과 경제적 여파를 고려할 때 페니 퇴출이 과연 현명한 결정인지 생각해볼 일이다.
언젠가 길바닥에 떨어진 동전을 줍겠느냐는 질문조차 사라질 날이 올 수도 있을 듯싶다.
박낙희 / 경제부 부장